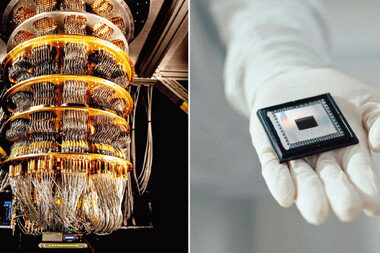경주 향교가 있는 교동에 갔다. “경주에 가서 이것 안마시고 가면 헛간 것”이라는 교동 법주 맛을 보기 위해서였다. 12대를 이어 만석지기였고 9대째 진사를 냈다는 최부잣집 종택은 중요 민속자료 제 27호다. 지어진 지 200년이 넘는다는 이 집은 예전 살던 곳에서 옮겨와 건물 나이는 350년이 넘는다. 이곳이 교동 법주 제조장이자 유일한 판매처(0561-772-2051)다.
교동 법주는 조선 숙종 때 사옹원의 참봉으로 있던 최국선씨가 낙향한 후부터 빚었던 술이라는데 원래 궁에서 빚었던 술인지, 이 집안의 술인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의 농서(農書) ‘제민요술’에 여러 종류의 법주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 술은 최국선씨에 의해 350년 동안 최씨 문중의 가양주(家釀酒)로 내려오다가 그의 9대손 며느리 배영신 할머니가 1986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1년에 민속주로 허가를 받아 시판된 것은 92년 5월부터다. 이 술의 원래 이름은 경주 법주다. 그런데 어떤 소주회사에서 새 술을 만들면서 ‘경주 법주’라는 상표를 등록해 이 술은 경주 교동 법주로 이름을 바꿨다.
교동 법주가 완성되는 데는 보통 100일이 걸린다. 이 술은 원료부터가 독특하다. 우선 누룩은 보통 밀기울을 쓰는데 법주는 재래종 통밀을 멧돌에 갈아 멥쌀로 쑨 죽을 섞어 빚는다. 그리고 밑술 재료와 덧술의 원료로 찹쌀이 쓰인다. 멥쌀도 귀했던 시절에 찹쌀이 쓰였으니 이 술이 얼마나 고급품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모난 물은 약을 달이고 둥근 물로는 술을 빚었다고 한다. 이 집에서는 그 둥근 물을 마당의 깊디 깊은 우물에서 구한다. 물맛 좋기로 유명한 이 우물물을 100℃ 이상 팔팔 끓인 뒤 식혀서 쓴다. 200년 되었다는 이 우물 옆에는 수령 100세가 넘는 구기자나무가 있다. 구기자가 우물의 물맛을 좋게 하는 것 같아 이 집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나무다.
이 술의 모든 원료는 재래종이고 만드는 방법이나 쓰는 용구조차 옛것 그대로다. 누룩 만드는 것부터 용수박아 거르고 다시 베보자기에 걸러 여과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으로 하는, 그야말로 ‘법식대로 만든’ 법주다. 집안의 가문과 술맛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그런 고집과 자존심이 아니었으면 전통의 순수함이란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술 빛깔은 등황빛으로 곱고 맑다. 맛은 깊고 은은하게 달고 향기롭다. 고요하면서도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선비를 대하는 것 같달까. 격조 있는, 좋은 술맛이다. 포석정에 잔 띄우고 시를 읊어 가며 마셔야 제격일 것도 같다.

축제가 벌어지는 보문관광단지 안의 신라촌 광장에는 바람이 더욱 드셌다. 호텔 음식부에서부터 각 지역 부녀회에서 가지고 나온 떡들, 전국의 민속주 등이 흰 광목 차일 하나씩을 차지하고서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차일 앞을 지날 때마다 술이며 떡을 시식하라고 아주머니들이 소리쳤다. 새우깡을 안주로 내놓고 머리에 노랑물을 들인 도우미 아가씨들이 술잔을 건네는 차일 한 쪽에 교동 법주의 차일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드디어 교동 법주에서 마당에 상들을 죽 펴고 시음회를 열었다. 주안상에는 약식 다식에서부터 주악, 작과편, 모시송편, 깨끗한 육포와 문어회, 삼색 북어 보푸라기, 사연지라는 최씨집 전통 김치 등이 차려졌다. 옛날 선비 아니면 받아볼 수 없는 훌륭한 상이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식을 한 입에 털어넣고 북어 보푸라기도 “뭐지?”하면서 먹는 통에 순식간에 비워져 버렸다. 사람들이 썰물져 사라지자 바람에 차일 날리는 소리만 다다닥 귓전을 때렸다.
마라톤 코스로도 이용되는 보문단지의 아름다운 길에는 벚나무가 한창 물이 오르는 중이었다. 이 길의 고풍스러움은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조차도 운치있어 보이게 한다. 시간이 고여 있는 듯한 길의 향취에 젖어 미리 정한 노동동 고분공원 앞의 숙소로 들었을 때는 밤이었다. 객창에는 어둠 속의 봉분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좋은 술은 깰 때도 좋다. 법주에 그윽이 취한 채 잠이 들었음에도 머리가 맑았다. 신라의 아침이 아직 새 순이 돋지 않은 황금빛 잔디를 더욱 불그레하게 적셔 놓은 노동동 고분공원을 향했다. 삽상한 아침 공기 속에서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봉분을 따라 돌며 달리고 있었다. 신라의 봉분은 미니멀하다. 간결하고 시원한 곡선이라니…. 모래산처럼 보이는 묏등 위로 몰래 올라섰다. 살아서 영화를 누리던 이들이 애지중지하던 물건과 몸종까지 데불고 누운 흙덩이 아래서 천년 후의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은 인간의 역사를 압축한 한 편의 시였다. 공원을 내려다보자니 삶과 죽음이 모두 손바닥 안에 있는 듯했다. 밤에 여기에서 한 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손님이 다녀가셨는지 빈 술병이 봉분 위에 남겨져 있었다.
김유신 묘에는 홍매화 두 그루가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가야나 재건할 일이지, 가야국 왕손으로 태어나 신라에 충성하기는!”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신라에 그만한 충신이 달리 없겠지만 나라를 세우고도 남았을 지모로 충성을 바친 유신을 달래듯 묘는 무척이나 화려하다.
그리운 석굴암도 못들르고 불국사 독경소리도 다시 못듣고 경주를 떠나오는 길, 트로트소리 왁자한 술축제 장터 한복판에 숄을 두르고 앉아 술 청하는 손님에게 흰 장갑 낀 손으로 술을 따르던 최부잣집 후손들이 떠올랐다. 전통이나 순수는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가. 철마다 가고 싶은 곳 경주, 이젠 그곳에 그리워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