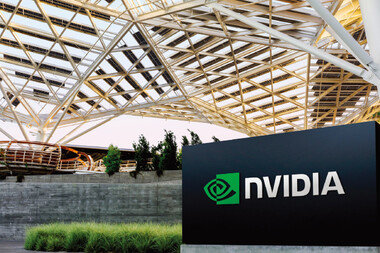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b>꽂히는 글쓰기</b><br>조 비테일 지음/ 신현승 옮김/ 웅진윙스 펴냄/ 320쪽/ 1만2000원
왜 최면 거는 글쓰기가 필요할까. 고객들의 마음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의심과 경계,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고한 성채를 뚫고 들어가려면 따분한 글로는 불가능하다. 그들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최면에 걸리게 할 정도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작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세일즈 레터를 쓰거나 e메일을 보내거나, 광고 또는 웹사이트 카피를 만들 때 모두 해당한다. 한눈에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저자는 40년 동안 글쓰기를 해왔고 30년 동안 글쓰기를 가르쳐왔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가 터득한 교훈은 ‘절대로 지루한 글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자기중심의 글쓰기는 고객의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내 자아에서 빠져나와 독자의 자아로 들어가라”고 충고한다.
이 책의 장점은 풍부한 사례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글이라도 최면 거는 글쓰기와 지루한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풍부한 사례로써 비교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면 거는 글쓰기가 지나치게 매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들을 현혹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고객을 한 번 정도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최면 거는 글쓰기의 진정성은 세상에 또는 고객에게 고통보다는 기쁨을 전달하려는 글쓰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분의 글쓰기에 흥분과 호기심, 친근감과 호감을 담을 수 있다면 독자나 고객들은 여러분을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골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글쓰기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최면 거는 글쓰기는 좋은 글과 멋진 글을 쓰고 말겠다는 중압감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이뤄진다. 글쓰기는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중압감을 버리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되고, 자신을 표현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독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머리에 그려져 있는 대로 그림을 보고 글쓰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독자에게서 최대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여전히 글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식이 적용된다. 즉 충격적인 진술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일화로 시작하는 서론 단계, 독자나 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서술 단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확증 단계 그리고 해결책을 이끄는 행위의 이점을 진술하는 결론 단계로 이뤄진다. 저자는 이런 공식에 익숙해질 것을 권한다. 이런 공식에 따라 저자 자신도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모든 글쓰기에서 거친다고 말한다.
첫째, 도입부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둘째, 잠재고객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진술하고 있는가.
셋째,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넷째, 잠재고객이 구매에 나서도록 부탁하고 있는가.
한편 최면 거는 글쓰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다른 한 가지 사항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읽을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알 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내게 득이 되는 게 뭐지’ 등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던진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늘 독자가 지극히 이기적이며, 자신에게만 관심을 끄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간단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조언이다.
글쓰기를 할 때 우리 자신은 늘 내면에 존재하는 2개의 자아를 만나게 된다. 하나는 제1 자아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듯 쏟아내려는 자아다. 반면 제2 자아는 비판자이자 의심 많은 자아다. 제2 자아는 끊임없이 통제하고 의심을 갖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글을 쓰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 문장을 쓰고 난 다음 고치고 또 한 문장을 쓰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의심 많은 자아를 잠시 다른 곳에 밀어두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빠르게 써나가는 것이 좋다. 이를 두고 저자는 “나는 글을 쓸 때 지면을 가로지르는 펜이나 자판을 두드리는 내 손가락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말한다. 저명한 작가인 스티븐 킹은 이를 두고 ‘작가의 트랜스 상태’라고 말하기도 한다. 작가 자신이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나오는 대로 적어나가는 편이 낫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아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 좋은 글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