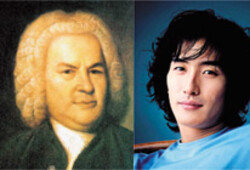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주제는 ‘몸’인데, 몸은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몸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은 이미 극한에 도달한 듯하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디빌딩을 비롯해 요가·필라테스·태보·재즈댄스 등 몸만들기를 위해 뭔가 하나쯤 하고 있지 않으면 시대에 뒤진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다.
또한 2005년 ‘이상문학상’은 ‘몽고반점’을 당선작으로 발표하면서, 몸의 아름다움과 몸에 내재된 삶의 의미를 천착하여 몸 담론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몸을 가리거나 덮는 것이 의복이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의복은 몸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TV 홈쇼핑 채널에서 보는 체형 보정 속옷에 관한 광고는 마술이기라도 한 것처럼, ‘입기만 하면 당신 몸이 이렇게 변한다!(문자 그대로 변신)’고 유혹한다. 물론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다가 결국 옷장의 골칫거리로 전락시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실천의 문제였을 뿐이다. 충분히 오랜 기간 의복을 통한 과도한 압력이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몸의 형태는 바뀐다!
18, 19세기 서구 여성들에게 코르셋은 바로 그런 구실을 했다. 차이가 있다면, 현대 여성들에겐 소비라는 형태의 선택 사항이지만, 당시의 여성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강제였다는 점이다.
여자 어린이가 4~5세 되면 착용하기 시작하는 코르셋에는 고래 뼈나 나무 등으로 만든 단단한 심이 들어가 있어, 가슴 아래 등뼈 부위를 구부리지 못하게 지탱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결국은 한 손에 들어갈 만한 날씬한 허리를 만들어냈다. 뒤에서 최대한 조여 묶어서 자기 손으로는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녀나 기숙사 사감이 도와줘야만 했다.

몸을 ‘만드는 것’은 코르셋이기도 하고,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춤으로 코르셋 착용을 풍자한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전족을 한 중국 여성들. 전족 신발과 전족한 발뼈 모양(위부터).
20세기에 태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옛날엔 사회적 강제사항이었던 몸만들기가 지금은 내재화된 압력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