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C 방송이 지난 2월7일 미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월 국무장관을 인터뷰했다. 중동 문제에서부터 발칸 주둔 미군의 철수 현안에 이르기까지 외교 문제 전반에 걸쳐 묻고 답했지만, 한반도 문제는 일언반구 거론도 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 문제가 우선 순위 1위였고,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자 아시아 지역 대리자인 일본만 해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미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빠졌다.
공화당의 대북 정책이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을 수는 없다.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녹록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별러온 공화당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목을 빼고 바라듯이 공화당이 당장 강경 일변도로 급선회해 앞뒤 안 가리고 치달아줄 것을 기대했다가는 언제 낭패를 볼지 모른다.
우선 미국은 북한을 놓고 쉽게 호들갑을 떨 나라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특정인이 나서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호언장담하지는 않는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파월 국무장관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 두고 보자는 뜻 같지만, 사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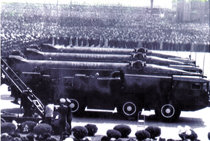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부시 대통령,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은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을 아낀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차관 내정자가 엉뚱하게 ‘햇볕정책’이라는 말에 시비를 건 것이 화제가 되긴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쥔 칼자루에 클린턴 행정부가 휘둘려온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 쯤으로 볼 수 있을 뿐, 공화당 대북 정책의 방향을 귀띔해 준 것은 아니었다. 아미티지의 발언이 방향을 일러준 것이라면, 누구든 예상했던 것이기에 싱겁기 짝이 없다.
하지만 아미티지는 국방부 차관 내정자인 폴 월포위츠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의 뼈대를 만들어낼 사람이다. 두 명 모두 미국이 대북 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을 옆 좌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김대중 정부가 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울 인물들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다. 미사일과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을 북한이 검증해 주지 않는 한, 포용(engagement)도 없고 지원도 없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증명 먼저 포용 나중의 원칙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점도 바로 이 검증과 포용의 앞뒤 순서 차이다. 핵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중단되었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유보했다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배경의 하나였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런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가장 큰 구실거리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안보 팀이 대북 협상에서 미사일의 세부 문제에 들어갔을 때 클린턴 행정부와 얼마나 다른 해법을 제시할지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단거리 노동 미사일이 군사용이라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은 협상용이다. 북한이 군사용 단거리 미사일마저 양보할 리는 없다. 이 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1994년의 핵 동결을 위한 기본 합의안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폴 월포위츠가 평소 북한의 경수로를 수력이나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언급해온 것도 기본 합의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새 안보 팀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중국 문제다. 연례 행사처럼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곤 하는 5월이 곧 닥친다. 타이완에 이지스급 함정을 파는 문제도 곧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중국과는 어떤 형태로든 부닥쳐야 하고,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찬사를 보낸 샹하이 발언을 통해 미국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공화당 외교 정책 입안에 강한 입김을 쏘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 추진 능력과 개방 가능성을 낮춰보고 있다. 두고 보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점차 중국의 대북 보호막이 두터워져 가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마냥 북한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또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무작정 외면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은 물론 유럽과 캐나다 등과도 외교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과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둘러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들러리는 더욱 싫다는 것이다.
부시의 새 행정부는 시간을 벌어놓고 밑그림을 그리려는 참이다. 그러나 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는 그림은 결코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팀’이니 하는 말은 있지도 않은 표현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나 군사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는 것일 뿐, 한반도 정책만으로 머리띠를 싸매는 것은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