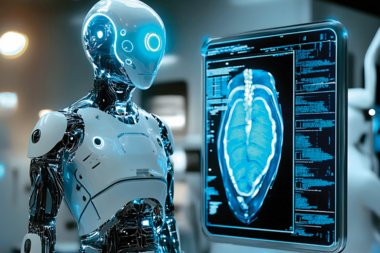우주의 중심은 태양인가 지구인가. 이 거창한 인류사적 논쟁의 귀결은 허망하다. 태양계 바깥에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발견으로 그 둘 모두 정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삼국지의 새 번역을 완성하고 나서 작가 황석영이 토로한 감회를 끌어와 보자.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7년 작업 끝에 황석영이 도달한 결론은 촉한 정통론의 유비도, 일본에서 성행한 조조 영웅론도, 혹은 이름 없는 민중도 아니었다. 후한 100년사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역사라는 것. 9층 위에 옥상 있고, 천장 위에 하늘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평가하는 작업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일일이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상 범위 안의 지루한 진단들이었다. 평소 친노 성향의 논자라면 일부 체면치레용 비판을 곁들였어도 결국은 상찬을, 반노 측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개판 5분전’론을 펼쳐나갔다. 그중 기억나는 백미는 바로 노 대통령과 ‘겨누어 총!’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의견이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귀감이 되었다.’ 이처럼 상대방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동시에 희화화하는 말이 또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 집무 전임 연장선상에서 이해
노 대통령은 이 땅에 대통령제가 생긴 이래 배출된 여러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의 절반가량을 ‘변종’의 모체로 삼는다면 그게 어찌 변종이겠는가. 언필칭 ‘막말하기, 편 가르기, 좌회전 우회전 우왕좌왕하기’는 일반 국민이 발원지다. 우리들은 모두 그러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특히 “공인만은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 그 ‘공인’들을 그다지 대단하거나 우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뒷자리 친구의 아버지는 ‘똥퍼 장수’였다. 당시 서울에는 지게로 똥을 퍼 나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애는 윤기 나는 제약회사 과장이었다. 그렇다. 비만 걱정과 참살이(웰빙)가 유행할 만큼의 경제성장에 대해 나는 대단히 높은 가치를 매긴다. 보수화된 것이다.
보수 드라이브는 역대 대통령들에게까지 미친다. 박정희라는 이름에 겹쳐 가난 해방의 성과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유신 말기 가속이 붙어 미칠 듯이 질주하던 과잉성장을 3% 안정 시책으로 꺾어놓은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없었다면 남미의 1000% 인플레 지옥을 맞이할 공산이 매우 높았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총칼을 쥔 무인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될 때 피를 흘리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는 인류사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노태우의 ‘물 정치’는 참으로 가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로 투명사회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김대중의 남북 데탕트는 가령 그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수치가 막연해질 만큼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도 전임 대통령들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중 현직이 노력하는 주된 과제를 나는 본격적인 사회건설 의지로 본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민족건설’의 과제를 이승만 시기까지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 그 이후부터 전임 대통령까지의 역할은 대체로 ‘국가건설’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운동이 성행할 때는 정치가 부재하다는 의미이고, 시민단체가 많은 것은 사회 시스템이 미비한 증거로 보인다. 집권세력의 언어를 재탕해서 좀 민망한 기분이지만 이른바 탈권력, 탈권위의 정치는 바로 누구도 대신 교통정리 해주지 않는 성숙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게 곧 한나라당 정책실이 말하는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 과제와 같은 맥락의 발전 수순 아니겠는가.
인터넷에서 기사의 댓글에 편을 갈라 무시무시하고 난폭한 언어가 난무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9층 위에 옥상 있고 천장 위에 하늘 있으며, 거대하게 굽이치며 갈 길을 가는 역사가 있다. 단계마다의 고통을 치르면서도 큰 맥락에서 ‘한국호’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평가하는 작업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일일이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상 범위 안의 지루한 진단들이었다. 평소 친노 성향의 논자라면 일부 체면치레용 비판을 곁들였어도 결국은 상찬을, 반노 측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개판 5분전’론을 펼쳐나갔다. 그중 기억나는 백미는 바로 노 대통령과 ‘겨누어 총!’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의견이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귀감이 되었다.’ 이처럼 상대방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동시에 희화화하는 말이 또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 집무 전임 연장선상에서 이해
노 대통령은 이 땅에 대통령제가 생긴 이래 배출된 여러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의 절반가량을 ‘변종’의 모체로 삼는다면 그게 어찌 변종이겠는가. 언필칭 ‘막말하기, 편 가르기, 좌회전 우회전 우왕좌왕하기’는 일반 국민이 발원지다. 우리들은 모두 그러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특히 “공인만은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 그 ‘공인’들을 그다지 대단하거나 우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뒷자리 친구의 아버지는 ‘똥퍼 장수’였다. 당시 서울에는 지게로 똥을 퍼 나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애는 윤기 나는 제약회사 과장이었다. 그렇다. 비만 걱정과 참살이(웰빙)가 유행할 만큼의 경제성장에 대해 나는 대단히 높은 가치를 매긴다. 보수화된 것이다.
보수 드라이브는 역대 대통령들에게까지 미친다. 박정희라는 이름에 겹쳐 가난 해방의 성과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유신 말기 가속이 붙어 미칠 듯이 질주하던 과잉성장을 3% 안정 시책으로 꺾어놓은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없었다면 남미의 1000% 인플레 지옥을 맞이할 공산이 매우 높았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총칼을 쥔 무인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될 때 피를 흘리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는 인류사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노태우의 ‘물 정치’는 참으로 가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로 투명사회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김대중의 남북 데탕트는 가령 그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수치가 막연해질 만큼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도 전임 대통령들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중 현직이 노력하는 주된 과제를 나는 본격적인 사회건설 의지로 본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민족건설’의 과제를 이승만 시기까지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 그 이후부터 전임 대통령까지의 역할은 대체로 ‘국가건설’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운동이 성행할 때는 정치가 부재하다는 의미이고, 시민단체가 많은 것은 사회 시스템이 미비한 증거로 보인다. 집권세력의 언어를 재탕해서 좀 민망한 기분이지만 이른바 탈권력, 탈권위의 정치는 바로 누구도 대신 교통정리 해주지 않는 성숙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게 곧 한나라당 정책실이 말하는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 과제와 같은 맥락의 발전 수순 아니겠는가.
인터넷에서 기사의 댓글에 편을 갈라 무시무시하고 난폭한 언어가 난무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9층 위에 옥상 있고 천장 위에 하늘 있으며, 거대하게 굽이치며 갈 길을 가는 역사가 있다. 단계마다의 고통을 치르면서도 큰 맥락에서 ‘한국호’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