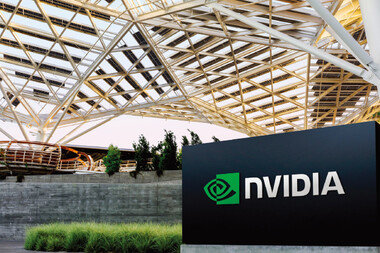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종시를 꿈꾸던 건축가 황두진의 비전은 남달랐다. 그의 상상도 중심에는 마치 SF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초고밀도 고층건물이 높이 솟아 있다. 그 주위는 광활한 들판이다. 상상도 전면에는 막 들일을 마친 농부가 논두렁을 따라 걷고 있다. 자연과 인공의 완벽한 조화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똑같이 400명이 산다고 가정해보자. 도시에서는 400명이 아파트 한 채에 모여 산다. 높게 지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면적도 넓지 않다. 이 400명은 도로, 상하수도, 송전선 등도 공유한다. 같은 지역에 직장이 있으니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를 굴리느라 쓰는 화석연료도 적다. 덩달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된다.
반면 교외에 사는 400명의 사정은 정반대다. 띄엄띄엄 세운 단독주택은 채당 4인 기준으로 무려 100채가 필요하다. 100채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송전선이 길게 만들어진다. 이들이 은퇴자가 아니라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소비하는 화석연료와 내뿜는 온실기체, 오염물질이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황두진의 비전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세종시를 극단적 밀집도시로 만들어 정부 청사(직장)와 주거 공간(집)을 한데 몰아넣으면 토지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 대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청사, 아파트, 도로 등으로 훼손된 들판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 수 있다. 직관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뜨거운 아스팔트가 기분 나쁜 열기를 내뿜고, 열섬 현상 탓에 밤에도 열기가 치솟는 도시가 환경친화적이라니. 아무리 둘러봐도 단조로운 잿빛 풍광에 질릴 대로 질리고, 폐 깊숙이 박혀 염증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무서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자. 도시를 떠나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곳을 최대한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도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로 7017’을 조성하면서 참고했을 법한 미국 뉴욕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하이라인’도 그 가운데 하나다. 허드슨 강 위의 녹슨 흉물이던 오래된 고가 화물철로가 도시와 전원을 잇는 고가 산책로로 변신했다. 들꽃과 시민이 가꾸는 이런저런 식물이 어울리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이곳은 뉴욕 시민이 가장 자주 찾는 산책로가 됐다.
도시 곳곳에 텃밭을 일구는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 텃밭 운동을 전개해온 캐나다 밴쿠버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를 뒤집어엎고 텃밭을 만들었다. 누구든 1년에 20캐나다달러(약 1만8000원)를 내면 시로부터 땅을 임차해 먹을거리를 심을 수 있다. 밴쿠버 곳곳에 이런 텃밭이 있는데, 시민 절반 정도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단다.
청계천, 노을공원…다음은?
공중정원이나 도시 텃밭도 뻔한 것 아니냐고? 프랑스 파리에 갈 일이 있다면 2006년 개관해 파리 명소가 된 케 브랑리(Quai Branly) 박물관을 꼭 방문해야 한다. 면적이 1200㎡에 달하는 이 건물의 전면은 말 그대로 ‘수직정원’이다. 벽면에 파리 기후에서 계절마다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놓았다.높이 12m, 폭 198m의 이 정원은 창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따라 나무, 풀, 꽃으로 우거진다. 새가 둥지를 틀고, 나비와 벌새가 날아다니는 이 건물의 매력에 빠지지 않기는 쉽지 않다.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수직정원이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신선한 산소는 덤이다.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에일라트 해변에 있는 레드 시스타(Red Sea Star) 레스토랑이다. 이 레스토랑은 수면 아래 5m에 있다. 손님은 레스토랑 주변의 산호초를 누비는 해양생물을 보면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산호초 사이에 수중 레스토랑을 만들어놓은 것이야말로 환경 파괴 아니냐고? 사실은 정반대다. 이 레스토랑은 산호초 복원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해양 오염으로 산호초가 파괴된 곳에 강철 구조물을 담그고, 그 위에 산호 군락을 이식했다. 그렇게 구조물에 복원된 산호초가 다른 해양생물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양생태계가 조성됐다. 덕분에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은 산호초 생태계를 조망하면서 한 끼를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세계 곳곳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새삼스러운 점 하나를 깨달았다. ‘개발의 아이콘’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밀어붙인 청계천 복원 사업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시에 숨통을 틔우는 시도로 재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이던 청계천에 억지로 물을 흘려놓은 게 꺼림칙하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서울 상암동 인근 녹지대도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다. 산업화 과정에서 쌓인 오물을 흙으로 덮고 인공 동산과 정원을 만들지 않았나. 비록 땅 밑에서는 끊임없이 썩은 물과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