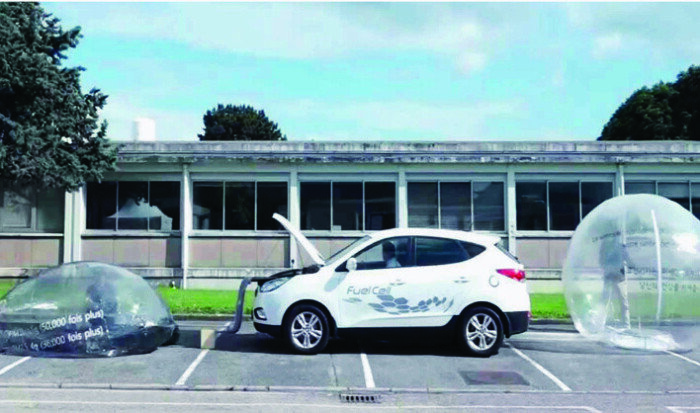
최근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판도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터리, 연료전지 사업으로 급전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소전기차를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내년 초 ‘차세대 수소전기차 양산’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뤘다.
2003년 현대차 입사와 동시에 연료전지 개발에 매달려온 김세훈(51·사진) 연료전지개발실장은 8월 23일 기자와 만나 “수소에너지 사회는 곧 다가올 미래”라고 확언했다. 수소 사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원동력은 바로 글로벌 환경 규제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서는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가별 환경 규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연비규제법(CAFE)을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2020년까지 연비를 2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매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자동차 업체는 0.1mpg(miles per gallon) 미달분마다 총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14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 역시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실시 중이다.
수소충전소, 하루 250kg 저장 가능한 공간 필요
“2015년 기준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130g/km당 95유로(약 12만6400원)의 벌금을 책정하고 있고 2020년에는 그 기준을 95g/km로 낮추려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몇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연비를 맞춰야 합니다. 자동차회사 처지에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지만 세계시장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의 연료전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회사는 현대차와 도요타, 혼다 정도인데, 이 가운데 현대차와 도요타가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현대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기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를 독자적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현재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국산화 비율은 99%에 육박한다. 김 실장은 “수입하는 건 전해질막 정도다. 그 대신 촉매 등은 다 국산화했다. 사실 연료전지 부품은 자동차회사보다 화학 쪽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해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소전기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수소충전소 건설 및 수소전기차 정부 보조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올해 정부에서 수소충전소를 13개가량 짓겠다고 하는데, 충전소가 상업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최소 250kg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환경부는 신차 판매 중 수소전기차 비율을 10% 높이고 수소충전기도 2030년까지 520기 설치를 목표로 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수소, 가스, 전기 융·복합휴게소를 200개가량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일본처럼 수소 수입 방법 모색해야

김 실장은 수소를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든 액화수소나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수소 수출국으로는 호주와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호주 필바라(Pilbara)는 한국 면적의 5.5배에 달하는데, 만약 이 지역 전체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원자력발전소 2만5000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현재 실증사업 중으로,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이를 또 이동하기 편한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하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은 지하 전체가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땅에 파이프를 꽂아 물을 부은 뒤 소금물을 뽑아내 냉매·부동액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지하동굴에 엄청난 양의 수소를 보관합니다. 수소에너지 사회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일본처럼 수소를 액화수소나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 “체코 원전 설비 계약”두산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97/bd/b6/6997bdb602cc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