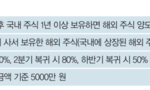이씨는 자가 격리된 이후 매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하루 세 번 전화를 받았다. 격리자가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다. 한 번은 집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휴대전화로 보건소 직원이 전화해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 또 하루는 집에 찾아온 구청 직원이 “구청에서 왔다”고 크게 말해 동네 주민 사이에 ‘메르스 환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씨는 “메르스 증상도 없었고 총회에 참석한 것뿐인데 환자로 낙인찍혀 억울했다. 격리가 해제된 지금도 세상이 나를 감시하는 듯한 공포감이 여전하다”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 유족·격리자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도 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유족 68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에서 28명(41%)이 우울·불면 증세를 보였다. 분노(13명·19%), 경제적 문제(12명·18%), 죄책감(3명·4%), 불안(2명·3%) 등을 호소한 유족도 있었다(표 참조). 심리 상담을 시작한 6월 17일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 상담 누계도 격리자 348명, 완치 후 퇴원자 74명에 이른다.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국립정신병원이 맡고 있다.

메르스 유족·격리자들의 심리적 아픔은 일반 사망, 사고로 인한 충격과는 다르다. 심민영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메르스로 인한 정신적 위기는 죽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 세상의 시선에 대한 공포, 생계 불안정과 심리적 억울함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러한 아픔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박모(45) 씨는 요즘 극심한 불면에 시달린다. 그는 6월 초 메르스로 어머니를 잃었다. 박씨는 가족 면회 금지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시신이라도 곱게 묻으려고 했지만 병원 측은 감염 방지를 이유로 화장을 강하게 권고했다. 결국 시신은 이중 비닐 백에 싸여 화장됐다. 박씨는 밤만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어머니를 편히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다.
더 힘든 것은 ‘메르스 유족’이란 사회적 낙인이다. 옷장사를 하는 박씨가 메르스 유족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어떤 손님은 마치 박씨가 전염병 보균자라도 되는 양 멀리 서서 “물건을 던져달라” “돈은 여기 놔둘 테니 내가 떠나면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는 “어머니 죽음도 한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 시선이 더 끔찍하다. 메르스 위기가 끝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격리자의 생계 위기도 큰 스트레스다. 전기설비 관련 일을 하는 정모(47) 씨는 아내와 함께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6월 5일부터 3주 동안 격리됐다. 정씨는 일용직 노동자였기에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다. 관할 구청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소득,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 40만9000원, 2인 가구 69만6500원, 3인 가구 90만1100원, 4인 가구 110만5600원이었다. 2인 가구인 정씨는 69만6500원을 받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따지면 약 50만 원 손해를 봤다.
정씨는 “격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며 “생계지원비가 격리일수와 무관해 어떤 사람은 나보다 수입도 많고 짧게 격리돼도 가족이 4명이라 더 큰 지원비를 받는 것을 보고 박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격리자에 대한 ‘신상털이’도 큰 심리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6월 중순 대구시 공무원인 A씨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되자 A씨 가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급속히 퍼졌다. 인터넷에는 A씨의 실명과 거주지, 직장과 부서, A씨가 방문한 공공시설 등 세세한 정보가 나돌았고, A씨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이용하는 버스번호, 동선까지 공개됐다. 대구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신상털이는 일종의 정신적 폭력이다. A씨 아들의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심리위기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최명기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메르스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적극적으로 심리지원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심리지원 핫라인 등의 정보를 주고, 상담을 스스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실행까지 통합해 주도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민영 단장은 “현재 국가적 심리지원 기관은 대부분 세월호 사고 이후 구축됐을 정도로 역사가 짧다. 피해자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이들의 심리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었기에 심리지원의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심리지원 관련 기관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따뜻한 관심도 필요하다. 심 단장은 “그동안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프라 복구에 비해 심리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강한 정신이 사회를 복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심리적 피해자들을 꾸준히 돌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