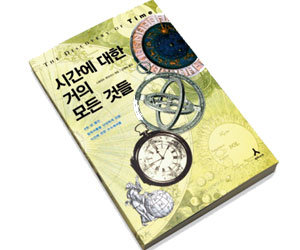
이런 점에서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휴머니스트 펴냄)은 전자에 속한다. 솔직히 필자가 이 책을 고를 때는 양자를 충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고, 문장이 지루하고 산만하다는 약점을 읽는 내내 느꼈다. 독서 몰입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평하는 필자도 단숨에 완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소개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책은 엮은이 겸 저자인 스튜어트 매크리디 외 7명이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 꼭지씩 쓴 것을 묶었다. 매크리디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책 속이나, 심지어 출판사의 소개글에도 ‘고대 이집트부터 20세기까지 전 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정도뿐이다. 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고로 책은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머리말이나 전편이 아닌, 제11장에 등장하는 철학 전공자 로빈 르 푸아드뱅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럼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물론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없다. 빅뱅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공간, 즉 단조로운 진공상태의 공간만 존재했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상상해야 한다. 이른바 ‘영겁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런 영겁의 시간에 변화를 일으킨 동기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의 동기가 있었을 터. 폭발 이후 우주시간, 즉 시계의 시간이 째깍째깍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빅뱅 이전의 ‘영겁의 시간’은 지금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무런 시간도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빅뱅이 0년 0시의 출발점이라면 사건의 시작과 시간의 시작은 같은 것이 된다. 그럼 시간의 종말은 무엇일까. 바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그 순간을 의미한다. 결국 시간은 무엇인가. 변화의 시작에서 변화의 끝을 향해 달리는 말과 같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0세에서 시작해 나이를 먹다가 죽는 순간 시간은 다시 0이 된다. 우리가 70세, 80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일 뿐, 그 순간 그의 시간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시각이면서 시간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논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왜 시간을 나누고, 달력을 만들고, 요일을 정했는가. 하루는 왜 48시간이면 안 되고 24시간이어야 했으며, 1년은 왜 365일인가. 1년이 365일인 것은 윤년을 끼워서 반드시 보정해야 하는가. 태양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1년이라는 날짜는 365일 전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간은 하루에 14시간, 50시간으로 마음대로 나눠도 문제가 없는가. 요일은 단순한 약속인가, 아니면 운동의 결과물인가.
이 밖에도 책에는 역사적 기록, 시계, 시계시간, 달력 등 시간과 관련한 많은 지식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저자들의 지적 함량이 균일하지 않으며, 엮은이의 편집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고급 독자를 겨냥한 깊은 숙고도 부족하고, 일반 독자를 위한 재미 부여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질문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논점을 좀 더 확대해 다른 서적을 참조한다면 훌륭한 시간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