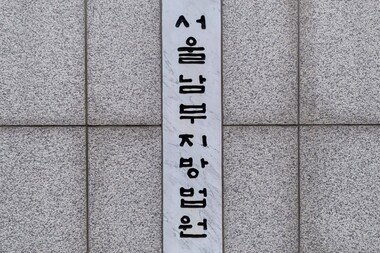바로 이 신화와 역사 사이의 ‘거리’는 근대 고고학 역사학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좁혀졌다. 트로이 전쟁의 역사성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이는 1871년 터키에서 트로이 유적지(혹은 트로이 유적지로 추정되는)를 발견한 독일의 슐리만이었다. 어린 시절 그리스 신화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화가 지어낸 얘기만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슐리만은 어른이 돼서 자신의 동화 같은 믿음을 입증했다. 그의 발굴작업으로 오랜 세월의 더께 밑에 숨어 있던 고대 왕국의 흔적이 생생히 드러나면서 호머의 일리아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됐다.
이후 역사학계의 추적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헬레나’라는 미인의 변덕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 해상 세력과 트로이가 중심이 된 소아시아 세력 간의 해상권 쟁탈에 있었다는 유추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슐리만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기원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철학자였던 에우헤메로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신성한 역사’라는 책에서 “모든 그리스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행동이 걸출한 영웅들이 사후에 그를 기리는 대중으로부터 신으로서의 영예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건 기존의 주류 역사학계가 이 책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이 책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세웠으나 근저에는 단군신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즉 단군신화를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신화로 볼 것이냐는 문제, 이른바 ‘식민사관’ 논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재야 사학계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건국신화가 무시된 시기는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일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단군신화를 허구로 폄하하면서부터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같은 식민사관의 흔적은 1920년대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학자 이병도 등의 학맥에 의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단고기’는 이 주류 사학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었기에 의도적인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평양의 단군묘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북한의 의도는 자신들이 ‘식민사관의 오염’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시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본은 한국의 신화를 허구로 만든 대신 자신들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본이 자기네 건국신화의 근거로 삼는 역사서 ‘일본서기’는 허위 기사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책이다. 실존하지도 않은 진무 천황 등 9명의 인물들을 왕으로 올려놓고 아마테라스라는 여신까지 만들어냈다.
신화를 만들고, 그 신화를 역사화하려는 욕구는 이처럼 집요하다. 신화의 조작은 곧 역사의 조작이기 때문이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