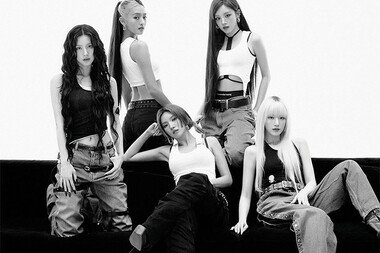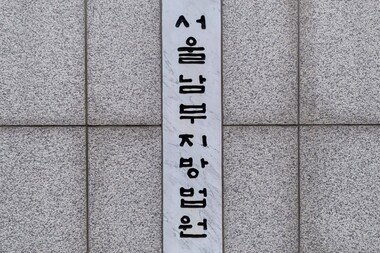대학가 ‘잘 가르치기 열풍’을 취재하면서 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해 인턴으로 일하고 간 대학 4학년 친구였습니다. 학교생활을 묻자 그는 “이것저것 뭐든지 많이 하려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등록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서, 기를 쓰고 학교 기자재를 사용하고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에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인문대 기준 200만 원이었던 등록금이 2배 이상 뛰었지만, 대학가 풍경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수업 개설 과목과 수업 방식 모두 고전에 머물러 있었죠.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실 안 시간도 더디 흘렀던 것입니다. 대학 공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와 ‘하기 나름’이라는 말로 대학과 교수들은 학습의 책임에서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인상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학부제나 복수전공제를 악용하는 것만 봐도 책임감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자유롭게 학문을 체험하기보다 적절히 전공과 교양 과목을 배분하는 데 급급하니까요. 주입식 교육과 헬리콥터 학부모로 인해 약화된 내성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학부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일어 참 다행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육모델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진작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만큼 교육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계무대로 나간 졸업생이 곧 그 대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연구로 바쁜 틈틈이 학부생들 챙기는 교수도 많습니다. 이제 대학이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줄 때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지병 앞에 효자 없듯,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에 교육자들도 지칠 수 있으니까요. 논문 실적만큼 교육평가가 중요해진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배움에 목마름을 느낀다면, 우리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 정상에 설 것입니다.
연구로 바쁜 틈틈이 학부생들 챙기는 교수도 많습니다. 이제 대학이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줄 때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지병 앞에 효자 없듯,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에 교육자들도 지칠 수 있으니까요. 논문 실적만큼 교육평가가 중요해진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배움에 목마름을 느낀다면, 우리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 정상에 설 것입니다.
그 얘기에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인문대 기준 200만 원이었던 등록금이 2배 이상 뛰었지만, 대학가 풍경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수업 개설 과목과 수업 방식 모두 고전에 머물러 있었죠.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실 안 시간도 더디 흘렀던 것입니다. 대학 공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와 ‘하기 나름’이라는 말로 대학과 교수들은 학습의 책임에서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인상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학부제나 복수전공제를 악용하는 것만 봐도 책임감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자유롭게 학문을 체험하기보다 적절히 전공과 교양 과목을 배분하는 데 급급하니까요. 주입식 교육과 헬리콥터 학부모로 인해 약화된 내성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학부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일어 참 다행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육모델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진작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만큼 교육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계무대로 나간 졸업생이 곧 그 대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