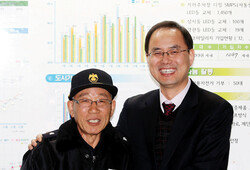서울을 흔히 600년 역사 도시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다. 이 말이 쓰인 건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1394년부터 꼭 600년이 지난 1994년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인데, 실제 수도로서 서울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길고 깊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보물
백제 첫 도읍지가 바로 위례성, 지금의 서울 아닌가. 백제왕조 700여 년 가운데 가장 오랜 도읍지가 바로 서울이었고, 백제가 최전성기를 보낸 곳 또한 서울이다. 우리는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서의 백제 역사는 말하면서 한성(서울)에서의 역사는 종종 잊는 것 같다. 유리와 고구려 왕권 계승을 놓고 경쟁하다 밀린 온조가 서울에서 새로운 나라 백제를 건국한 데도 한강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다.
한강은 서울의 보물이다. 예나 지금이나 젖줄처럼 도시를 감싸 흐르면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1000만 시민을 먹인다. ‘두근두근 서울여행’ 오늘은 한강과의 데이트다. 산에 올라도 좋고 높은 건물에 올라서도 좋다. 서울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보라. 한강의 존재감을 느껴보자. 한강을 빼놓고 서울을 말할 수 없다. 한강이 곧 서울이다.
1994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간 첫 직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강 연구였다. ‘한강 연접지역 경관 관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1년짜리 연구 책임을 맡고 연구원들과 함께 한강을 누볐다. 요즘이야 위성 영상과 디지털 지도가 있지만 당시에는 암모니아 냄새 진하게 맡으면서 청사진을 구운 뒤 줄줄이 이어 연구실 벽에 한강과 주변지역 현황도를 붙였다.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찍은 사진과 스케치한 그림을 청사진 사이사이에 붙이면서 한강의 경관을 면밀히 분석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참 ‘앙증맞은’ 수준이었겠지만 당시에도 한강 주변 건물이 점점 고층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위압경관’ ‘차폐경관’ ‘잠식경관’ ‘획일경관’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게 기억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입면적(아파트 높이와 폭을 곱한 값)과 차폐도(아파트 입면적을 모두 더한 값을 단지 전면 길이로 나눈 값)라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를 시작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지표적 심의기준’이란 이름으로 1996년부터 현실에 적용돼 고층이면서 아파트 폭까지 넓은 이른바 ‘고층광폭형’ 아파트가 더는 한강변에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자이 아파트단지처럼 고층아파트가 한강변에 건축돼도 건물 폭이 넓지 않고 건물 사이사이가 넉넉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연구자로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그런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다. 한강변 아파트의 열린 틈 사이를 용산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죄다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반포에서 이촌동을 바라보면 더는 남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촌동뿐인가. 한강을 따라 늘어선 담장은 점점 높아졌고, 더욱 촘촘해지는 중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는 1996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강의 웅장한 스케일에 깜짝 놀랐고, 곧이어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한강을 담 두르듯 에워싸고 있는 아파트에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가 요즘 다시 서울에 와서 한강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 않을까.

한강을 연구하다 아주 고생한 적도 있다. 지금은 한강의 명소로 사랑받는 선유도공원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다. 고건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1999년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연구원의 새서울가꾸기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새서울 우리 한강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했던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을 지나치게 치수(治水·홍수 및 수질관리)와 이수(利水·유람선 운항과 한강시민공원)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는 반성 하에 한강의 자연생태를 회복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게 담당 업무였다. 선유정수장을 공원으로 변화시키는 계획도 여기 포함돼 있었다. 도시재생을 중시하는 요즘 같으면 아주 멋진 계획이라고 칭찬을 들었을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개념이 생소했는지 마치 피의자 심문을 하듯 꼬치꼬치 캐묻는 감사를 받으며 며칠을 고생해야 했다. 아마 한강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건 이런저런 추억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널 때마다, 또 차를 타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달릴 때마다 나는 한강을 유심히 살핀다. 서울 어디서나 눈에 들어오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볼 때는 안하무인 독불장군을 마주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뚝섬에 들어선 갤러리아포레와 한양대 앞의 서울숲더샵은 로마숫자를 가르치려는 듯 거대한 수직 기둥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서울 정중앙 남산과 관악산을 잇는 남북축상의 이촌동에도 래미안 이촌첼리투스라는 초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반포에도 여기저기 초고층빌딩이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의 보물 한강이 귀하게 대우받고 조심스럽게 쓰이면 좋겠다. 다들 ‘내 땅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같아 한강에게 미안하다. 우리 세대만이 아닌 먼 후세까지 오래오래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강을 소중히 아끼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좀 봐야 한다. 한강을 오갈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한강과 그 주변을 세심히 살펴보면 좋겠다. 한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