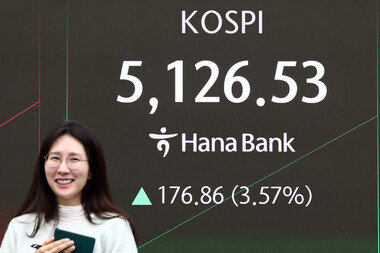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는 ‘프로젝트 프리모니션(Project Premonition)을 진행하고 있다. 전염병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열대지방에서는 모기를 잡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은 드라이아이스를 쓰지만 쉽게 녹아버린다. 이들은 특수하게 설계한 단말기를 드론에 탑재해 모기를 채집하고 이를 연구소까지 옮긴다. 잡힌 모기들로부터 병원균을 추출해 향후 발생 가능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다만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많다. 모기 채집이 어려울뿐더러 모기가 어떤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대규모 질병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다룰 컴퓨팅 파워도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IT 기업들 투자 잇달아
BT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구글이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2013년 노화방지 연구소 ‘칼리코(Calico)’를 설립하고 7억5000만 달러(약 88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칼리코는 최근 DNA 검사 전문업체 앤세스트리닷컴(Ancestry.com)과 협력해 장수한 가문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앤세스트리닷컴의 자회사 ‘앤세스트리DNA’가 보유한 1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DB와 700만 개 이상의 가계도를 활용해 유전 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신약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다.
구글은 ‘타미플루’나 ‘감기 증상’을 검색한 사람들의 주소를 모아 집단화해 독감 바이러스 활동을 예측하는 ‘독감 열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와 손잡고 콘택트렌즈에 혈중 당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결합, 눈에 끼우면 눈물을 분석해내 혈당을 재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 아내 앤 워치츠키는 유전자 스타트업 23앤드미(23andMe)를 세웠다. 통상 미국에서 개인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의료비 한계는 1000달러(약 117만 원) 정도다. 23앤드미는 단돈 99달러짜리 유전자검색키트로 DNA를 분석해 향후 질병 발생 가능성 등 250여 개의 의료 정보를 분석, 제공한다. 의사 도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가 5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서비스 정확도와 오·남용 가능성을 염려해 중단시켰지만 2월 유전성 희귀 질환인 ‘블룸 증후군’은 확인 가능하다고 해 업계는 차츰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도 BT 관련 유명 인사다. 틸은 분자생물학자 신시아 캐넌, 영국 컴퓨터 과학자 오브레이 디그레이에게 거액을 투자했다. 캐넌은 유전자를 조작해 회충의 수명을 갑절로 늘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인물이고, 디그레이는 사람의 세포에 새겨진 분자 손상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틸의 궁극적 목표는 유전자 구조를 연구해 인간의 세포를 재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관련 제품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국 웨어러블 업체 스프라우틀링(Sproutling)은 아기의 발목에 채워 심박수, 체온, 운동 등 신체 상태뿐 아니라 실내 온도, 습도, 밝기, 소음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내놨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를 분석하는 기능이 담겨 수면 상태의 질적 정도나 아이가 언제 잠에서 깨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미국 스타트업 이베나메디컬(Evena Medical)은 일명 ‘의료판 구글 글라스’라 부르는 이베나 아이온 글라스(Evena Eyes-On Glasses)를 내놓았다. 근적외선 시각화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를 투과해 혈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스마트 안경이다. 주사를 놓을 때 손으로 일일이 누르며 정맥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간단히 안경만 쓰면 된다.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 3세대(3G) 이동통신 등 무선통신도 가능해 영상 데이터를 촬영, 전송하는 기능이 담겨 있고 본체에 달린 스피커로 의료 지시도 즉각 받을 수 있다.
일본 혼다는 자체 개발한 로봇 ‘아시모’의 기술을 기반으로 걷는 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 장비 ‘혼다 보행 어시스트’를 개발했다. 허리와 양쪽 허벅지에 착용하는 형태다. 허리 부분에 센서 2개가 탑재돼 환자의 보폭과 걷는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터를 제어해 고관절과 다리의 움직임을 보조한다. 혼다는 이 제품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해 450대 매출고를 올릴 계획이다.
과학자를 꿈꾸던 대학생 엘리자베스 홈스가 2003년 설립한 스타트업 테라노스(Theranos)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소량의 혈액으로 30여 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만들어, 주사기로 피를 뽑는 대신 침을 활용해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기존 대비 필요 혈액량은 1000분의 1 수준이다. 혈액검사키트 하나로 향후 10년간 미국 전체에서 2000억 달러(약 234조9000억 원)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테라노스 측 설명이다. 테라노스는 대형 제약사들의 임상실험을 전담하며 쌓은 DB를 독자 분석 기술과 결합했다.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9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BT 기술의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의료학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술력이나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된 경우가 드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IT기업들이 유수 제약업체 등 기존 산업과 동반성장해 인류의 미래를 도와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BT는 아직 초창기 수준”이라며 “글로벌 IT기업들이 바이오업계를 지원하는 등 BT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IT 기업과 바이오업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