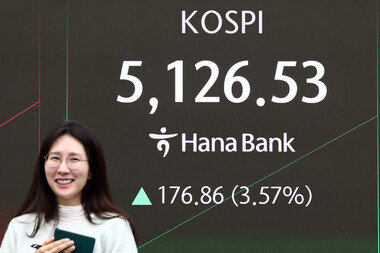금성이발(金星理髮) 문 열었구나
자두밭 출입문이 또 바뀌었다
이발(理髮) 다음 글자는 지워졌지만
붉은 ‘金星理髮’은 비 젖어 선명하다
얼기설기 거꾸로 매단 문짝 그대로
금성이발 문 열었네
봄비에 들키면서 왔다
첫 손님으로
오얏나무 의자에 앉으니
키 작은 아가씨들, 단내가 싱숭생숭하다
푸쉬킨의 시를 읽는 시간에 맞추어
자두애나무좀벌레 있다는
금성이발 문 열었구나
자두 꽃잎 사이 면도날 재우면
내 가잠나룻이야 금방 파릇해지지
자두 아가씨 속눈썹 이윽하니 이 몸의 퇴폐 데우겠다
잔무늬청동겨울이라 내 새치마저 숨는구나
자두비누 자두샴푸에
두피까지 시원한 이발이다
요금도 없이 외려 자두 한 움큼 받아오니
밀레의 만종이 반가운
금성이발 문 열었네
멀리 시내 갈 필요없다
집 옆 자드락 공터에 자두이발소 생겼구나
염색 꼭 하세요
아내의 신신당부와 함께
일요일마다 자두잼 바른 빵 먹고
이슬바심 이발하게 되었네
금성이발 문 열었구나
― 송재학 ‘내간체(內簡體)를 얻다’(문학동네, 2011)에서
푸시킨 시를 수십번 읽었던 시간
나는 이발하는 게 좋았다. 머리를 자르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가 머리를 감겨줄 때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 짧은 사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은은한 샴푸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이상했다. 나는 결단코 샴푸를 먹고 싶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두피까지 시원한 이발”이었다. 머리를 자르고 감고 매만지고 나면, 내가 좀 멋있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내 손이 닿지 않아야 내 머리가 근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이상했다. 다섯 살, 내 주위에는 이상한 것투성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이발소에 가던 날, 나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겠다고 아득바득 생떼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때때로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발소에서는 아저씨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머리를 자르는 기술을 선보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면도를 하려고 구레나룻 위에 하얀 거품을 뒤집어쓰고 누운 어른도 있었다. 까칠까칠하게 돋아난 수염이 어른의 전유물임을 깨달았다. “면도날”을 든 아저씨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가잠나룻”은 “금방 파릇해”졌다.
엄마를 따라 처음 미용실에 가던 날, 나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 이발소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나는 왜 이제 여탕에 갈 수 없는지, 또래 친구가 왜 이발소보다 미용실을 선호하는지 곰곰 생각해봤다. 큰다는 건,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어떤 이치를 자기도 모르게 깨우치는 것. 사소한 것에 의심을 품고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발소에는 으레 왜 ‘밀레의 만종’이 걸렸는지, 달력에는 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히 웃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어느 순간, 단골집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
엄마 따라 목욕탕에 드나들던 시절이 끝났다. 나는 엄마 따라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버지 따라 이발소에 다니던 시절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 따라 목욕탕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목욕탕도, 미용실도 혼자서 간다. 맞잡을 손이 없기에 괜스레 머리를 긁적이며 미용실 입구에 들어선다. “오얏나무 의자에 앉아” 내 순서가 되길 애타게 기다린다. 머리를 자르고 나와 가뿐한 마음으로 목욕탕에 간다. 거울 속에서, 사우나가 조금씩 좋아지는 나이에 접어든 나를 발견한다.

*오은 1982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졸업. 2002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으로 ‘호텔 타셀의 돼지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