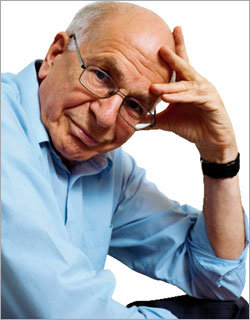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 심리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만일 저게 정말 100달러 지폐라면 누군가 벌써 집어갔을 것이네.”
경제학과 심리학 결합된 퓨전 학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자를 우습게(?) 표현하는 경제학계의 유명한 우스갯소리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00달러 지폐가 진짜라면, 합리적인 인간인 누군가가 먼저 가져갔을 것이라는 얘기다. 흔히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을 둘러싼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 사고의 출발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계산기’로 인간을 바라본다.
그런데 이런 지적 전통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등장했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선정됐을 때, 그것은 기존 경제학 이론에 대한 도전을 암시하는 대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카너먼 교수는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였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이 주변부 학문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사건이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이 결합해서 태어난 일종의 퓨전 학문이다. 이 퓨전 학문을 지지하고 나선 주된 세력은 학계도 학계지만 현실 금융시장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경험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때때로 집단적 광기나 손실회피 심리 등으로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금융시장과 행동경제학을 결합한 행동금융학을 제창한 시카고 경영대학원 리처드 탈러, ‘야성적 충동’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은 인간은 합리적이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금융시장 관계자들에게서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 투자의 세계에서 행동경제학적 방법론을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드레먼이다. 최근 행동경제학은 더욱 진화하면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전을 거듭해오는 뇌과학과도 살을 섞기 시작했다. ‘신경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 신흥 학문은 심리학의 범주를 넘어서 뇌과학과 인지과학적 방법론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적용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심리학적 이론을 펼치는 진화심리학·진화경제학도 행동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이들 신흥 학문의 공통점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기존 경제학은 거시적 또는 미시적인 방법론을 동원해 숫자로 표현하고 논리적 적합성을 추구하지만, 이들 학문은 인간 자체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의사결정의 오류에 주목한다.
이들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이론이 흔히 ‘갈지자 이론’으로 불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주식시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미래의 정보까지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게 이 가설의 핵심 논점이다. 이 때문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 등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이들이 내미는 주요한 증거 중 하나는 종목 선택과 마켓 타이밍의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의 형편없는(?) 투자 실력이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연 12.3%인 반면,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연 10.0%였다. 효율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다.
서브프라임 사태 후 ‘효율적 시장 가설’ 흔들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회의론적 시각을 견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 교수였다. 새뮤얼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빨리빨리 서둘러 매입하십시오’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난센스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게 확실하다면 이미 주가에 그 정보는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뮤얼슨 이후 계량적 방법론으로 무장한 경제학자들이 증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주가는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류로 등장했다.
새뮤얼슨 교수의 논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학자가 유진 파머와 노벨상 수장자인 윌리엄 샤프 교수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론적 바탕으로 운용사를 설립한 인물이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글이다. 보글의 논점은 간단하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등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하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왜 폭락해서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은 대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가의 주기적인 폭락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행동경제학이나 행동금융학의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가치투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한다. 이들의 시각은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때때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워런 버핏과 같은 뛰어난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시장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運)이 좋았다고 해석한다. 확률적으로 수십억 명이 주식투자를 한다면, 그중에 한두 명은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버핏이 바로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투자론자들은 가치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사숙한 버핏과 빌 루안, 월터 슐로스 등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장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은 한계가 있는 이론이라고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다고 버핏이 인덱스 펀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덱스 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비용으로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논란의 여지에도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고의 틀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이론은 공포와 탐욕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장과 조우할 때, 심리적 편견으로 잘못 대응하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수의 군중을 따라가는 ‘집단심리’, 수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 감정’, 최근의 사건에 주목해서 주가나 부동산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고 여기는 ‘최근성 편견’ 등은 투자에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개념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은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우리는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