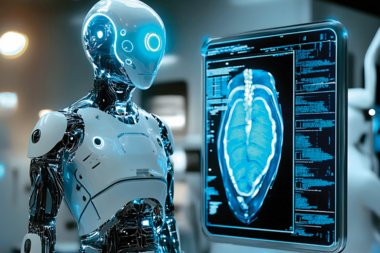역전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여자가 합석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눈 둘 곳 없어 신문을 가져다 들추었습니다
시킨 밥이 나란히 각자 앞에 놓이고
종업원은 동행인 줄 알았는지 반찬을 한 벌만 가져다주었습니다
벌 한 마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건지
도리가 없는 건지 창문 망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그릇에 불안을 비비는 소리를 냈을까요
새로 들여놓은 가구처럼 서름서름 마음을 설쳤을까요
배를 채우는 일은
뜻밖의 밑줄들을 지우는 일이겠습니다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여자도 나도 반찬 그릇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병률 ‘밑줄’(‘찬란’ 문학과지성사, 2010 중에서)
눈으로 반찬 먹은 ‘황당 시추에이션’
어느 날, 경북 구미시로 급히 출장을 가게 되었다.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다. 같이 가기로 한 연구원이었다. 급한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다는 거였다. 더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구미는 바로 그 연구원의 고향이었다. 반면, 나는 이번 구미 출장이 초행길이었다. 나는 구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동행만 철석같이 믿었기에 상황은 더 막막하게 느껴졌다. 나에게는 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아주 잠깐,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미리 뽑아놓은 표 두 장을 들고 타박타박 기차에 올랐다.
텅 빈 옆자리, 처음 가는 도시, 혼자 걷는 길, 혼자 먹는 밥, 혼자 자는 잠, 혼자, 혼자, 혼자…. 혼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메아리쳤다. 가뜩이나 길눈도 어두운데 길을 잃으면 어쩌지? 설상가상, 헤매는 것도 혼자 헤매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맥이 빠지고 정신이 아찔해져 그만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캔에 담긴 콜라가 옷에 다 튀었다. 흰옷 위에 고동색 반점이 군데군데 찍혔다. “창문 망에 자꾸 부딪”히는 “벌 한 마리”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세 시간쯤 흘렀을까. 우여곡절 끝에 구미에 도착했다. 사실, 기차가 달리는 것은 내 기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구미역을 빠져나오자마자 허기가 몰려왔다. 나는 순순히 그 허기에 지고 말았다. 구미에 오니 구미가 당기는 건가. 실소가 새어나왔다. 사방을 둘러봤다. 처음 와본 곳이라 그런지 계단 하나하나까지 다 낯설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서름서름 마음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근처에 보이는 가장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다. 허름해서 왠지 안심이 됐다. 식당은 어디론가 갈 사람들과 어딘가에서 온 사람으로 북적였다.
뭐가 맛있죠? “역전 식당” 음식 맛이 다 거기서 거기죠. 딱히 맛있는 것도, 아예 입에 못 댈 정도로 맛없는 것도 없어요. 왠지 그 솔직함이 맘에 들었다. 자리에 앉아 찌개를 하나 시켰다. 그때, 여행자 하나가 식당에 들어섰다. 나처럼 혼자 온 모양이었다. 식당은 만원이었고,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앉아도 좋다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니 이게 웬 떡이냐는 듯 내 앞에 턱 앉았다. 잠시 후 “시킨 밥이 나란히 각자 앞에 놓”였다. 손님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아주머니는 “반찬을 한 벌만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동분서주하는 사람을 불러 세워 북쪽에서 온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었다. 마땅히 “눈 둘 곳 없어” 뚝배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연기가 맵고 뜨거웠다. 먹기도 전에 땀이 흘렀다.
난생처음 만난 사람 둘이 식당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반찬을 향한 젓가락은 시종 망설였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숟가락은 그것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여자도 나도 반찬 그릇엔 손을 대지 않”아 젓가락 네 짝이 사이좋게 네 개의 “뜻밖의 밑줄”을 이루었다. 그때만큼은 그녀와 나의 마음이 완벽히 평행했다. 둘 중 누군가가 기울지 않으면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한여름의 구미였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던 날이었다. 혼자가 두렵지 않게 된 어떤 날이었다. 몇 년 뒤 두 번째로 구미를 방문했다. 혼자가 혼자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어쩐지 열기가 낯설지 않았다. 왠지 허기가 낯부끄럽지 않았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