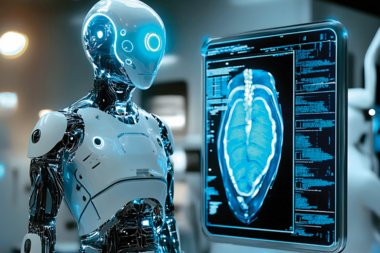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動力)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理性)은 투명(透明)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智慧)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누군들 부정하랴. 청춘이 ‘인류 역사의 동력’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은 정녕 쓸쓸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대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제법 오래 헤매 다닌 지금에 이르러 다시 읽어보건대, 작위적인 미문이 거슬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언제나 그 당대의 청춘이 참을 수 없는 갈증과 격렬한 방황의 열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세대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속이 텅 빈 ‘예찬’이 아닐 수 없다. 아래 부분이 특히 그렇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 끝에 스며들어가는 열락(悅樂)의 소리다.”
어두컴컴한 세상으로 첫발 떼는 수많은 ‘청춘’

우울한 공기가 가득 번져 있는 소설 완득이가 널리 사랑받는 것은 민태원처럼 미문으로 그 나이를 ‘예찬’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조건, 처지, 그들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어두컴컴한 세상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는 관계를,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춘’들이 갈망하기 때문이다.
월미도에 가보라. 해안 따라 횟집이 줄지어 있고, 싸구려 네온사인 번쩍번쩍거리면서 한 치 건너편 영종도, 실미도, 무의도 왕래하는 연락선이 다가오는데, 그 선착장 바로 뒤에 놀이시설들이 마치 지하철의 7인석 의자에 여덟 명이 억지로 앉듯 비좁은 공터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곳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아니다. 월미도에 흐르는 공기는 에버랜드의 맑고 상쾌한 공기가 아니다. 월미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롯데월드의 투명하게 정제된 바람이 아니다.

확실히 그 시선은 여름철의 캐리비언베이나 겨울철의 비발디파크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청춘’의 눈빛들이 아니다.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초점 없이 한 군데 눈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을 바라볼 것만 같은 많은 시선들을 맞받아치려고 일부러 힐끗거리는 시선들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녕 월미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천 태생으로 젊은 날의 이유 모를 멀미를 미묘한 시어로 쓴 김중식의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의 뒷부분은 항구도시 인천의 어떤 불안을 보여준다.
큰 도로로 나가면 철로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기차가/ 있다 가끔씩 그 철로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처연하게/ 걸어다니는데 철로의 양끝은 흙 속에서 묻혀 있다 길의/ 무덤을 나는 사랑한다 항구에서 창고까지만 이어진/ 짧은 길의 운명을 나는 사랑하며 화물 트럭과 맞부딪치면/ 여자처럼 드러눕는 기관차를 나는 사랑하는 것이며/ 뛰는 사람보다 더디게 걷는 기차를 나는 사랑한다/ 나를 닮아 있거나 내가 닮아 있는 힘 약한 사물을 나는/ 사랑한다 철로의 무덤 너머엔 사랑하는 西海가 있고/ 더 멀리 가면 中國이 있고 더더 멀리 가면 印度와/ 유럽과 태평양과 속초가 있어 더 더 더 멀리 가면/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상의 끝에 있는 집/ 내가 무수히 떠났으되 결국은 돌아오게 된, 눈물겨운.
오랜 시간 흐르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추억할 것
‘동해 일출을 보며 웃는 사람보다 서해 낙조 앞에서 우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한 김중식의 시에 짙게 깔려 있는 연무(煙霧)는 꼭 월미도를 가득 채우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시선들과 많이 닮아 있다. 소설 완득이의 열일곱 살 난 주인공들 말이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시간도 계속 흐를 것이다. 미성년이 성년이 되고, 군에 가거나 경리 일을 보거나 간신히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그들의 눈도 초점을 찾고 물끄러미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송찬호 시인은 시 기차에서 꼭 그러한 열일곱 살 기억을 되새긴다. 그렇게 기억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말에 애들 손잡고 월미도에 가서 회 한 접시라도 먹게 될 것이고, 아마 그때도 새로운 열일곱 살들은 바지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우두커니 서 있을 것이다.
비둘기집 같은 다락방에서 기타를/ 부숴버리고 뛰쳐나간 게 열일곱 살,/ 그해가 다 가기도 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버렸다/ 많은 날들을 방황하다 내가 조금이나마/ 삶을 이해하고 끌어안게 된 건 그만큼 훗날의 일이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