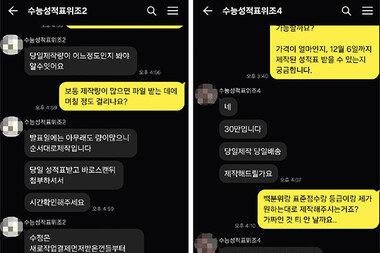줄거리만 건조하게 추리면 이렇다. 대학병원 의사인 아빠는 조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아내, 엄마의 관심은 오로지 전교 3등인 딸 수아가 1등이 되는 것이다. 겉보기엔 완벽한 이 부모의 딸은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전전긍긍한다. 친구가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우등생이지만, 수아는 오늘도 불안하기만 하다.
그 배경에는 쉴 새 없이 딸을 몰아붙이는 엄마가 있다. 성적이 우수한 친구와 같이 공부하겠다는 수아의 말에 엄마는 “넌 자존심도 없냐”고 힐난한다. 전교 3등인데 칭찬 한 번 안 해준다. “대체 왜 발전이 없느냐. 언제까지 3등만 할 거냐”고 다그칠 뿐이다.
딸에게는 숨 쉴 틈도, 기댈 곳도 없다. 수아는 도움을 구하려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지만 아빠는 그 나름의 고민에 빠져 아이의 신음을 듣지 못한다.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는 아빠의 모습은 분노조절장애에 빠진 현대인 그 자체다. 재판과 수술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그는 엉뚱하게도 택시기사에게 풀고자 한다.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감정노동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우리 시대 못난 갑(甲)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도와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는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한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고통을 호소하는 것조차 일상의 일부로 녹여버린다. 뻔한 말, 뻔한 호소, 뻔한 고통.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균열이 때로는 일상을 일상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곤 한다.
영화 ‘사랑이 이긴다’는 그런 고통과 상실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하는 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민병훈은 성찰적이고 철학적인 감독이다. 조용한 바람 소리, 침묵하는 화면 가운데서 일상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안간힘이 조금씩 침투한다.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지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소이기도 하다. 그 가족과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이 이긴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