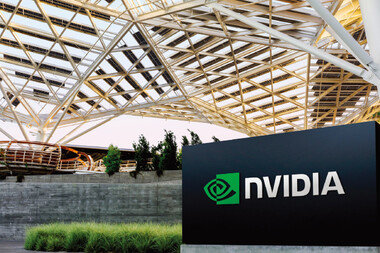참가 팀에 1990년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상징한 인물이 모두 속해 있다. 90년대 한국 인디 음악, 그중에서도 펑크를 완성한 노브레인 출신 차승우가 이끄는 더 모노톤즈. 90년대 영국 록의 상징 그 자체였던 오아시스의 보컬 리엄 갤러거. 너바나의 드러머였던, 하지만 그 후광에 의존하지 않은 데이브 그롤의 푸 파이터스. 이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렸던 시대는 곧 록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이기도 했다. 록페스티벌에서조차 록의 색깔이 옅어지고 있는 지금, 이 세 팀의 조합은 한 편의 드라마일 게 분명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더 모노톤즈는 리엄 갤러거와 푸 파이터스를 만났다. 그들의 리허설을 본 리엄 갤러거는 더 모노톤즈에게 “소리가 엄청 크고 복장이 마음에 든다”며 “시끄러운 것은 항상 옳다”고 칭찬했다. 더 모노톤즈는 이 칭찬에 걸맞게 첫 무대를 빛내고 들어갔다.
이어진 영국과 미국 대표의 대결, 리엄 갤러거가 먼저였다. 그는 오아시스 시절 노래와 최근 발매된 솔로 앨범 수록곡을 반씩 섞어 불렀다. 전자와 후자에서 관객석의 온도 차이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형 노엘이 연주하지 않는 오아시스 노래가 2% 부족하게 느껴진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 테다. 2009년 여름 해체한 오아시스가 재결성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8년이나 흘렀는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건 푸 파이터스였다. 2015년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내한한 이래 두 번째 공연이다. 첫 내한 직전 데이브 그롤은 사고를 당해 깁스를 한 채 ‘록의 왕좌(rock throne)’에 앉아 연주를 해야 했다. 그때도 환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폭발적 무대를 보여줬다. 부상 따위는 그의 열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온전한 두 다리로 무대를 휘저으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는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의 다리는 용의 여의주였다. 100분 정도의 러닝타임에 걸쳐 히트곡을 줄줄이 쏟아냈다. 진정한 록이란, 진정한 라이브란 무엇인지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설파했다.
힙합과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브 그롤은 록의 마지막 순수주의자처럼 보인다. 모든 레코딩이 디지털로 이뤄지는 게 당연한 세태에서 그는 명반의 산실이지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운드시티 스튜디오의 콘솔을 통째로 구입했다. 그리고 아날로그의 가치를 역설하는 ‘사운드시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번 내한은 그의 소신이 곧 무대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척 베리와 비틀스 이래 록이 어떻게 대중음악의 위대한 순간을 써왔는지 떠올렸다. 사춘기 때 인생을 바꿨던 그 굉음의 흔적을 길어 올렸다. 산업, 트렌드, 시장 같은 단어가 지배할 수 없는 어떤 본질을 다시 꺼내게 됐다. 록의 왕좌에서 일어나 무대를 전장처럼 호령하는 데이브 그롤의 손에 들려 있는 기타가 엑스칼리버처럼 보였다. 록의 시대는 끝났다는 체념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거기, 잠시 잊고 있던 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