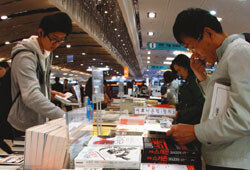10여 년 전 출범한 수유너머는 수유너머N, 수유너머문, 수유너머R, 인문팩토리 길, 남산강학원 등으로 세분화해가는 중이다. 350여 개의 인문학 동영상 강의로 정평이 난 아트앤스터디를 비롯해 철학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CAS), 다중지성의 정원, 문지문화원 사이 등이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집단지성의 실험실 카이로스, 생활기획공간 통, 자유인문캠프, 돌곶이포럼, 인문연대 금시정, 연구모임 비상, 기술미학연구회, 세미나 네크워크 새움, 상상마당 아카데미 같은 인문연구공동체도 개설돼 가히 백가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문학 생산 및 소비에서 대학은 대안대학과 비교해 경쟁우위를 상실했다. 오히려 경희대의 후마니타스처럼 대학이 대안대학 모델을 수용해야 할 정도다. 대안대학을 이끄는 사람은 대학에 융합하지 못한 젊은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비판적 안목이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에 일침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한 대중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점점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문과 진리탐구라는 대학의 기능은 진작 사라졌다고 봐야 옳다. 정보기술(IT) 혁명이 진행되면서 첨단기술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식을 세분화,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지식 간 융합도 이뤄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지식이 끊임없이 탄생했지만 대학은 이런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러한 몸부림이 거셀수록 대학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대학이 가진 인재양성 기능도 한계에 직면했다. 고도 성장기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실업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졸업생 중 약 5%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들이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조차 갈수록 짧아지면서 대학은 이제 말기암 상태에 접어들었다.
2006년 대학 종사자들이 인문학 위기를 선언한 이후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에 상당한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렇게 자금지원을 받아 생산한 지식은 대학에 목숨 줄을 매단 학자들의 ‘수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교양 수준으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으로 가는 정거장으로 전락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 시스템마저 붕괴시켰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교육 불가능의 시대’가 된 것이다.

1958년 출생.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학교도서관저널’ ‘기획회의’ 등 발행. 저서 ‘출판마케팅 입문’ ‘열정시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베스트셀러 30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