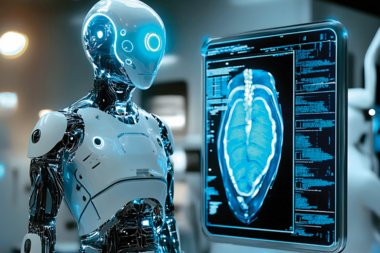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The collector 4’, 2009, oil on canvas, 200×240cm
이미 미술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써지고 그 문맥 안에서 비평의 힘을 얻는 예술가만 살아남을 수 있기에, 아무래도 미국 출신이나 유럽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한 경험이 있는 작가가 뉴욕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드리안 게니(Adrian Ghenie, 1977~)는 상당히 의외의 화가입니다.
몇 달 전 그의 작품 ‘컬렉터4’를 보고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래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렬했던 작품의 인상도 희미해지게 마련인데 그의 작품은 달랐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유럽 출신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는 루마니아 사람이더군요. ‘컬렉터4’는 그가 최근에 발표한 연작 중 하나인데, 핏빛 가득한 캔버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벽면을 꽉 채우고 있는 미술품들입니다. 시선은 이제 한쪽 팔을 늘어뜨린 죽은 낯빛의 인물로 향합니다.
폐소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작품을 모은 광적인 컬렉터가 몸을 누인 가죽 침대는 얼마나 협소한지, 수집된 미술품 규모를 더욱 방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천장에 매달린 사람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그는 왜 장교복을 입은 채 도플갱어처럼 컬렉터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작품의 주인공은 헤르만 괴링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에이스이던 그는 공중전의 영웅이었지만, 후에 나치당에 들어가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었죠. 그리고 점령하는 곳마다 엄청난 예술품을 약탈해 개인 컬렉션으로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형 집행 직전 자살하고 마는데요. 침대에 누운 그의 모습은 바로 자살 직후 찍은 사진과 동일합니다. ‘컬렉터4’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연이어 강대국으로부터 점령당한 루마니아인으로서의 자각은 물론,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유럽 역사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품은 마치 추상표현주의의 화면 구성을 보는 듯합니다. 역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와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작가의 역사관을 반영한 거죠. 또 작품 속 작품들은 괴링이 당시 모은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의 현대미술 대표작을 연상시키는데요. 이처럼 아드리안 게니는 자신의 작품이 미술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대 후반부터 뉴욕은 물론 런던, 베를린, 취리히의 유수 갤러리에서 바쁘게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할 정도로 각광받는 이유는 역사와 미술사, 개인의 꿈과 집단무의식을 한 화면에 결합한 그의 천재성에 있습니다.
|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