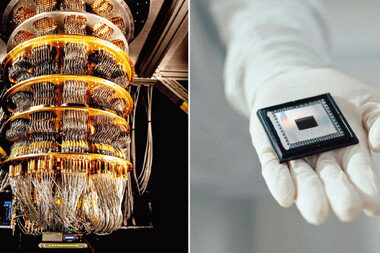- 《술에 취하고 절경에 취하고, 이번 주부터 술 기행을 떠난다. 자고로 명주가 나는 곳은 물이 좋고, 물이 좋으면 산 높고 계곡 깊게 마련이다. 그곳을 찾아가 술 한잔 걸치고 풍취를 즐기는 여정이다. 전통 민속주의 누룩향 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터이고, 술 빚는 과정과 술에 얽힌 얘기를 통해 진한 향토애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술기행을 통해 20세기 식민지 시대와 빈곤의 시대에 억압받던 민속주를 되살려내기 위한 장인들의 노력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우린 모시로 유명한 서천군 한산 지방에 두루 퍼져 있는 소곡주를 맛보기 위해 떠났다. 동행한 선배는 서천 사는 후배가 집에서 담근 소곡주를 몇 차례 보내와 그 맛을 익히 알고 있었다. 순하고 부드럽고 단맛이 돌아서 여자들이 특히 좋아할 만하다는 게 선배의 평이었고,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혹한 것은 여자 후배였다.
한산 소곡주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백제 무왕이 백마강 가에서 신하들과 노래하고 춤추면서 마시던 술이 소곡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더욱 널리 퍼져, 경상도 영양에 살던 안동 장씨(1598~1681)가 지은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에 담그는 법이 소개되었고,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1786~1855)가 지은 가사 ‘농가월령가’의 정월 편에는 “며느리 잊지 말고 소곡주 밑하여라, 삼춘(三春) 백화시(百花時)에 화전(花前) 일취(一醉)하여 보자” 라는 표현이 있다.
소곡주를 빚어서 파는 양조장은 한산에 한 곳뿐으로, 한산 모시관 맞은편에 있다.
한산 소곡주 양조장(0459-951-0290) 대표 나장연씨는 충남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어머니 우희열씨(61세)와 함께 술을 빚고 있었다. 1979년에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나씨의 할머니 김영신씨(1916~97)의 친정 집안은 대대로 한산면 호암리에 살면서 술을 빚어왔다. 그 집안에 밝혀져 있는 소곡주의 계승 경로만도 300년을 거슬러 1664년생인 전주 이씨 할머니까지 올라간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했다는 나장연씨는 우리 일행을 만나자마자 음식점으로 이끌어 소곡주 한 잔을 권했다. 잘 익은 벼이삭처럼 노릇한 술은 그윽한 누룩 내음을 풍겼다. 요새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나 독한 소주 양주에 길들여 있지만, 이 누룩 내음이 본디 우리 선조들의 코끝에 맴돌던 술 내음이다. 술잔을 기울이니 입안에 달콤쌉싸래한 맛이 감돌고, 술잔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혀에 알알한 기운이 돌았다. 술 맛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물이고, 두 번째가 누룩이고, 세 번째가 온도란다. 소곡주는 염분이 없고 철분이 약간 함유되어 있는 건지산 물로 담가야 제맛이 난다. 건지산 물이 좋다는 얘기는 양조장에서 고개 하나 너머,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96)의 묘와 사당이 있는 문헌서원 관리인으로부터 실감나게 들을 수가 있었다. 여름에 모기에 물려 가려워도 그 물에 목욕하고 나면 아무렇지가 않은 진짜 약수란다.

누룩이 갖춰지면 비로소 술 빚기에 들어간다. 물에 불린 누룩가루에 흰무리 떡을 담아두면 나흘 뒤에 발효된 밑술이 된다. 밑술에 찹쌀 고두밥을 넣고 잘 젓는다. 이때 넣는 들국화, 메주콩, 엿기름이 소곡주의 독특한 향과 맛을 낸다. 그러고는 사된 기운을 물리치고 술이 잘 빚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붉은 고추를 술항아리에 꽂는다. 이제 술항아리를 덮고 숙성 과정에 들어간다. 100일 뒤 술항아리를 열고 대나무 용수를 박아 떠낸 술이 바로 18도 도수의 한산 소곡주다.
나장연씨는 똑같은 공정과 정성으로 술을 빚어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보다 더 제각각인 것이 술맛이라고 한다. 땅에 묻힌 술항아리를 열고 술국자로 떠준 술맛이 아니나 다를까 모두 달랐다. 단맛에서부터 상쾌하고 개운한 맛까지 조금씩 차이가 났다. 이 술맛을 보려고 며느리가 홀짝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취하여 앉은뱅이처럼 엉금엉금 기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곡주를 앉은뱅이 술이라고도 부른다.
나씨의 할머니는 아침이면 반주로 소곡주를 꼭 한 잔씩 했단다. 후배가 그 말을 깜짝 반긴다.
이 소곡주는 민속주 판매 제한이 풀린 1990년부터 시판되어, 이제는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gokju.co.kr)에 들어가면 상세한 정보와 구입처를 알 수 있는데, 올 가을에는 43도의 증류주도 시판할 예정이라며 젊은 사장은 강한 의욕을 보인다.
술을 야금야금 받아먹으며 술도가를 둘러보고 나니 취기가 돌았다. 청량한 바람이 그리웠다. 술병을 들고 오른 곳은 토성으로 이뤄진 건지산성이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백제의 유민들이 울분을 삼키며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주류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찻길에서 이십 분쯤 오르자 산정이 나왔다. 산 아래로 한산벌이 아찔하게 내려다보였다. 날이 흐려 서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에돌아나가는 금강의 허리가 아련하게 보였다. 들판에는 연기가 군데군데 꿈처럼 흘러다녔다. 쥐불 연기였다. 그 연기가 풀어헤쳐져 봄 들판이 희붐해진 것 같았다.
아직 몸을 휘감고 있는 술 기운 탓일까, 산정에 있는 끊어진 그네 줄에 한 번씩 몸을 맡겨보다가 뒤뚱뒤뚱 산을 내려왔다.
휘청거리는 고려 왕조를 세워보려 했던 목은 이색의 묘에 술 한 잔 올리지도 못한 채 숙소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녘에 일어나 금강가의 갈대밭을 거슬러 오르며 길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철새떼를 보자면 일찌감치 자두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붉고 통통한 볼에 눈이 맑은 여자 같은 소곡주 한 잔으로 객수를 달래고 잠자리에 들었다.
과연, 새벽에 나가 본 금강의 새떼는 장관이었다. 은은한 향취의 술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런가, 수천 수만마리 새들이 물에 점점이 떠있다 일제히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 속 깊은 곳의 묵은 때가 절로 벗겨져 나가는 듯했다. 좋은 술과 멋진 절경. 이게 바로 사는 맛이 아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