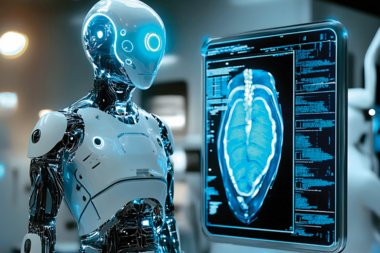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피청구인(노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일부다.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30조 2항은 국회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이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결정 vs 국민의 명령
2004년 탄핵정국은 그해 3월 9일 의원 159명이 기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적의원(270명) 과반을 훌쩍 넘긴 인원이었지만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데 필요한 18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는 21명이 부족했다. 2016년 상황도 이와 닮은꼴이다. 야당 의원만으로도 탄핵을 발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여당 의원 29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33쪽 상자기사 참조). 새누리당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놓았지만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투표함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2004년 탄핵정국을 주도한 야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치밀한 사전 작업을 펼쳤다. 엄광석 전 SBS 대기자가 펴낸 책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 탄핵, 그 혼돈의 내막’에 따르면 유용태 당시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는 ‘한 사람 한 사람 크로스체크를 해나가면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도 같은 책에서 ‘마치 동원예비군 소집 비슷한 상황이었다. 해외에 나간 의원들을 부르고 분위기를 잡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차례차례 서명을 받아나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해 일정 부분 ‘공개투표’까지 강행한 것이다. 지금도 야당의 일부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기 전 개별 의원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무기명투표를 보장해야 여러 상황 탓에 드러내놓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는 일부 여당 의원 표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현 상황이 2004년과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당시엔 야권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을 발의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국민의 압력으로 탄핵국면이 시작된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한국공법학회에 소속된 헌법 전공 교수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0%(29명)가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헌재 재판관일 경우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을 파면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명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야권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잖았다. 그해 3월 4일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발언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의원 등은 탄핵 반대의견을 밝히고 퇴장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남경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이후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사과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등 강공 일변도로 나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재적의원 270명 중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지금과 같은 ‘국민의 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후 거센 역풍이 불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엔 임기 시작 후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임기가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의원들이 탄핵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와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의원들이 탄핵하려는 상황이다.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와 2016년 사이에 다른 점은 또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해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당시 국회는 노 대통령 탄핵 사유로 권력형 부정부패와 국정파탄 등도 추가로 제시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명시적인 위법 사항이 파면돼야 할 만큼 중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다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최소한 겉으로는 탄핵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도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야권을 자극해 탄핵을 부추겼다는 평을 들었다. 박 대통령도 11월 20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탄핵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가능한 순간까지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도 비슷하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박관용 국회의장은 회고록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니 대통령이 지방 행사 참석차 내려갔다 오후 5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국회에서 보내는 공문의 도착 시간이 대통령의 업무정지 개시 시간이므로 대통령이 돌아오는 5시 이후에 공문이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계시는 시간에 보내는 것이 그나마 예의라고 생각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정치권 안팎의 권한이양과 2선 후퇴 요구에도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