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귀차 향기가 감도는 황토방이 친숙해졌다. 새벽잠을 깨우던 새소리, 풀벌레소리도 이젠 자연의 교향곡으로 들렸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던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에겐 꿈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판수, 여옥, 방미, 그리고 바보 박사.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할까 하다 뜻밖의 인물이 떠올랐다. 김 부장은 옥수수 망태를 내려놓고 그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오토바이맨이시죠?”
“그렇습니다만….”
“난 몇 차례 꿈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꿈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뇨, 초대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뤘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는 흔쾌히 초대에 응했다. 오늘이 그날이다. 밀짚모자를 쓴 주인은 아침부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면 옥수수 꺾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녁은 산나물 비빔밥으로 차립니다. 잘 익은 오가피주가 반주고요. 후식은 산수박. 달고 맛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수염차. 은은한 향기가 참 좋아요.”
한 번 엮이면 질긴 게 인연인가 보다. 철방과의 재회, 방미 남편이 번돌이라는 사실이 그랬다. 번돌의 변한 모습은 의외였다. 폭력적 객기가 반전해 경찰이 되어 있다니.
사건도 꼬리를 무는 근성이 있었다. 그들과의 재회 다음 날이었다. ‘꿈을 사신 분들께’라는 이상한 e메일이 판수에게 날아들었다. 처음엔 스팸메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웠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 그 제목은 어김없이 e메일함에 있었다.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e메일을 보자마자 문득 철방의 말이 떠올랐다. “형도 고민 있으면 말해봐! 꿈 한 방이면 해결이야!” 판수는 그 말을 떠올리며 e메일을 열었다.
일곱 번째 보낸 e메일을 여셨네요. 꿈을 사셨더군요. 황금 잎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셨죠?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정말 그 꿈을 이뤘나요? 황금을 긁어모으셨나요?
판수는 주판알 굴리듯 머리를 돌렸다. 그 꿈을 꾼 다음 날 사표를 던진 걸 상대는 알고 있었다.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왜 이런 e메일을? 판수 다음으로 방미가 퇴사했다. 판수는 방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다음이 여옥이었다. 판수는 여옥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오, 주판수, 아니 주 대표! 잘돼 가?”
여옥은 반갑게 맞았다.
“글쎄, 알파는 있는데 아직 오메가는 보이지 않네.”
“알파투오메가, 이름 좋잖아. 기다려봐. 곧 잘되겠지.”
“개성공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다. 회사가 먹여줄 때가 좋았어.”
여옥은 반쯤 넋이 나간 필승을 떠올리며 판수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길어질 것 같아 접기로 했다. 그리고 화제를 돌렸다.
“참, 초대전화 받았지? 주말에 함께 모여서 가자.”
“누가 초대했다고?”
“김 부장님. 곰배령에서 농사짓나 봐. 인적이 드물어 사람이 그립대.”
판수는 꿈 이야기를 꺼냈지만 여옥은 골치 아픈 녀석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다. 다시 이상한 e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전화 너머 여옥의 음성은 지쳐 있었다.
“e메일 확인할 여유조차 없다.”
여옥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다. 여옥의 시선이 잠시 필승의 빈자리에 머물렀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여옥 앞에 섰다.
“필승 씨 외근 중입니다.”
여옥은 돌아와 인터넷에 접속한 뒤 e메일함을 살폈다. 판수가 말한 그 e메일이 보였다. 발신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옥은 개성공단 봉재공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즈음을 떠올렸다. 어느 날 김 부장이 판수 소식을 물으며 한마디 던졌다.
“장 과장은 꿈 안 꿔?”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꾸고 싶은 꿈 있으면 말해봐!”
“개성공단에 들어가 봉재공장 해볼까 하는데…. 판단이 안 서네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꿈을 원해요.”
“오~케이~.”
며칠 후 꿈을 꿨다. 꿈속에서 백발노인으로부터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열어 보니 산삼이 가득했다. 송악산 정기를 받은 산삼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취를 감췄다. 다음 날 출근했는데 김 부장이 여옥을 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좋은 일 있지?”
재수가 샐까 봐 여옥은 그 꿈에 대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표를 던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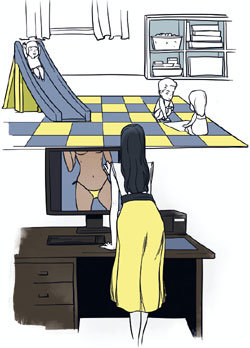 방미는 아이들과 노는 중이었다. 노는 중에는 항상 전화를 두고 나왔다.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생활형 유아원의 교육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와 확인하니 판수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다.
방미는 아이들과 노는 중이었다. 노는 중에는 항상 전화를 두고 나왔다.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생활형 유아원의 교육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와 확인하니 판수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다.
“전화했었네?”
“김 부장님에게 전화 받았어?”
“응, 함께 오라고 그러지? 초대한다고…. 어, 내 컴퓨터가 왜 이래?”
방미의 컴퓨터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장 난 TV처럼 이상한 바람소리도 지나갔다. 방미는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렸다. 음란물 수준의 동영상이 떴다가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음란물이 떴다가 사라지네.”
방미는 판수와 전화를 끊고 문제의 e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인터넷이 다운돼 e메일함에 접속할 수 없었다. 혼자 낑낑대다 포기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문자메시지가 떴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음란물이 돌아다니는군요.’
방미는 발신자를 확인했으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여옥과 방미는 판수의 스포츠카에 동승해 서울을 떠났다. 곰배령까지는 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 부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방미는 유아원 한다며?”
“네.”
“사람들은 곰배령을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지.”
“정말 좋네요.”
여옥과 판수가 동시에 말했다.
“이곳에는 곰배령 할배 전설이 전해지지. 참회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돌배나무 할배야. 수령이 300년 가까이 됐대. 그 앞에서 뉘우치면 죄를 사해준다는구먼. 죄 있으면 씻고 가.”
당귀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모두 평상에 둘러앉자 김 부장이 판수, 여옥, 방미를 번갈아보며 말을 이었다.
“회사의 밀명을 받고 네 명까진 잘랐는데 한 명은 찾을 수가 없잖아. 누굴 내보내? 그래서 부탁했지. 그 사람한테 말이야. 과수원을 하고 싶은데 꿈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정말 미안해.”
“세상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니까요.”
주판수가 농담을 던졌다.
“그래서 곰배령 할배 나무에게 날마다 빌었어.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주판수! 우리 과수원 복숭아는 네가 다 처분해라. 네 꿈처럼 대박 한 번 터뜨려봐!”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김 부장은 고개를 돌린다.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와 판수의 빨간 스포츠카 옆에 선다.
“꿈을 만든 친구야.”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철방을 쳐다보던 판수의 뇌리에 섬광이 일었다. 문제의 e메일과 철방의 모습이 교차했다. 모두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판수가 철방 앞으로 걸어갔다.
“철방아, 널 겨누는 칼끝이 있다. 조심해야겠다.”
그들에겐 꿈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판수, 여옥, 방미, 그리고 바보 박사.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할까 하다 뜻밖의 인물이 떠올랐다. 김 부장은 옥수수 망태를 내려놓고 그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오토바이맨이시죠?”
“그렇습니다만….”
“난 몇 차례 꿈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꿈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뇨, 초대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뤘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는 흔쾌히 초대에 응했다. 오늘이 그날이다. 밀짚모자를 쓴 주인은 아침부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면 옥수수 꺾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녁은 산나물 비빔밥으로 차립니다. 잘 익은 오가피주가 반주고요. 후식은 산수박. 달고 맛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수염차. 은은한 향기가 참 좋아요.”
한 번 엮이면 질긴 게 인연인가 보다. 철방과의 재회, 방미 남편이 번돌이라는 사실이 그랬다. 번돌의 변한 모습은 의외였다. 폭력적 객기가 반전해 경찰이 되어 있다니.
사건도 꼬리를 무는 근성이 있었다. 그들과의 재회 다음 날이었다. ‘꿈을 사신 분들께’라는 이상한 e메일이 판수에게 날아들었다. 처음엔 스팸메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웠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 그 제목은 어김없이 e메일함에 있었다.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e메일을 보자마자 문득 철방의 말이 떠올랐다. “형도 고민 있으면 말해봐! 꿈 한 방이면 해결이야!” 판수는 그 말을 떠올리며 e메일을 열었다.
일곱 번째 보낸 e메일을 여셨네요. 꿈을 사셨더군요. 황금 잎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셨죠?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정말 그 꿈을 이뤘나요? 황금을 긁어모으셨나요?
판수는 주판알 굴리듯 머리를 돌렸다. 그 꿈을 꾼 다음 날 사표를 던진 걸 상대는 알고 있었다.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왜 이런 e메일을? 판수 다음으로 방미가 퇴사했다. 판수는 방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다음이 여옥이었다. 판수는 여옥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오, 주판수, 아니 주 대표! 잘돼 가?”
여옥은 반갑게 맞았다.
“글쎄, 알파는 있는데 아직 오메가는 보이지 않네.”
“알파투오메가, 이름 좋잖아. 기다려봐. 곧 잘되겠지.”
“개성공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다. 회사가 먹여줄 때가 좋았어.”
여옥은 반쯤 넋이 나간 필승을 떠올리며 판수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길어질 것 같아 접기로 했다. 그리고 화제를 돌렸다.
“참, 초대전화 받았지? 주말에 함께 모여서 가자.”
“누가 초대했다고?”
“김 부장님. 곰배령에서 농사짓나 봐. 인적이 드물어 사람이 그립대.”
판수는 꿈 이야기를 꺼냈지만 여옥은 골치 아픈 녀석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다. 다시 이상한 e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전화 너머 여옥의 음성은 지쳐 있었다.
“e메일 확인할 여유조차 없다.”
여옥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다. 여옥의 시선이 잠시 필승의 빈자리에 머물렀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여옥 앞에 섰다.
“필승 씨 외근 중입니다.”
여옥은 돌아와 인터넷에 접속한 뒤 e메일함을 살폈다. 판수가 말한 그 e메일이 보였다. 발신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옥은 개성공단 봉재공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즈음을 떠올렸다. 어느 날 김 부장이 판수 소식을 물으며 한마디 던졌다.
“장 과장은 꿈 안 꿔?”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꾸고 싶은 꿈 있으면 말해봐!”
“개성공단에 들어가 봉재공장 해볼까 하는데…. 판단이 안 서네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꿈을 원해요.”
“오~케이~.”
며칠 후 꿈을 꿨다. 꿈속에서 백발노인으로부터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열어 보니 산삼이 가득했다. 송악산 정기를 받은 산삼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취를 감췄다. 다음 날 출근했는데 김 부장이 여옥을 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좋은 일 있지?”
재수가 샐까 봐 여옥은 그 꿈에 대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표를 던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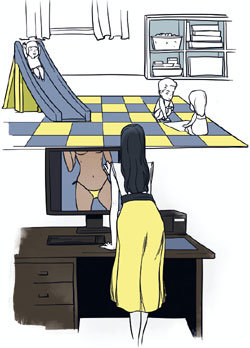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오동진
“전화했었네?”
“김 부장님에게 전화 받았어?”
“응, 함께 오라고 그러지? 초대한다고…. 어, 내 컴퓨터가 왜 이래?”
방미의 컴퓨터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장 난 TV처럼 이상한 바람소리도 지나갔다. 방미는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렸다. 음란물 수준의 동영상이 떴다가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음란물이 떴다가 사라지네.”
방미는 판수와 전화를 끊고 문제의 e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인터넷이 다운돼 e메일함에 접속할 수 없었다. 혼자 낑낑대다 포기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문자메시지가 떴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음란물이 돌아다니는군요.’
방미는 발신자를 확인했으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여옥과 방미는 판수의 스포츠카에 동승해 서울을 떠났다. 곰배령까지는 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 부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방미는 유아원 한다며?”
“네.”
“사람들은 곰배령을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지.”
“정말 좋네요.”
여옥과 판수가 동시에 말했다.
“이곳에는 곰배령 할배 전설이 전해지지. 참회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돌배나무 할배야. 수령이 300년 가까이 됐대. 그 앞에서 뉘우치면 죄를 사해준다는구먼. 죄 있으면 씻고 가.”
당귀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모두 평상에 둘러앉자 김 부장이 판수, 여옥, 방미를 번갈아보며 말을 이었다.
“회사의 밀명을 받고 네 명까진 잘랐는데 한 명은 찾을 수가 없잖아. 누굴 내보내? 그래서 부탁했지. 그 사람한테 말이야. 과수원을 하고 싶은데 꿈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정말 미안해.”
“세상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니까요.”
주판수가 농담을 던졌다.
“그래서 곰배령 할배 나무에게 날마다 빌었어.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주판수! 우리 과수원 복숭아는 네가 다 처분해라. 네 꿈처럼 대박 한 번 터뜨려봐!”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김 부장은 고개를 돌린다.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와 판수의 빨간 스포츠카 옆에 선다.
“꿈을 만든 친구야.”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철방을 쳐다보던 판수의 뇌리에 섬광이 일었다. 문제의 e메일과 철방의 모습이 교차했다. 모두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판수가 철방 앞으로 걸어갔다.
“철방아, 널 겨누는 칼끝이 있다. 조심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