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돌프 K. 골트슈미트 옌트너 지음/ 달과소 펴냄/ 416쪽/ 1만7000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를 경쟁관계의 인물 구도로 해석해 눈길을 끄는 책이 루돌프 K. 골트슈미트 옌트너의 ‘대결로 보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어릴 적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 난에 한 번 정도 썼을 법한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알려준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위인들이 아닌 다음에야 살면서 비교되는 인물이라고 해봤자 요즘 유행하는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들에게는 숙명적인 상대가 있었고,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라이벌 구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적이 이해되기도 한다.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또는 누군가의 추격을 받으며 살았다는 전제하에서 그가 해왔던 연구를 담은 이 책은 그래서 역사적 사건보다는 그 속에 존재했던 천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사를 돌이켜봤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언제나 결정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저자가 연구했던 천재성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라는 제목이 붙은 1부에서는 로마를 최대 강국으로 올려놓았던 카이사르와 그를 암살한 브루투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한다. ‘최상의 죽음은 불의의 죽음이다’라는 한 문장이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문학에서는 “마지막에 배신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편이 낫다”라는 문장으로 괴테와 실러, 횔덜린 세 사람의 구도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역사 속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재미있게 다가오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라이벌 구도라는 페이소스를 첨가, 다르게 해석해보는 즐거움도 크다.
예컨대 서방 문화를 유서 깊은 동방 문화와 통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자 했던 황제 카이사르의 풀리지 않는 죽음에 관해서는 원로원의 연루 여부, 아내의 불길한 꿈,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유언 “브루투스, 너마저…”의 진실을 쫓아가볼 수 있다.
그리고 ‘천지창조’ ‘모나리자’ 등의 작가로 희대의 천재라고 불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으로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미켈란 젤로가 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은 알아도 서로 경쟁하며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왕권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군림했던 시기, 권력 대결에서 라이벌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교황과 황제의 대립을 다룬 장도 흥미롭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잘 알려진 교황 그레고리우스와 황제 하인리히가 주인공인 이 장은 황제가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로 사흘 동안 카노사 성문 앞에서 교황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역사 속으로 초대한다.
왕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신의 대리자라는 더 막강한 교황 앞에서 겪어야 했던 왕의 굴욕은 이후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을 발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 배신자와 나약함의 표본으로 알고 있는 예수의 마지막 제자, 유다와 인간 예수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다.
유다는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 중 가장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예수를 배신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 왜곡 아닌 왜곡을 받았다고 저자는 표현하는데 이런 평가는 사실상 새로운 것도 아니다. 역사뿐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이 둘이 독대하는 장은 여간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라면 싸움의 승자, 그러니까 역사가 늘 조명했던 1인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2인자 혹은 역사적 오해 속에 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들의 처지에서 사건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한편으로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말을 했다면 하는 가정을 해봄으로써 가상의 역사를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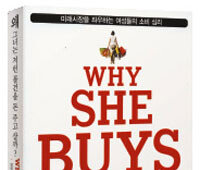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