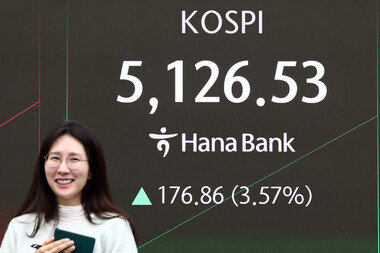30대 이하라면 첫 데이트나 첫사랑의 추억이 다방이나 카페가 아닌 ‘커피전문점’의 ‘원두커피’에 녹아들었을지 모르겠다. 1990년대 초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커피전문점은 커피가 원두를 우려내 마시는 투명하고 은은한 빛깔의 차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우쳐줬다. 커피 종류는 맥심과 맥스웰이 아니라, 헤이즐넛과 블루 마운틴 등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1990년대 커피전문점이었다.
2000년대 들어 커피를 둘러싼 풍경이 다시 한 번 바뀌었다. 원두커피라는 말보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페라테’ 같은 단어를 훨씬 자주 들었다.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다국적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커피가 티 테이블 앞에 우아하게 앉아 고풍스러운 찻잔을 받침에 올려놓고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테이크아웃’용 종이컵에 담아 거리에서 즐기는 마실 거리라는 새로운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사람들은 ‘스몰’ ‘톨’ ‘레귤러’ ‘라지’ ‘그란데’ 등의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식당에서 파는 라면 한 그릇보다 2∼3배 비싼 가격 때문에 ‘된장녀’ 논란을 낳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는 가압 추출 방식의 에스프레소 대신 핸드 드립 커피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커피가 만들어내는 풍경과 문화적 의미는 참 많이도 변했다.
그럼 100여 년 전, 조선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 영화 ‘가비’는 조선 최초의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고종을 역사와 허구 사이의 열린 상상력 공간으로 불러냈다. 실제 문헌으로 확인된 사실(史實)은 이렇다. 고종이 명성왕후 시해 사건 이후 일본과 친일파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1896년 아관파천), 그곳에서 처음 커피를 접했다. 1년 동안 커피를 마시며 커피 애호가가 된 고종은 덕수궁에 돌아온 뒤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정관헌’을 지어 다과와 함께 커피를 즐겼다. 또 아관파천을 주도한 러시아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독일계 여성 안토니에트 존타크(한국명 손탁)가 고종으로부터 한옥 한 채를 내려 받아 호텔로 운영했으며, 그곳에 있던 정동구락부는 한국 최초의 다방으로 기록됐다. 고종은 커피 때문에 독살될 뻔했다는 소문도 기록으로 전해진다.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통역관으로 세도를 누린 김홍륙이 고종 환궁 후 친러파의 몰락과 함께 관직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타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인물을 더하고 상상력을 보탠 소설이 김탁환의 ‘노서아 가비’이며, 이를 영화화한 작품이 ‘가비’다. ‘가비’는 커피를 음차한 한자어로, 가배라고도 한다. 커피가 전래된 초창기에는 서양의 탕국이라는 뜻으로 ‘양탕국’이라고도 불렀다.
고종(박희순 분)과 함께 영화의 주인공이 된 일리치(주진모 분)와 따냐(김소연 분)는 가상의 인물이다. 따냐는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며 활동한 역관의 딸로, 열강이 각축을 벌이고 조정에서 암투와 음모가 끊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한을 고스란히 간직한 따냐에게 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리치는 따냐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약탕기에 커피를 끓여 바치곤 했다. “내 딸을 지켜달라”는 주인의 유언을 듣고 따냐에게 평생 사랑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러시아를 떠돌며 사기와 절도, 강도 등으로 살아가던 일리치와 따냐에게 어느 날 일본을 등에 업은 조선계 일본인 사다코(유선 분)의 마수가 뻗친다. 사다코의 음모로 따냐와 일리치는 조선으로 들어오고, 바리스타로 위장한 따냐는 타고난 미모와 능통한 러시아어 덕에 러시아 공사, 친러 세력의 눈에 들어 고종 곁에서 커피를 내리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일본군 장교복을 입은 일리치는 따냐를 비밀 첩보망으로 이용해 일본의 대(對)러 정보활동과 대조선 전략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다. 따냐는 러시아와 일본의 이중첩자가 된 셈이다.
“가비의 쓴맛이 오히려 달다”

따냐에 대한 사랑이 생의 전부인 일리치에게 커피는 독하다. 일리치의 순정과 고종에 대한 연모의 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따냐에게 커피는 마약보다 더한 각성과 환각, 고통과 희열의 음료다. 고종에겐 고독과 자괴감, 부끄러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국의 꿈’을 꾸게 하는 치욕과 야심의 혼합물이 바로 커피다. 고종이 따냐에게 말한다. “나는 가비의 쓴맛이 좋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맛이 났다. 한데 가비의 쓴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구나.”
‘접속’ ‘텔 미 썸딩’ ‘황진이’를 만든 장윤현 감독이 따냐의 멜로드라마에 고종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고종의 애국·애민주의적 풍모를 더했다.
러시아 공사관 내 커피실이나 고종의 집무실, 벌판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등 당시 시대적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과 등장인물의 성격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의상은 큰 볼거리다. 액션과 로맨스, 첩보스릴러를 잘 섞어놓은 연출 솜씨나 파격적이지 않고 친절한 스토리 전개는 장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 방’이 부족한 편이다. 극 구성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에로티시즘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결핍된 점이 아쉽다. 분명한 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커피가 무척 마시고 싶어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