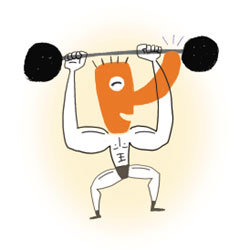
물론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지만 이런 줄거리에 얼굴 붉히며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는 이미 이 땅에 없다. 만약 있다면 ‘구린내 나는 세대’라는 비난을 받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 성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 TV의 한 공익광고를 보고서였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라는 광고가 버젓이, 그것도 ‘공익광고’라는 이름을 걸고 전파를 타는 것. 예전에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하던 콘돔을 공익방송에서 대놓고 ‘콘돔을 사용하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다. 얼마 전 유행처럼 번지던 여자 연예인들의 누드집 열풍만 해도 그렇다. 이제는 벗는 것을 수치로 인식하기보다 자연적 아름다움이나 자기과시 욕구에서 나오는 심리 현상으로 해석하는 세상이 됐다. 그뿐인가? 마이너리티의 성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던 트랜스젠더(성전환)나 게이들의 커밍아웃, 이제는 당당히 제3의 성으로 자리잡으며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소외된 자들의 성이나 여성의 몸, 성을 상징하는 도구들이 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 땅의 남성들만 자신의 몸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성 능력의 감퇴가 무슨 큰 죄라도 되는 듯 쉬쉬하며 혼자 고민하는 중년이 늘고 있는 것. 그들은 병원에 가면 금세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병원 가기가 부끄러워 성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산다. 그러다 결국 결혼생활의 파국을 맞거나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기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젊은 시절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돈도, 친구도, 가족도, 시간도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참살이(웰빙)를 외치면서도 비뇨기과에 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한국 남성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한국 남성들이여! 자신의 성 건강은 자신이 지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