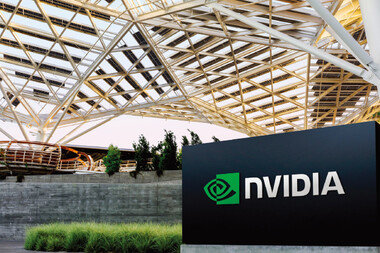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의대생이 여기엔 왜 왔어요? 미친 거 아냐?(웃음)”
‘주간동아’의 문을 처음 두드렸던 바로 그날, 한 선배가 대뜸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도서관의 책 냄새, 병원에 진동하는 소독약 냄새가 살짝 지겨워졌거든요. 사실 학생 때 아니면 언제 미친 척하고 이런 짓 해보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의학도가 겁도 없이 기자의 세계에 뛰어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들을 도와 어설프게나마 기사도 다뤘고,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를 기웃거려도 봤습니다. 요즘처럼 국내외 소식을 두루 꿴 적도 없네요.
의학 기사만은 쓰지 않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푹 빠져 살기에도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더군요. 되돌아보니 제가 만났던 사람, 썼던 기사가 모두 제 영역의 이야기뿐이네요.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만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노라 변명해봅니다.
그중에서도 나영이(가명) 수술 집도의인 한석주 교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분이 수술실에서는 호랑이 저리 가라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리는 터라 수술 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수술이 끝나면 모두가 녹초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인터뷰를 앞두고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기자로서 만나니 이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실 땐 저까지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의 수술을 거부해 아동복지센터에 신고까지 해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말씀도 귓가에 맴돕니다.
 살짝 맛만 보다 끝난 기자와 풋내기 의학도로서 펜과 칼을 잡아본 소감을 말하자면 솔직히 무엇이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의 손에 쥐어진 펜이나 의사가 잡은 메스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마감에 여념 없는 선배 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저는 메스를 잡아야 할 위치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맛만 보다 끝난 기자와 풋내기 의학도로서 펜과 칼을 잡아본 소감을 말하자면 솔직히 무엇이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의 손에 쥐어진 펜이나 의사가 잡은 메스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마감에 여념 없는 선배 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저는 메스를 잡아야 할 위치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동아’의 문을 처음 두드렸던 바로 그날, 한 선배가 대뜸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도서관의 책 냄새, 병원에 진동하는 소독약 냄새가 살짝 지겨워졌거든요. 사실 학생 때 아니면 언제 미친 척하고 이런 짓 해보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의학도가 겁도 없이 기자의 세계에 뛰어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들을 도와 어설프게나마 기사도 다뤘고,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를 기웃거려도 봤습니다. 요즘처럼 국내외 소식을 두루 꿴 적도 없네요.
의학 기사만은 쓰지 않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푹 빠져 살기에도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더군요. 되돌아보니 제가 만났던 사람, 썼던 기사가 모두 제 영역의 이야기뿐이네요.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만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노라 변명해봅니다.
그중에서도 나영이(가명) 수술 집도의인 한석주 교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분이 수술실에서는 호랑이 저리 가라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리는 터라 수술 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수술이 끝나면 모두가 녹초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인터뷰를 앞두고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기자로서 만나니 이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실 땐 저까지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의 수술을 거부해 아동복지센터에 신고까지 해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말씀도 귓가에 맴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