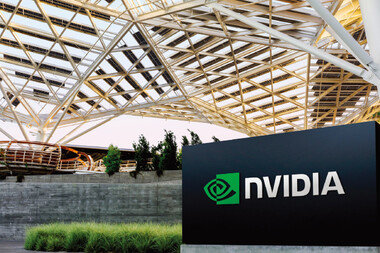올 봄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을 졸업한 치아키씨(22·가명). 대학 3학년 때 일곱 살 위인 남편을 만난 뒤 피임을 하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낳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다. 남편 역시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방치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취직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 내 손으로 어느 정도 키워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치아키씨는 작년 8월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졸업논문을 쓸 때는 두 손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서 한쪽발로 아기 그네를 흔들고 4시간마다 젖을 물렸다. 임신 7개월 때는 교생실습을 나가 교단에도 섰다. 3월 졸업식 때 그의 오른손에는 졸업증서, 왼손에는 7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내과의사인 호시 사치코씨(31)는 대학 4학년, 불과 21세에 엄마가 됐다.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맞벌이 주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공립보육원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3년 동안 무인가보육원에 맡겼다. 수련의 시절 3년 동안은 시댁에서 살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강의, 시험, 병원실습, 의사국가시험으로 이어지는 바쁜 학창시절에 육아문제로 악전고투했다.
아이가 있는데도 병원에서 연수를 받아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출신대학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이미 육아가 끝나 의사로서의 일도 안정됐다.
요코하마국립대 경영학부 3학년인 대학생 부부 마쓰우라 후미노리씨(22)와 아내 미에씨(22). 두 사람은 1학년 때 만나 사귄 지 얼마 안돼 아기가 생겼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의사가 “벌써 아기에게 심장이 생긴 것 같다”며 내미는 태아사진을 보고 낙태를 단념했다. 이들은 부모를 설득해 그 해 말 결혼했다.
이들은 곧 첫돌을 맞는 아들을 데리고 함께 수업을 듣는다. 얼마 전부터 보육원에 보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보육원생활에 익숙지 않아 오전에만 맡기고 오후에는 두 사람 중 한사람이 데려온다. 서로 수업시간이 다를 때는 수업을 듣지 않는 쪽이 아기를 돌본다.
이와 같은 학생엄마는 더 이상 일본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명문사립대 게이오대학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엄마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 ‘마마자마루’라는 한 육아정보잡지에는 학생엄마들이 육아의 고충을 털어놓는 투고가 잇따르고 도쿄의 육아관련 연구소인 ‘마더링연구소’에도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이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아직 어린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면서…”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일찌감치 아기를 낳는 학생엄마를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마더링연구소’의 다케나가 가즈코 소장은 이에 대해 “대학시절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아기를 기르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생엄마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일본의 유행을 쉽게 받아들이는 한국이지만 ‘학생엄마’ 문화까지 수입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