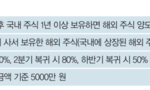자필유언장에 주소를 직접 번지까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자필유언증서에 주소를 동까지만 적은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이성동복(부친이 다르고 모친이 같음) 남매로, 이들의 모친 C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아들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자서한 뒤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고 2008년 사망했다. 이에 대해 원심(2심)은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나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다”며 “유언장 작성 당시 C씨가 고령인 데다 주된 생활 근거지는 A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유언장은 주소 자서가 누락돼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월 6일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생략) ·#51931;·#51931;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고, 각 유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지번이 유언장 전문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직접 주소를 써넣지 않았다면 설령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해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2다29564).
자필유언증서는 유언자가 주소를 제대로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많다. 하급심에서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자서하지 않았다 해도 유언 내용 가운데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경우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명확하게 자서하지 않은 경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해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