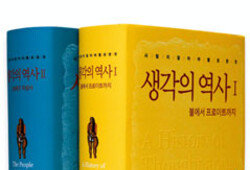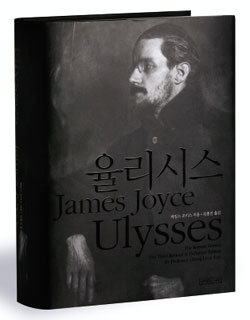
독서를 통한 공부의 불완전성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사람이라도 글이 담고 있는 원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독서는 결국 변방을 맴도는 데 그친다. 물론 저자뿐 아니라 독자의 언어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좋은 독서는 훌륭한 저자와 좋은 독자가 만나는 지적 교류이기 때문이다.
정독은 바로 이 과정에 개입한다. 즉, 정독은 저자의 뜻을 깊이 숙고하고 사색하며 저자가 던진 사유를 내 것으로 재해석하고 흡수하는 행위다. 저자의 뜻을 곡해하거나, 독자의 편견으로 저자의 사상을 제대로 관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독이 아니다. 정독이란 숙독과 달리 깊은 사색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려는 본뜻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독은 길이고, 숙독은 걸음이며, 간독은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간독, 숙독, 정독의 3요소를 두루 필요로 하는 책이 최고의 양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3요소가 아우러지는 최고의 고전은 어떤 것일까. 최소한 영미문학에선 단연 한 사람을 꼽는다. 바로 제임스 조이스다. 그는 오늘의 영미문학을 있게 한 작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특히 그의 대표작 ‘율리시스’(김종건 옮김/ 생각의 나무 펴냄)는 하나의 문학작품이 시대를 넘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역력히 보여준다.
한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제임스 조이스란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율리시스’를 거론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이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 적다는 것. 이는 바로 작품의 가독성 때문이다. ‘율리시스’는 세 사람의 주인공에게 단 하루 동안 일어난 16개의 에피소드를 그린 소설로, 서사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은 아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독자는 그의 작품에서 그렇게 빼어나다는 언어유희를 느낄 수도 없는데, 이는 번역의 문제다. 조이스의 작품에서 어휘와 문장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독자는 혀가 마비된 미식가에 비견된다. 그 점에서 필자 역시 조이스의 작품은 거대한 벽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김종건 교수가 20년간의 노력 끝에 ‘율리시스’를 재역한 것이다. 무려 3만개의 어휘에서 나온 2만5000여 개의 단어와 신조어, 다층적 의미를 가진 문장의 중의성을 살리면서 그에 가장 근접한 우리말 단어를 골라 병치하는 일은 실로 엄청난 노고가 필요함에도 이번에 그 일을 해낸 것이다.

박경철<br> 의사
http//blog.naver.com/donodo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