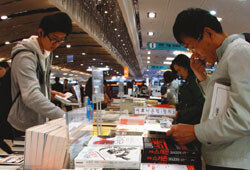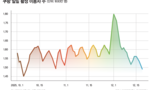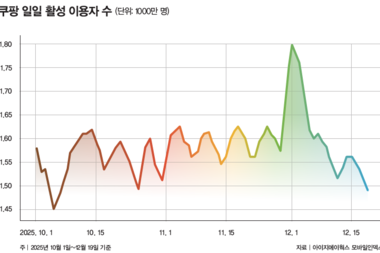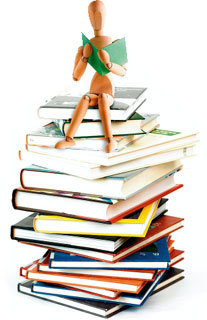
문학상은 검색을 통해 확인된 것만 400여 개다. 그 가운데 대체로 작고한 문인을 기리는, 유명 문인 이름을 단 문학상이 가장 권위를 갖는다. 이 중 ㄱ항목만 살펴봐도 가람(이병기), 고정희, 구상, 김동인, 공초(오상순), 곽재우, 교산(허균), 김달진, 김동리, 김만중, 김삿갓, 김수영, 김영일, 김유정, 김장생, 김환태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문학상을 제정하다 보니 이름깨나 날린 그 지역 문인의 이름을 건 문학상은 거의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을 건 문학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유언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문학상은 크게 기성 문인을 평가하는 것과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성 문인의 작품에 주는 상은 ‘문단’이라는 기형적인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언론이 주관하는 상은 권언유착의 폐해가 자주 거론된다.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한 상은 주로 출판 자본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비평 권력이든, 출판 권력이든 권력의 눈에 들어야 문학상 하나는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문학상’이나 ‘현대문학상’처럼 발표와 동시에 수상 작품집을 펴내는 경우와 신인에게 주는 상은 책 판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작품성보다 상업성을 더 고려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상업성에 치우치다 보니 고액 상금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이 범람함에 따라 고액 상금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1억 원의 상금을 내건 문학상도 단명하곤 한다.
신인문학상이 등단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다 보니 통과의 ‘법칙’이나 ‘공식’을 잘 가르쳐주는 몇몇 문예창작학과나 국문과가 인기를 누린다. 그 학과의 교수들이 등단 제도의 심사위원을 자주 맡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등단 문학작품에서 새로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통탄이 터져 나온다.
신춘문예나 계간지 공모, 장편 공모 등에서 약 15년에 걸쳐 30~40번은 떨어졌다가 한 청소년문학상에 당선된 작가는 “최종심까지 간 것도 많았지만 대체로 ‘상상력은 좋으나 철학이나 미학적 인식 부족, 상상 요소가 강할수록 철학적 깊이가 요구됨’ 등의 심사평과 함께 탈락했다. 판을 접으려다가 워낙에 ‘능력자’ 가 많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순문학보다 아직 토대가 불충분하고 동화작가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문학(분야)에서는 내가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공식 소감을 밝혔다.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준 이 작가의 장편소설이 시장에서 즉각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1958년 출생.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학교도서관저널’ ‘기획회의’ 등 발행. 저서 ‘출판마케팅 입문’ ‘열정시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베스트셀러 30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