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을 넘어섰다. 서민 주거인 연립주택 매매가도 2억6000만 원이 넘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상위 10%의 경계점은 2억2000만 원이다. 전체 가구의 90%가 서울에 연립주택 한 채 살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면에서는 어떨까. 한국에서 연소득 상위 10%의 경계점은 3인 가족 기준 세전 연 8200만 원, 월 가구 소득 기준 682만 원이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가 2.7명이기 때문이다. 4인 가족으로 기준을 바꾸면 연소득 상위 10%의 경계점은 연 9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어떤 기준이든 수도권에 (설령 대출이 있더라도)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연 8000만~9000만 원 이상 가구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상위 10%에 든다.
아무 데나 붙는 ‘서민’ ‘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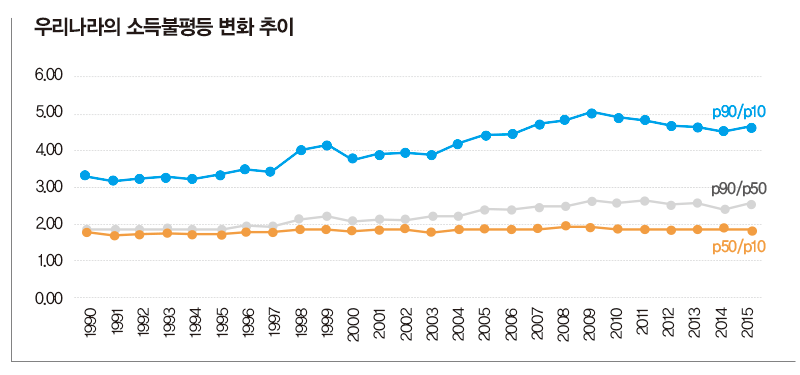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민’ 또는 ‘빈민(푸어)’이라는 말이 종종 엉뚱한 데 붙는다. 주택을 소유하고 소득도 적잖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가구를 일컬어 ‘하우스 푸어’라고 한다.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고 소득도 높지만 재벌이 아닌 사람을 일컬어 ‘강남서민’, 자녀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느라 저축을 못 하면 ‘에듀푸어’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많은 (중)상층이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상대적 고소득층 가운데 자신을 빈곤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소득이 중간 정도인 중산층의 80%가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인식했다. 재벌을 비롯한 극소수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왜 한국의 소득 (중)상층은 자신의 객관적 처지와는 다르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 (중)상층 소득이 최상층과는 격차가 크고, 하층과 격차는 작은 것일까. 이를 판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 비율을 구해 비교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평균 소득보다 10.1배 많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로 20.6배이고, 그다음은 미국(18.5배)이다. 한국은 31개 회원국 중 13위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런데 상위 10%의 평균 소득에는 재벌 같은 최상층 소득도 포함돼 있다. 소득 상위 10%에 턱걸이하는 (중)상층 처지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상위 10% 중에서도 최상위 1%와 그다음 9%는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연봉은 2014년 기준으로 1억3500만 원이 넘지만, 상위 10%는 670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산 기준 상위 10%의 경계점은 2억2000만 원이지만, 자산 상위 1%의 경계점은 9억9000만 원이다. 상위 1%와 10%의 격차가 4.4배다.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있다.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아닌, 상위 10%의 경계점(P90)과 하위 10%의 경계점(P10) 소득의 비율(P90/P10)을 구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P90/P10은 4.7로 31개 회원국 중 11번째로 높다. 상위 10%의 경계점에 있는 (중)상층 소득이 하위 10%의 경계점에 있는 빈곤층 소득보다 4.7배 많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상위 10%의 평균 소득과 하위 10%의 평균 소득을 비교했을 때보다, 상·하위 10%의 경계점 소득을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 대비 불평등 정도가 더 높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상위 1%와 상위 10%의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더 큰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이 방식으로 P90/P50, P50/P10을 계산해보면 어떨까. P90/P50은 소득 (중)상층과 중간층의 격차를, P50/P10은 소득 중간층과 하층의 격차를 보여준다. 한국의 P50/P10은 2.6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미국이 2.7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덴마크는 1.7밖에 안 된다. 덴마크에서는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의 연봉이 소득 중간층의 59%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8%에 불과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하층의 수입이 중간층보다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는 셈이다.
소득 하층과 중간층 격차 지속 증가
반면 P90/P50은 1.8로 OECD가 통계를 제공하는 31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한국과 비슷하다. P90/P50이 낮다는 것은 상위 10%와 중간층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중)상층이 자신을 서민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 있을 것이다. 상위 10%에서 중간 5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상위 10%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계층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간 50%에 비해 특출하게 부유한 것은 아니다. 반면 상위 1% 그룹은 저 멀리 있다.‘그래프’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비 변화를 보여준다. 90년대 초반에는 상위 10%의 벌이가 하위 10%에 비해 3배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에는 그 격차가 5배 넘게 벌어졌다. 지금은 2009년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상태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90년대 초반 이후 시작된 불평등 증가를 이끈 것은 상위 10%와 중간층의 격차 확대가 아니라, 중간층과 하위층의 격차 확대였다. 2009년 이후 다소 완화되기 전까지 하위층과 중간층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처럼 하위 50% 내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OECD 회원국과 구별되는 한국의 특징이다. 올해 초 타계한 앤서니 앳킨슨 전 런던정경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P50/P10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P90/P50은 커졌다. 미국의 소득불평등 증가는 상위 50% 내에서의 격차 확대인 셈이다.
어느 국가나 소득 (중)상층은 여론주도층이다. 그런데 한국의 (중)상층과 소득불평등 증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빈곤층은 아마 일상에서 서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빈곤층의 현실을 접하기 어려운 (중)상층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건 상위 1%와 상위 10% 사이 격차일 테다. 그러니 이들이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 입안자는 소득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증가 원인이 다르다면 대책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
![[영상] 폰을 ‘두 번’ 펼치니 ‘태블릿’이 됐습니다](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48/a9/23/6948a9231242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