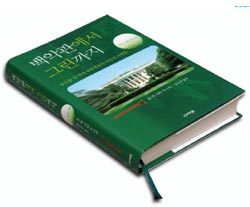
그런데 대통령 골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모양이다. 미국 대통령들 중에도 골프장에서 특권의식을 발휘하는 이들이 많았다. 멀리건(아마추어들이 곧잘 하는 악명 높은 반복 샷으로 미국골프연맹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을 밥 먹듯이 하는 등 골프 규칙을 무시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이젠하워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공을 슬쩍 치기 좋은 자리로 옮겨놓곤 했다. 케네디는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 별별 얘기를 다 했다. 소아마비에 걸려 골프를 못하게 되기 전까지 루스벨트는 때때로 한 라운드에서 멀리건을 세 개나 쓰기도 했다. 포드는 공이 홀 근처에 6피트 정도 ‘가깝게 붙어’ 있을 때면 “각하, 그 정도는 그냥 집으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공을 집어 들었다.
그래도 위 네 명의 대통령은 골프를 즐긴 역대 미국 대통령 14명 가운데 ‘순수파’에 속한다. 클린턴은 자신의 최고기록이 79타라고 자랑했지만 수백만명의 미국 골퍼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다. 그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멀리건을 남발해 ‘빌리건’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르윈스키 사건 때 대배심 앞에서 숱한 사실을 왜곡했던 클린턴 아닌가. 그도 할 말은 있다.
“음, 내가 첫 티에서 두세 번 샷을 한 이유는 야외 연습장에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네.”
바닥깔개의 먼지를 터는 듯한 스윙폼으로 유난히 골프에 애착을 보였던 닉슨은 끊임없이 속임수를 썼고, 규칙을 어겼다. 수시로 공을 치기 좋은 위치로 옮기고 티샷도 만족스러울 때까지 쳤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대통령 골프의 선구자’였다. 몸무게가 160kg이나 되는 거구에 스윙도 어설펐지만 그는 수시로 골프장을 찾아 시사만화의 단골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골프에 지나치게 빠진 대통령이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골프를 ‘스토킹’했다. 그럴수록 본연의 골프는 그들에게서 멀리 달아났지만 그들은 특권을 이용해 골프에 매달렸다. 숨막히는 중압감이 짓누르는 백악관을 탈출해 푸른 잔디 위에서 축복받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퓰리처상을 세 차례나 받은 돈 반 나타 주니어는 미국 대통령들과 골프의 함수관계에 주목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중적인 골프 이야기인 ‘백악관에서 그린까지’다. 왜 하필 대통령들의 골프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저자는 코미디언 보브 호프의 말을 빌린다.
“대통령이 샌드 트랩에서 보이는 행동은 긴급한 국정 사안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뒤지고 역대 대통령들과 그들의 골프 파트너, 측근들을 인터뷰했다. 클린턴과는 라운드까지 함께 했으면서도 가장 신랄하게 해부한다. 활달한 문체에 실린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골프를 잘 모르는 이도 낄낄거리며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는 골프를 통해 베일에 가려졌던 정치세계를 펼쳐보이는 데 성공했다.
흔히 골프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매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 중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골프는 명예와 신뢰를 존중한다. 그래서 골프는 골퍼들의 모습을 비추는 냉정한 거울이며 인내를 측정하는 기구다.
흔히 대통령을 잘 이해하려면 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혹은 성장배경과 지역기반을 살펴봐야 한다고들 한다. 그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골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
한 세기 전 루스벨트는 “골프는 위험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골프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 정치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당시 골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 골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아한 스윙을 했던 케네디조차도 국민의 눈을 의식해 자신이 골프를 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조지 W 부시는 지난해 여름휴가 중 골프 셔츠를 입고 TV에 나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우리 사회도 골프에 대해 좀더 너그러워졌다. 박세리 등 낭자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 우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예찬하며 산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대통령들의 이면사를 다룬 책도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돈 반 나타 주니어 지음/ 정승구 옮김/ 아카넷 펴냄/ 472쪽/ 1만8000원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