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에 얽힌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블루룸’의 장면들.
‘블루룸’은 아말릭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벨기에 출신 추리소설 거장 조르주 심농의 동명 원작을 각색했다. ‘예술에 대한 예술’로 자못 난해한 형식을 갖고 있던 데뷔작에 비해 ‘블루룸’은 익숙한 영화 형식인 스릴러 장르를 이용했다. 말하자면 전작보다 대중성을 더욱 고려했다. 그런데 막상 영화가 전개되면 스릴러에 기대되는 관습이 조금씩 위반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프랑스 파리 근교 전원도시가 배경이다. 농기구 판매회사 대표인 줄리앙(마티외 아말릭 분)은 성공한 사업가답게 모던한 저택에서 금발 부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에겐 10대 때 동창이던 에스터(스테파니 클레우 분)라는 애인이 있다. 이들은 푸른색으로 장식된 호텔방에서 각자 배우자를 속이며 비밀 만남을 이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는 줄리앙을 만난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영화는 ‘그 사건’의 정체를 찾아가는 줄리앙의 긴 회상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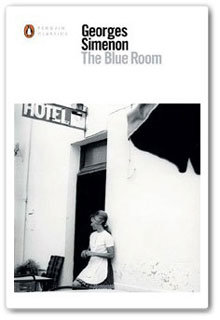
추리소설 작가 조르주 심농의 ‘블루룸’ 표지.
보통의 추리물은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처럼 ‘누가’에 초점을 맞춘다. 범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런데 심농은 ‘누가’보다 ‘무엇’을 더 강조한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동시에 그 ‘무엇’을 미궁으로 빠뜨리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게 심농의 장기다. ‘블루룸’의 전환점은 줄리앙의 아내가 독살된 채 발견되면서부터다. 약사인 에스터가 살인혐의자로, 줄리앙은 공범으로 체포된다.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다. 그런데 줄리앙은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단 하나의 회상도 제시하지 않는다. 곧 에스터만 범인인데,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줄리앙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 같다.
심농의 소설처럼 영화 ‘블루룸’도 의도적으로 이 ‘억울함’을 시원하게 밝히지 않는다. 줄리앙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질문으로 남긴다. 순진한 줄리앙은 살인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회상 장면도 없다. 하지만 윤리적 질문은 남는다. 아내의 죽음이 줄리앙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 있다면 그는 유죄가 아닐까. 심판은 관객 몫이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