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논의했지만 ‘불통’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 반대되는 주장에는 ‘복지성장론’이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주장한 ‘중(中)부담 중(中)복지’가 대표적이다. 복지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라 복지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금을 올리고 복지의 파이를 키워 복지 대상과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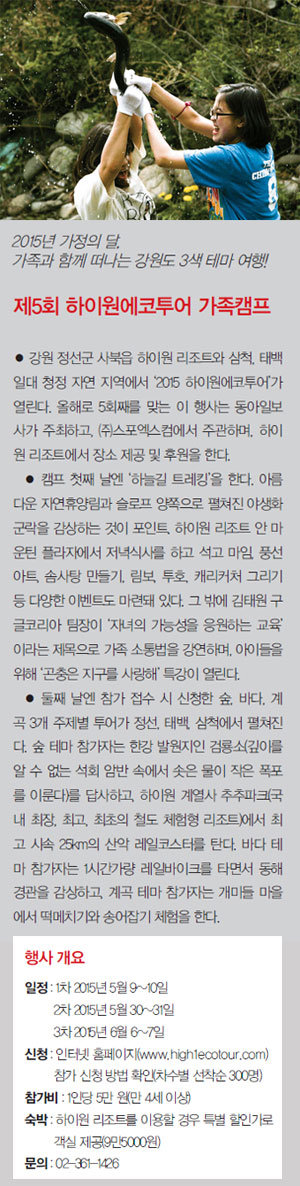
복지분배론과 복지성장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국가마다 복지 확대 역사는 다르지만, 한국의 복지 논의는 사실상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도 야당의 무상급식에 대응하는 정책이었다. 무상급식을 폐지하면 복지 논의의 동력이 상실될 공산이 크다.
반면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서 봤듯 세금을 올려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일은 자칫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복지의 확대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면, 어렵더라도 복지성장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진정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홍 지사가 이를 몰랐을까. 그가 기술 관료라면 용기 있는 주장일 수 있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비겁한 결정이었다.
무상급식 논란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택으로 대립시키는 건 쓸데없는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내용과 조건에 따라 어떤 복지(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선별적으로, 다른 어떤 복지(예를 들어 의료보험)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은 무상복지냐 아니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택일이 아니라, 복지성장론과 복지분배론 사이의 선택이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 멕시코 다음이다.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복지에 쓰고 있지만, OECD 평균은 22%다. 자유방임 경제에 가장 가깝다는 미국도 우리의 2배에 가까운 19%를 복지에 쓴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우리의 3배를 쓴다.
한국은 수전노의 나라?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은 경제가 덜 발전해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서유럽 국가의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이 우리의 경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예외 없이 지금의 한국보다 2배 이상 복지를 제공했다. 반면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에 쓰는 돈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해당한다. 남들은 우리보다 돈이 절반밖에 없을 때도 우리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다. 한국의 복지는 북유럽보다 40년, 다른 경제 선진국보다 30년 뒤져 있다.
대한민국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대한민국처럼 복지에 돈을 쓰지 않는 국가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소득 대비 복지가 그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면 한국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수전노 나라라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가 성장해야 다 같이 잘살 수 있듯, 복지의 파이를 늘려야 다 같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 중 하나가 정(情)이다. 정 많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복지분배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지성장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