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활동가이자 에세이스트로 유명한 한비야. 적극성과 역마살과 긍정의 상징인 그는 58년생에 대한 애착을 최근 발표한 에세이집 서두에 이렇게 밝혔다. ‘58년 개띠’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문인도 있다. 서정홍 시인은 ‘58년 개띠’라는 시집을 통해 노동자로 지내온 지난한 세월을 노래했다.
서울 하늘을 최루가스가 뒤덮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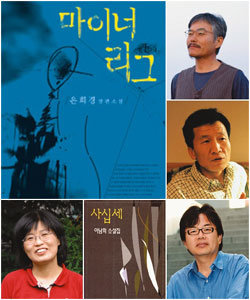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58년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힘들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지만(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 58년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육제도가 변한 측면은 있죠. 저 자신이 58년생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쓴 작품은 글쎄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글의 서두 정도인 것 같네요.”
박상우 소설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창조적인 예술가에게는 개성이 소속감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황인숙 시인은 “동년배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그때 나는 아무것도 전혀 몰랐고, 흘깃 알았더라도 무의미했다. 지금은 어떤가? 거의 변함이 없다. (중략) 그렇지만, 나는 나다! 그 시절, 그토록이나 나를 버팅겨 주었던 구르몽의 기도문을 거듭 뇌인다. ‘나의 조국은 단 하나, 그것은 예술이다. 나의 신앙은 단 하나, 그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산문집 ‘육체는 슬퍼라’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58년 개띠라는 소속감을 전혀 발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터. 58년 개띠 문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 세대의 아픔을 노래해왔다. 서홍관 시인은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넥타이 부대’로 거리에 나서 민주화를 주창한 58년 개띠들의 애환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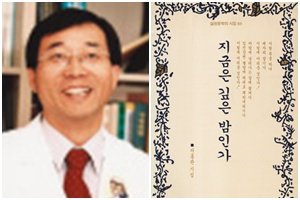
황인숙 시인은 “한순간에 프락치로 몰려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무서운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사회적으로 눈뜰 여유가 없던 그가 죽은 후배를 생각하며 ‘1987년 여름’이란 시를 쓴 것도 그래서다.
58년 개띠의 상징인물인 박지만 씨의 불행한 개인사에 감정이입을 한 작가도 있다. 이재무 시인은 “박지만의 실존에 대해서 돌팔매를 던졌지만, 시간이 흘러 불행한 개인사를 경험하다 보니 일탈에 대한 유혹을 느꼈다”면서 “하물며 일반인인 나도 이럴진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박지만은 그러한 욕망이 더 크지 않을까란 연민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전쟁 경험한 아버지와의 괴리감
“박지만의 흑백사진을 들여다보면/ 어디서 저녁 까치 울음소리 들려온다/ 그의 두툼한 얼굴엔 한 시대 굴욕의 역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비애가/ 담겨 있다 아궁이 속 오래 묵은 재처럼 어둡고/ 칙칙한 그의 길쭉한 얼굴엔 바닥 맨몸으로/ 기어본 자의 허무 절망 권태 고독이/ 물러터진 포도알처럼 주저리주저리 열려 있다/ 바닥에 떨어져 으깨어진 설익은 과실,/ 박지만은 우리 시대 자화상이다.”(이재무 ‘아아 박지만’ 중에서)

58년생들의 작품에는 부모 세대와의 괴리감 또한 많이 나타난다. 이남희 소설가는 “부모님들이 전쟁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와는 인식의 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의 소설 ‘사십세’에는 그 감정선이 잘 나타난다.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는 슬펐다. 1차 대전 말기에 태어나 수탈당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자랐으며 두 번의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2차 대전과 6·25 그뿐만 아니다. 8·15 광복이 있었고 좌우의 대결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로선 유일한 회고담. ‘김구 선생 장례식에선 이걸로 끝이구나 싶어서 나까지 눈물이 핑 돌았다.’ 가부장적인 남자로선 드물었던 눈물의 인정. 그리고 4·19가 있었고 5·16유신… 한 사람의 생애에 다 담아내기엔 너무나 많은 격변 아닌가? 그런데 5·16 근처에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고 박정희가 죽은 해에 대학 졸업논문을 썼던 나는 아버지 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비뚤어진 거라고 대들곤 해왔다.”(이남희 ‘사십세’ 중에서)
이러한 괴리감은 문학적 자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영채 문학평론가는 “58년생은 산업화에 돌입한 1970년대에 성장했으면서도, 전쟁을 경험한 부모와 함께 전쟁 이후의 황폐함 속에서 살며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유년시절에 대한 묘사가 탁월하다”고 해석했다.
58년생이 많은 만큼 58년생 문인도 많다. 김이구 문학평론가가 “또래 문인이 많아 58년 개띠생 문인의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며 모임을 만든(1999년) 것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승철 시인은 “내가 소속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쪽의 58년생 문인을 살펴보니 얼추 60명은 됐다. 한국문인협회 쪽 문인까지 합하니, 대략 100명에 이를 정도로 지금 한국 문단의 거대세력을 형성하는 게 58년 개띠 문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엔 ‘가짜 58년생’도 포함돼 있다. 소설가 구효서, 이순원은 사실 58년생이 아니다.
“그때는 어릴 적에 많이 죽으니까 1, 2년 있다가 출생신고하는 일이 많았어요. 58년생이 많다지만 진짜 58년생 작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죠. 58년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 저도 넓은 의미에서 58년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웃음)”(구효서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