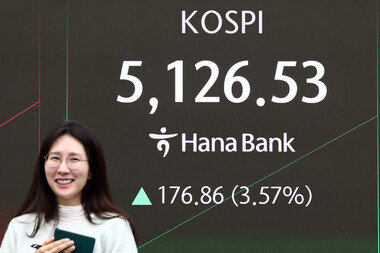고려대(왼쪽)와 연세대의 응원전은 경기보다 더 치열하다.
경기 시간은 짧지만 의전 절차는 거창하다. 학문을 잠시 뒤로하고 두 학교의 총장과 교수들, 학생이 한데 모여 진한 우정을 다진다. 출전 선수의 유니폼과 모자도 옛것 그대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대회 며칠 전부터 역대 전적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리가타 관광상품이 생기고, TV가 생중계할 정도. 경기가 끝난 뒤 두 학교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파티를 하며 젊음을 만끽한다.
농구스타의 경우 90% 이상이 연고대 출신
이를 본떠 만든 것이 하버드와 예일 대학 간의 조정경기 정기전이다. 리가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15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 스포츠 정기전도 유명하다. 10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학 축제다.
한국의 고연전(혹은 연고전)은 앞의 다른 대학들의 축제와는 거리가 있다. 리가타 등이 순수 대학생들의 경쟁이라면, 고연전은 ‘선수 학생(?)’들의 경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른 경기는 몰라도 상대 대학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꼭, 절대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선수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잡음이 인다. 우리 팀에는 오지 않더라도 라이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이다.
또한 두 학교가 저인망 식으로 우수 선수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다른 학교 스포츠부는 고사 직전에 몰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종목이 농구다. 백남정, 김영기, 김영일, 신동파, 김동광, 조승연, 신선우, 이충희, 김현준, 박수교, 이민현, 문경은, 이상민, 서장훈, 현주엽, 전희철, 김병철 등 우리나라 농구 역사에 빛나는 스타들의 90% 이상이 연세대나 고려대 출신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고려대나 연세대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 됐다. 우수 선수들이 고려대나 연세대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조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 두 대학에 진학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선수의 질을 평가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워낙 우수한 선수들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팀에서라면 충분히 주전선수로 활약하며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선수들이 후보선수로 벤치에 앉아 고함이나 질러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5년 고연전 개막일인 9월23일 열린 농구 경기(왼쪽)와 야구 경기.
이 같은 병폐는 축구,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축구대회를 끝으로 국내 출신의 월드컵 축구대표 감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두 학교의 라이벌 의식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약 연세대에서 월드컵 감독이 나오면 고려대 출신이, 반대로 고려대 출신이 월드컵 감독이 되면 연세대 출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학교 외에 다른 학교 출신이 월드컵 감독이 되면 두 대학 출신들이 힘을 합해 흔들어대기 때문에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한때 명칭 다툼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해묵은 질문이다. 사학의 쌍두마차 고려대와 연세대가 두 학교 간 체육대회 명칭을 놓고 벌인 신경전은 매우 치열했다. ‘연고전’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마당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에, 고려대는 가나다순으로 따져도 ‘고연전’이 옳은 만큼 고연전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양측의 갈등은 감정 싸움까지 곁들여져 두 학교의 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스포츠를 발전시킨다는 정기전의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두 학교는 상호 겸양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학교의 이름을 뒤에 놓는 방식으로 매년 정식 명칭을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연세대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고연전이 바른 표현이다.
두 학교 간의 최초의 스포츠 교류는 1927년 11월2일 경성운동장에서 벌어진 제8회 전 조선축구대회 준결승전이었다. 농구는 29년부터 맞붙기 시작했고, 정기전의 효시는 45년 열린 제1회 보성전문(고려대의 전신) 대 연희전문(연세대의 전신)의 OB 축구경기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서울 YMCA체육관에서 OB 농구경기가 열렸고, 46년 5월23일 현역선수끼리의 축구와 농구 대항전이 열리면서 비로소 정기전의 틀이 잡혔다. 축구와 농구 두 종목으로 시작된 정기전은 56년 야구와 럭비, 그리고 57년 아이스하키를 추가하면서 5종목의 정기전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틀 동안 5종목의 경기가 일제히 벌어지는 형태는 65년부터 자리 잡았다. 정기전은 4차례 ‘유산’됐는데 71년, 72년, 80년에는 민주화 시위, 96년에는 이른바 ‘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열리지 못했다.
두 학교의 정기전이 한국 학원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급 학교 스포츠부 육성의 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에 큰 구실을 했다. 고연전은 비단 스포츠뿐 아니라 두 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장이었고, 대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출구 구실을 해왔다.
고연전, 혹은 연고전은 두 학교 간 오기의 대결이기도 했다. 스포츠 가운데 가장 거칠고 남성답다는 럭비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사인으로 ‘노 사이드(no side)’를 선언한다.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는, 최선을 다한 인간만이 있다는 뜻이다. 두 학교 정기전은 오기를 넘어 ‘노 사이드’ 정신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