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서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과학수사를 신봉하는 서태윤 형사(김상경 분).
“현장 보존도 제대로 안 되고… 논두렁에 꿀 발라놨나?”-박두만(송강호 분)의 대사 중
수사에서 현장 보존은 기본이다. 서울 청량리경찰서 천현길 조사반장(29)은 “사건 해결의 성패는 90% 이상 현장 보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과학수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관할 파출소에서 표시해놓은 통제선 안으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살인사건의 경우 사체의 신원 파악이 최우선. 소지품으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문을 이용한다. 사체에서 채취된 지문은 AFIS(자동지문확인
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를 통해 조회가 이루어진다. 여기엔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17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의 지문이 저장돼 있다.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아 검색이나 슈퍼임포즈(두개골의 형태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를 이용하기도 한다.
현장의 발자국도 족적 채취기로 전류를 흘려 단 몇 초면 찍어낼 수 있다. 야외에선 틀에 석고를 부어 바로 족적을 떠내기도 한다. 경찰청에 구축돼 있는 족윤적 검색시스템엔 시중의 모든 신발 형태가 보관돼 있다.
거짓말탐지기 신뢰도 95% 정도

신발자국과 자동차 타이어 자국까지 석고로 떠서 수사에 활용 한다.
“목격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백만 받아내면 돼.”-서태윤(김상경 분)의 대사 중
화성사건 당시에도 자백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때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 거짓말탐지기. 그러나 경찰청 과학조사과 송호림 계장(40)은 “거짓말 탐지 결과는 수사에 참고만 할 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탐지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는 통상 95%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범죄심리과 김희송 검사관(33)은 이에 대해 “검사 전 면밀한 면담을 거치고 같은 실험을 반복해 여간해선 속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십만원밖에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 “가진 돈이 ××만원이냐?”고 계속해서 물으면 실제 가진 액수를 질문할 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 물론 대상자가 정상일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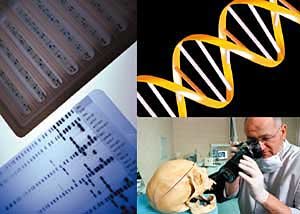
세포 DNA 배열구조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 차트. DNA 염기의 분자구조 이미지. 프랑스의 치과 전문의가 범죄와 관련, 사체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
“미국서 DNA 검사 결과만 와봐. 그땐 게임 끝이야.” -신동철 반장(송재호 분)의 대사 중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박사(40)는 “현재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데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업무량이 많아 일이 밀려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 2주면 된다는 것.
DNA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놓은 문서라고 보면 된다. 생물 객체마다 DNA 배열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에 활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DNA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령 침이나 땀은 물이 주성분이어서 그 자체로는 안 되고, 거기에 섞인 구강, 피부세포를 분석한다.
조직세포라 해도 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확률이 떨어진다. 원래 세포는 세포질이 핵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손톱이나 뿌리가 없는 머리카락은 핵이 아예 없고, 뼈는 시간이 지나면 핵 DNA가 사라진다. 핵을 분석하면 판독률은 100%에 이르지만 세포질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검사대상이면 0.1%의 오차범위가 생긴다.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모계혈족으론 동일하게 유전되기 때문. 즉 대상자의 가정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형제 자매는 물론 이모 할머니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유전자 자료은행 설립 논란 여전
DNA 검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전자 자료은행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에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살인현장에 있는 허수아비에 씌어진 경찰의 글
‘무당눈깔’ 송강호는 항상 “자, 내 눈을 보실까”라며 용의자를 노려본다. 일선 경찰이 “잠깐만 대화해도 십중팔구는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 대목.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체계를 쌓아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범죄심리학이다.
해외에선 이미 현장에서 이용될 정도로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초보 단계. 지난해부터 한국심리학회에서 범죄심리사를 다루기 시작했고 올해 경기대에 범죄심리학과 석·박사 과정이 정식으로 신설된 정도다.
서울경찰청 과학조사계 권일용 형사(39)에 따르면 범죄심리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돼왔다. 범행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는 측면과 실제 현장에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방식을 연구하는 것. 다양한 사례와 특성을 분석하고 자료화해 범죄 방식과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각광받는 최면수사도 이 분야에 포함된다. 법정 증거로서의 한계 때문에 범죄자에게 직접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목격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CJ엔터테인먼트 폭발물 협박사건’의 경우 목격자에게 최면수사를 시도, 우체국 소인이 구로우체국인 것을 밝혀내 수사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