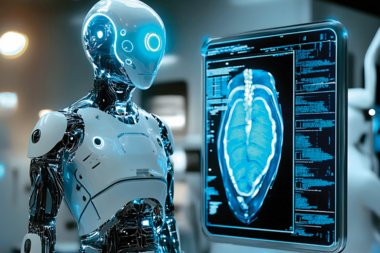더위 탓에 몸이 허해진 것일까? 점심시간에 혼자 좋아하지도 않는 삼계탕 집을 찾아가 국물을 몽땅 들이켜며 스스로를 다독거려보기도 하고, 틈날 때마다 피로회복제를 ‘원샷’해보기도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컨디션은 좀처럼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급기야 지난주엔 왼쪽 발목마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격한 운동이나 등산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발목 근처가 갑자기 끊어질 듯 아려온 것이다.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더 심했고, 앉거나 누워 있으면 그나마 참을 만했다(그러니 소변도 좌변기에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다. 흠, 그러면 기분이 좀 묘해졌다).
발목이 부은 것도, 멍이 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 덜컥 겁이 났다. 눈에 보이는 병보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법. 조심스럽게 몇 가지 병명을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도 상상해보았다. 수술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다. 수술 때문에 지연되고, 또 그래선 안 되는 약속이 여럿 떠올랐고, 그게 더 걱정됐던 것이다. 집안일만 해도 그랬다.
출산 이후 손목이 약해진 아내 혼자 사내아이 둘을 씻기고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니 남몰래 끙끙,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기며, 절뚝절뚝 한쪽 발을 절면서도 병원행을 미뤘던 것이다. 문제는 지난 토요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다. 올해 아흔이 된 아이들의 증조할머니는 1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치료를 포기(당신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하고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니까 말이다, 암이란 놈도 기력이 달려서 잘 커지지 않는대. 이놈이 임자를 잘못 만난 거지, 뭐.”
할머니는 틀니를 한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증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옛날 내 머리도 쓰다듬어주던 할머니의 손은 그러나 이제 힘줄과 뼈마디만 남은 채 야위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아픈 다리도 잊고 자주 대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내게 처음 이야기를 들려준, 처음 이야기를 가르쳐준 한 세대가 저물고 있는 것만 같아 좀 쓸쓸해졌다.
나는 그 누구에게 할머니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살았나 생각해보니, 그게 그저 담배연기처럼 모두 쉽게 사라지는 수준이었다. 이야기나 글이나 소설이나 다 그 사람이 사는 만큼 나오는 것일 텐데, 그 부분에서 나는 부끄러웠다. 부끄러운 것을 자주 속으로 감추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니 이야기가 나올 턱이 없다. 나는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말도, 통증도 속으로만 삼키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자고 가라는 할머니를 뒤로한 채 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접어든 것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아이들은 이미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아내도 아이들 틈에서 까무룩 졸고 있었다. 왼쪽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신발을 벗고 브레이크 페달 옆에 놓은 쿠션에 올려놓으니 참을 만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으며, 룸미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밤의 고속도로를 달려나갔다.
통증이 찾아온 것은 행담도휴게소를 막 지나쳤을 때다. 발등을 중심으로 종아리까지, 마치 마비된 듯 다리가 뻣뻣해져왔다. 그러곤 한쪽 입술이 부르르 떨려올 만큼 고통이 이어졌다. 비명 아닌 비명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당연한 일. 그리고 그 비명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일어나자마자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간신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냥 살짝 삔 게 아니었어?”
아내는 내 다리와 얼굴을 번갈아 살피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고 묻는 아내에게, 나는 그렇게 둘러댄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러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고….
장롱면허 소유자인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도 없었고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쩌나. 그 상태 그대로 아내가 몇 번 다리를 주물러주고, 생수를 적신 수건을 발등에 올려놓은 채 다시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여전하기에 금세 참을 만해졌다. 미련하다는 둥, 그 몸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제정신이냐는 둥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아내의 잔소리 역시 통증을 잊게 하는 데 한몫했다.
등 뒤로 땀이 흐를 때마다 나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작아진 엔진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나는 ‘건초염’이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을 진단받았다.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연세가 지긋한 반백의 의사는 “거, 꽤 아팠을 텐데…” 하며 혀를 몇 번 찼다.
“한데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그러자 의사가 슬쩍 내 인상을 살피더니 물었다.
“집에 아이가 있나요?”
“사내아이만 둘 있습니다만….”
“흠, 그놈들 때문인 거 같구먼. 안아주거나 무등을 태워주다 보면 간혹 무리가 올 수 있지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처방전을 써줬다. 한 사흘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다시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했다. 암을 암이라고 말하면서 다독거리는 할머니는, 그 암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으리라는 그런 짐작이 들었다. 그러니 다독거려줄 수밖에. 나는 다시 한 번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 그 고단함과 숭고함에 대해, 학식이나 지위 따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진정성의 깊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절뚝절뚝,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버지였다.
추신 : 딱 3개월만 쓰겠다고 한 칼럼을 두 계절 넘도록 썼습니다. 담당기자 목소리가 예뻐서 그렇게 오래 쓴 것 같습니다. 그간 읽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소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