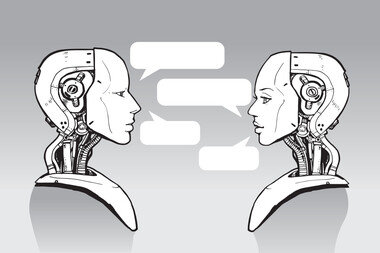유산(遺産)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후대에게 남긴 물질적인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전대(前代)의 사람들이 후대에게 남긴 가치 있는 문화나 전통이다. 사실 두 가지 모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전자의 의미만을 가슴속에 깊이 새긴 듯하다. 마치 살아가는 목적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도 되는 양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를 멈추지 않는다.
얼마 전 아내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친구가 목돈으로 수억원어치 땅을 샀다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라도 생기니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으로 씁쓸해지는 소리인지라 갑자기 내 삶을 되돌려보고 싶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전교생이 75명에 불과한 조그만 고등학교(그런데 교직원 수는 20명이나 된다)다.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이들이 오순도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익혀서인지 아무래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지도 모르겠다.
재산보다 소중한 지식과 부모의 삶 물려줘야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윗대로 올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정말로 유산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다.
‘전국기독교농민회’라는 농민조직이 있었다. 1999년 우리 학교가 탄생할 때 어떤 인연에서인지는 몰라도 4000만원이란 거금을 빌려 쓰게 됐다. 2004년 말 농민운동을 하던 이 단체가 해체를 결의하면서 농민회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그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본연의 구실에 충실했는지 궁금하다면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한참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그동안은 우리가 빌려드린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의 뜻을 받들어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의사를 밝혔다. 농민들이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학교로 되돌린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선배들의 유산을 사회로 되돌리는 결단이 너무 근사하게 느껴졌다.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일어난 KAL기 폭파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 비행기에는 강원대 화학과에 초빙교수로 부임하는 고 유정수 박사가 타고 있었다. 미국에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보상금을 기초로 건실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고인의 유업은 지난 22년간 한국의 학생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전달됐고, 어느새 우리 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위한 장학금만 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해 있다. 지금은 딸이 장학기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벌이고 있다니,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유산이 아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유산이 아닌가 싶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받은 것은 재산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해 얻은 무형의 지식이나 태도가 아닐까 싶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이 이를 보고 배운다면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불쑥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다는 아내의 신세 한탄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닌 셈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똑똑한 아들을 둔 것도 아니지만 굶어죽을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며,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는데 무슨 걱정인가. 너무 기죽을 것 없다”라고 응수했지만 아내에게서 “그건 기본 아니냐”는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다.
 “그러나 여보! 자식들 손잡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 마음이 진정 아름다운 유산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봅시다. 내일은 당신과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있어요. 예전에 다녔던 재활원이오. 여보! 진정 당신과 난 행복한 사람이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잖소.”
“그러나 여보! 자식들 손잡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 마음이 진정 아름다운 유산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봅시다. 내일은 당신과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있어요. 예전에 다녔던 재활원이오. 여보! 진정 당신과 난 행복한 사람이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잖소.”
얼마 전 아내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친구가 목돈으로 수억원어치 땅을 샀다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라도 생기니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으로 씁쓸해지는 소리인지라 갑자기 내 삶을 되돌려보고 싶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전교생이 75명에 불과한 조그만 고등학교(그런데 교직원 수는 20명이나 된다)다.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이들이 오순도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익혀서인지 아무래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지도 모르겠다.
재산보다 소중한 지식과 부모의 삶 물려줘야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윗대로 올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정말로 유산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다.
‘전국기독교농민회’라는 농민조직이 있었다. 1999년 우리 학교가 탄생할 때 어떤 인연에서인지는 몰라도 4000만원이란 거금을 빌려 쓰게 됐다. 2004년 말 농민운동을 하던 이 단체가 해체를 결의하면서 농민회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그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본연의 구실에 충실했는지 궁금하다면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한참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그동안은 우리가 빌려드린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의 뜻을 받들어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의사를 밝혔다. 농민들이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학교로 되돌린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선배들의 유산을 사회로 되돌리는 결단이 너무 근사하게 느껴졌다.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일어난 KAL기 폭파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 비행기에는 강원대 화학과에 초빙교수로 부임하는 고 유정수 박사가 타고 있었다. 미국에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보상금을 기초로 건실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고인의 유업은 지난 22년간 한국의 학생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전달됐고, 어느새 우리 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위한 장학금만 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해 있다. 지금은 딸이 장학기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벌이고 있다니,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유산이 아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유산이 아닌가 싶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받은 것은 재산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해 얻은 무형의 지식이나 태도가 아닐까 싶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이 이를 보고 배운다면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불쑥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다는 아내의 신세 한탄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닌 셈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똑똑한 아들을 둔 것도 아니지만 굶어죽을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며,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는데 무슨 걱정인가. 너무 기죽을 것 없다”라고 응수했지만 아내에게서 “그건 기본 아니냐”는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