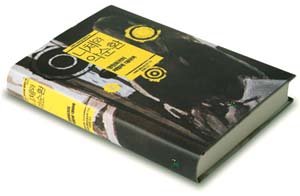
많은 사람이 청춘의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니체에 탐닉하지만 그 열기는 금세 식어버린다. 물론 이유는 ‘난해하다’는 것. 특히 니체가 병적 상태에 돌입한 이후의 저작들은 현란한 데다 지극한 메타포와 아포리즘으로 점철돼 있다.
사유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경우(혹은 환상이나 몽환적인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니체가 어렵다’는 일반인의 평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니체의 저작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독해하는 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고의 비약(flight of idea)’이 니체 저작의 전반을 관통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그의 저작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니체는 그 특유의 아포리즘을 소비하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그를 연구하는 철학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이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인지 니체를 이야기하는 이는 많지만, 니체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줄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다. 설령 만난다 해도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니체의 그것보다 난해하기 일쑤여서 니체를 제대로 읽고 싶은 독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보통 니체 혹은 니체의 저작에 대해 가장 훌륭히 안내자 노릇을 하는 레퍼런스로는 ‘하이데거의 니체’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이 꼽힌다.
거기에 만약 3대 레퍼런스로 하나를 더 꼽으라면 바로 이 책 ‘니체와 악순환’(그린비 펴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책이 갖는 위상은 하이데거나 들뢰즈의 니체에 비해 대단히 독특하다.
먼저 이 책의 저자 피에르 클로소프스키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처럼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그의 공식 직업은 소설가, 평론가, 번역가, 화가, 영화감독이며 이력 어디를 봐도 ‘철학자’는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철학을 전공한 바가 없고 가르친 적도 없으니 철학자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그는 스스로도 ‘철학자’라는 호칭을 거부했다.
프랑스인인 클로소프스키는 베르길리우스, 횔덜린, 하이데거, 니체, 벤야민, 비트겐슈타인 등의 저작들을 번역하면서 중세에서 근대철학까지 거대한 사유의 탑을 쌓아올렸다. 그뿐 아니라 나이 29세에 조르주 바타유를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고 34세에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가 스콜라주의와 신학을 공부했다.
45세에 첫 소설을 발표하고, 60세 되던 해에 갈망하던 ‘비평가상’을 받았다. 65세에 이르러선 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이후 그는 화가로서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며 명성을 쌓은 데 이어 76세 때는 ‘문학 국가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1년 96세에 사망했다.
스스로 “나는 기인이다”라고 했던 클로소프스키는 실로 수수께끼 같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천재이자 르네상스맨이었다. 그런 그가 일생 동안 천착한 주제가 바로 니체다. 니체에 열광하는 무리가 걸핏하면 인용하는 ‘사유의 높은 음조’를 해석하며, 니체가 ‘파도’에게 말한 한 구절을 빌려온다.
“그대들과 나, 우리는 같은 기원에서 생겨난 것이다. 같은 혈족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의식을 파도라고 가정하자. 밀물에 주의, 의지,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썰물에 무관심, 이완, 망각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이 밀물과 썰물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시작용은 파도의 정점에 서서 물거품만 남기고 사라지는 형상과 같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부르는 사유라는 것이 있다.”
클로소프스키는 이렇듯 카오스처럼 흩어진 니체의 문장과 사유의 조각들을 붙들어 그것을 다시 극한까지 밀어올린 다음 니체의 사유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그의 니체가 실제의 니체와 얼마나 접근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등반가가 에베레스트에 남긴 깃발은 에베레스트에 오른 자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B>박경철</B><BR> 의사
물론 ‘과연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말이다.
http://blog.naver.com/donodon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