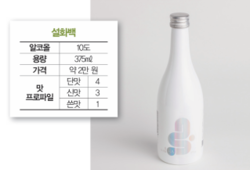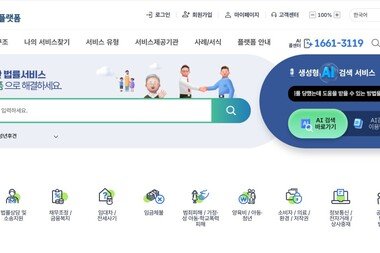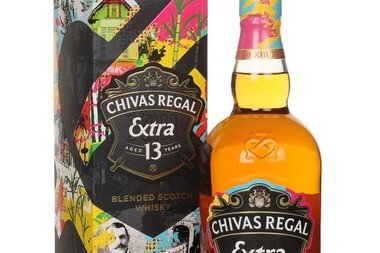“신라 술 한 잔의 취기가 새벽이슬에 사라질까 두렵구나(一盞新羅酒 凌晨恐易消·일잔신라주 능신공이소).”
고려와 조선 문인들이 입을 모아 예찬한 당나라 시인이 있다. 달제어(獺祭魚) 이상은이라는 인물이다. 화려한 수사와 섬세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그의 시는 이규보, 정철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건 이상은이 신라 술에 대해 평가한 말이 ‘지봉유설’에 위와 같이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향이 좋은 신라 술을 오래 머금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그 시대 당나라에서 신라 술이 유명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라 술은 신라시대 초기부터 역사를 함께했다. ‘삼국사기’ 중 신라 3대 유리왕 시기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은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길쌈 경쟁을 치르게 한 뒤 진 편에 술과 음식을 마련하게 했다. 이것이 한가위, 즉 추석 모태인 ‘가배(嘉俳)’의 유래다. 이 기록은 신라 초기부터 축제에 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 술은 신라시대 초기부터 역사를 함께했다. ‘삼국사기’ 중 신라 3대 유리왕 시기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은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길쌈 경쟁을 치르게 한 뒤 진 편에 술과 음식을 마련하게 했다. 이것이 한가위, 즉 추석 모태인 ‘가배(嘉俳)’의 유래다. 이 기록은 신라 초기부터 축제에 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의 술 문화는 놀이 문화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주령구(酒令具) 놀이’가 있다. 주령구는 나무나 도자기로 만든 작은 놀이 도구로 주사위처럼 생겼다. 던져서 특정 면이 나오면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 등에 주로 사용됐다. 주령구 놀이는 오늘날 술자리 게임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벌칙 중 하나로 술 세 잔을 연달아 마시는 ‘삼잔일거다(三盞一擧多)’가 있는데, 이 또한 오늘날 ‘후래삼배(後來三杯)’의 기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라는 페르시아 등과 국제 교류가 활발한 나라였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에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 이곳 석조상은 서역인 모습이다. 눈이 움푹 들어가 짙고, 그 아래로 큰 코와 두꺼운 입술, 덥수룩한 턱수염이 표현돼 있다. 머리에는 터번 같은 챙 없는 모자를 썼으며, 주먹을 불끈 쥔 팔에는 육중한 근육이 보인다. 영락없는 서역인인 것이다.
이런 국제 교류 과정에서 소주 증류 기술이 신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신라와 가까웠던 페르시아는 연금술(증류법)이 발달했고, 소주는 증류 기술을 기초로 발전한 술이다.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당나라로 기독교가 전파될 정도였으니, 증류 기술이 유입됐을 개연성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신라의 술 문화를 논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포석정(鮑石亭)’이 있다. 포석정은 작은 물길에 술잔을 띄워 놓고, 물을 따라 흘러가는 술잔이 자기 앞에 다다르면 그것을 들어 마시면서 연회를 즐기던 공간이다. 유흥의 상징인 포석정은 신라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927년 신라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백제 견훤이 침입해 왕을 붙잡은 뒤 강제로 자결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순왕이 즉위했으나 935년 고려에 항복하면서 끝내 신라 왕조는 막을 내렸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은 신라지만, 술 관련 기록을 통해 신라 술이 당나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석정이 단지 유흥을 위해 연회를 열던 곳이 아니라 제례 의식을 행하는 장소였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가위 어원이 신라 가배 풍습에서 시작됐으며, 페르시아와의 교류 사례에서 신라가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였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사라졌지만,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과거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속 신라 술은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명욱 칼럼니스트는…
주류 인문학 및 트렌드 연구가.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를 거쳐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술품’과 ‘말술남녀’가 있다. 최근 술을 통해 역사와 트렌드를 바라보는 ‘술기로운 세계사’를 출간했다.
고려와 조선 문인들이 입을 모아 예찬한 당나라 시인이 있다. 달제어(獺祭魚) 이상은이라는 인물이다. 화려한 수사와 섬세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그의 시는 이규보, 정철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건 이상은이 신라 술에 대해 평가한 말이 ‘지봉유설’에 위와 같이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향이 좋은 신라 술을 오래 머금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그 시대 당나라에서 신라 술이 유명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후래삼배 기원, 신라에 있어

1975년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신라 주령구(酒令具) 복제품.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신라의 술 문화는 놀이 문화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주령구(酒令具) 놀이’가 있다. 주령구는 나무나 도자기로 만든 작은 놀이 도구로 주사위처럼 생겼다. 던져서 특정 면이 나오면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 등에 주로 사용됐다. 주령구 놀이는 오늘날 술자리 게임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벌칙 중 하나로 술 세 잔을 연달아 마시는 ‘삼잔일거다(三盞一擧多)’가 있는데, 이 또한 오늘날 ‘후래삼배(後來三杯)’의 기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라는 페르시아 등과 국제 교류가 활발한 나라였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에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 이곳 석조상은 서역인 모습이다. 눈이 움푹 들어가 짙고, 그 아래로 큰 코와 두꺼운 입술, 덥수룩한 턱수염이 표현돼 있다. 머리에는 터번 같은 챙 없는 모자를 썼으며, 주먹을 불끈 쥔 팔에는 육중한 근육이 보인다. 영락없는 서역인인 것이다.
이런 국제 교류 과정에서 소주 증류 기술이 신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신라와 가까웠던 페르시아는 연금술(증류법)이 발달했고, 소주는 증류 기술을 기초로 발전한 술이다.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당나라로 기독교가 전파될 정도였으니, 증류 기술이 유입됐을 개연성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신라의 술 문화를 논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포석정(鮑石亭)’이 있다. 포석정은 작은 물길에 술잔을 띄워 놓고, 물을 따라 흘러가는 술잔이 자기 앞에 다다르면 그것을 들어 마시면서 연회를 즐기던 공간이다. 유흥의 상징인 포석정은 신라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927년 신라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백제 견훤이 침입해 왕을 붙잡은 뒤 강제로 자결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순왕이 즉위했으나 935년 고려에 항복하면서 끝내 신라 왕조는 막을 내렸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신라시대 연회 장소 포석정. 경주시청 제공
포석정, 제사 장소였을 수도
다만 역사적으로 다른 견해도 있다. 과거 역사 수업에서는 신라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다가 견훤에게 잡혔다고 가르치곤 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경애왕이 단순히 연회를 즐긴 것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례(祭禮)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경애왕이 제례 의식을 진행 중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백제가 신라를 친 시기는 양력 1월(음력 11월)로 한겨울이었고,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시점을 되짚어보면 경애왕은 이미 두 달 전 왕건에 구원병을 요청한 상태였다. 따라서 경애왕은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하고자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후백제의 급습을 받아 자결을 강요당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은 신라지만, 술 관련 기록을 통해 신라 술이 당나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석정이 단지 유흥을 위해 연회를 열던 곳이 아니라 제례 의식을 행하는 장소였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가위 어원이 신라 가배 풍습에서 시작됐으며, 페르시아와의 교류 사례에서 신라가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였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사라졌지만,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과거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속 신라 술은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명욱 칼럼니스트는…
주류 인문학 및 트렌드 연구가.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를 거쳐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술품’과 ‘말술남녀’가 있다. 최근 술을 통해 역사와 트렌드를 바라보는 ‘술기로운 세계사’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