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드럽고 고소하며 입안에서 스르르 풀리는 맛을 보려면 역시 암퇘지, 그것도 배 껍질이어야 한다.
구한말 마포 지역의 사진을 보면 음식과 술을 파는 좌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좌판에서 돼지고기를 팔았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6·25전쟁 이후 개업한 돼지고기 구이 식당이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고, 그 식당의 유명세 덕에 마포 하면 돼지고기가 연상되며, 마포가 한강 포구로서의 기능을 잃고 오피스 타운으로 급성장하면서 돼지고기 구이집이 번창하게 됐다는 사실 정도다.
‘마포 최대포’는 고유명사를 넘어 돼지고기 음식점의 보통명사처럼 됐다. ‘마포’ 또는 ‘최대포’라는 말만 붙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이를 내는구나 여기는 것. 마포 최대포는 1955년 개업 당시엔 간판이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금구이를 팔았는데 주인의 성이 최씨니 자연스럽게 ‘최대폿집’이라 불렸고 그게 상호로 자리잡은 것이다.
두툼한 고기에 왕소금 툭툭 … ‘원조’집 명성 여전
공덕동사거리는 근래 큰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거대한 오피스 타운이 형성됐다. 그 큰 빌딩 아래에 마포 최대포는 나지막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 큰길 옆의 쪽문은 닫혔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식당 문이 있다. 그러나 식당 내부는 넓다.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로 가득하고 손님은 늘 만원이다. 늦게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합석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손님들은 큰 불만이 없다. 돼지고기 구이의 ‘원조’를 먹는다는 위안이 그런 불편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다.
마포 최대포는 소금구이와 돼지갈비, 곱창 등을 낸다. 애초 최대포가 유명해진 것은 소금구이 덕이다. 두툼한 돼지고기에 왕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국내 최초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간장 양념을 한 돼지갈비가 강세였다가 최근 다시 소금구이가 약진해 현재는 소금구이와 돼지갈비가 반반 정도 나간다. 인기 메뉴는 돌고 돌아도 마포 최대포 단골이라면 꼭 먹는, 특히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있다. 돼지껍질이다. 암퇘지 배 부분의 껍질을 양념에 재어놓았다가 불판에 구워 먹는다. 돼지껍질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수퇘지 껍질은 누린내가 심하고 찐득해서 식감이 좋지 않다. 부드럽고 고소하며 입안에서 스르르 풀리는 맛은 역시 암퇘지, 그것도 배 껍질이어야 한다. 또 여기에 양념이 잘 배게 애벌구이를 해야 한다. 이 애벌구이 기술은 수십 년간 한 사람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마포 최대포의 돼지껍질은 불판에 허름하게 내놓는 모양새만 아니면 퓨전 레스토랑의 일급 요리로도 모자람이 없다.
음식은 맛이 순한 순서대로 먹어야 뒤에 먹는 것도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마포 최대포에서는 소금구이, 돼지갈비, 돼지껍질 순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찾아가는 길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공덕역에서 4번이나 5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02-719-9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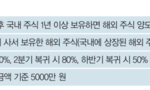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