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건설된 비슷한 모양의 ‘도시 한옥’이 밀집해 있던 과거 서울 종로구 북촌 풍경.
이와 반대로 자연경관이나 마을 또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생태계,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조심 관찰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생태관광’이라 부른다. ‘느린 관광’ ‘체험 관광’ ‘녹색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 이런 여행을 부르는 다른 이름도 있다.
당신의 여행지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겠는가. 서울 도심에 아직도 1000채 넘는 한옥이 남아 있는 곳, 북촌을 여행하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관광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여행자가 아닌 그곳 주민 처지에서 북촌을 걸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에 집중하려면 번잡한 주말 대신 평일 이른 아침에 북촌을 방문해보는 게 좋겠다. 밤늦은 시간도 좋다. 인적 드문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내 발소리에 깜짝 놀랄지 모른다. 집 안에서 식구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 사는 동네 북촌은 조금은 다른 마음과 주의하는 몸가짐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여행의 품격이고 클래스다.
북촌의 역사와 마을 가꾸기
북촌이 널리 알려지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1년 한옥 수리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한옥등록제 도입이 출발점이다. 이때 이른바 ‘북촌 가꾸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한옥이 개·보수되고, 종로구 가회동 31번지를 비롯한 북촌의 여러 골목길이 깨끗이 정비됐다. 서울시가 한옥 몇 채를 사들여 고친 뒤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공방 등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도 북촌이 주목받는 이유가 됐다. 이때부터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둘 북촌을 찾기 시작했고, 한옥의 자산가치를 주시하던 부동산업계도 북촌에 눈독을 들였다. 그렇게 북촌이 ‘떴다’. 이후 외국 관광객까지 더해져 지금 북촌은 말 그대로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다. 그런데 궁금하다. 북촌 가꾸기는 왜 시작된 걸까.
먼저 시곗바늘을 일제강점기로 돌려보자. 북촌에 한옥이 집단적으로 지어진 건 1930년대부터다. 윤보선가(家)나 백인제가같이 그전에 지은 아주 큰 전통 한옥도 드물게 남아 있지만, 북촌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 한옥은 1930년대 주택건설회사가 한꺼번에 지어 분양한 이른바 ‘도시 한옥’이다. 60년대 북촌을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한옥으로 가득한 북촌 풍경을 볼 수 있다.
TV가 가정집에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 라디오 드라마에는 종종 북촌이 등장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면 “네, 가회동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 대목이 나온 것이다. 당시 가회동 한옥에 산다는 것은 아주 잘산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양상이 바뀐다. 북촌 한옥 한 채 값도 안 되던 강남 아파트 값이 쑥쑥 오르고, 잘사는 사람이 하나 둘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북촌은 서울 도심부의 구석진 마을로 잊혀갔다.
북촌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가 1970년대 말 한옥보전정책을 내놓자 주민들은 삶을 규제하는 불편한 조치로 생각하고 반발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 90년대 많은 한옥이 철거됐고 4층 안팎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북촌을 채웠다. 북촌 한옥은 살기 불편한 집,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다. 애물단지였다. 급기야 종로구청에서 북촌 한옥들을 철거하고 현대식 빌라를 짓는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90년대 후반 일이다.

2014년 10월 열린 ‘북촌 개방의 날’ 행사에서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우리빛깔공방을 찾은 사람들이 한옥 생활과 한복 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왼쪽). 2014년 6월 열린 ‘제3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걷기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북촌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촌 주민들이 서울시장을 찾아와 북촌 가꾸기를 요청했고, 고건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북촌 정책 수립을 맡겼다.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고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구 경기대 교수, 최정한 도시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윤혁경 서울시 계장까지 5명이 한 팀이 돼 2000년 한 해 동안 북촌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정책을 마련했다. 이것이 북촌 가꾸기의 시작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마을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북촌 가꾸기의 요체였다. 오래된 집과 마을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대신, 집과 마을을 조심조심 고치고 되살리는 ‘마을 만들기’의 첫 번째 실험이기도 했다. 다행히 북촌 가꾸기는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주민이 한옥을 등록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집을 고쳤다. 낡은 한옥들은 우리 주택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민들 요구에 맞게 수리됐다. 한옥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층을 새롭게 마련한 경우도 많다.
그렇게 시작된 북촌 가꾸기가 어느새 15년이 됐다. 북촌의 변신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던 북촌 주민과 서울 시민에게 대안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북촌에서의 첫 실험은 이후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같은 단독주택 마을로, 또 마포구 연남동 같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마을로 확산했다. 현재 서울 50여 개 마을에서 이런 방식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북촌 가꾸기가 심각한 문제도 드러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옥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옥을 집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보고 사들이는 사람이 늘었고, 주거 공간이 아닌 별채처럼 쓰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평일 저녁에는 불 꺼진 집이 많아 유령마을이란 소리가 나온다.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다.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 사람 사는 동네, 주거지다. 아직 북촌에 가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북촌 내력을 생각하면서, 또 북촌 가꾸기의 빛과 그림자를 두루 살피면서 마을을 여행해보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북촌을 찾아가보면 좋겠다. 방문객이 아닌, 북촌에 사는 주민이라고 가정하고 그 길을 걸어보자. 내가 집주인이라면, 세입자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북촌은 지금 어떠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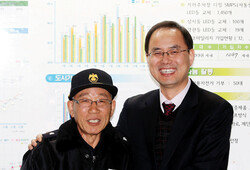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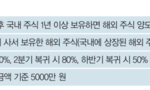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