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한겨레아이들 ‘이생규장전’
송도에 살던 이생은 최씨 여인이 사는 집 앞을 지나다 시를 읊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다. “홀로 비단 창 기대 수놓기 더딘데/ 온갖 꽃 핀 가운데 꾀꼬리 지저귄다/ 까닭 없이 몰래 봄바람 원망하고/ 말없이 바늘 멈춘 것은 그리운 바 있어서이지.”
여인 목소리는 담장에 기대선 채 그 목소리를 엿듣는 남성을 향해 적극적인 ‘대시’를 충동질한다.
“길가에는 누구네 백면 낭군인가/ 푸른 소매 큰 띠 수양버들 사이로 비치네/ 어찌하면 뜰 안의 제비 되어/ 구슬발 밀치고 비스듬히 담장 넘어갈까.”
여인 목소리가 뜰 안 제비처럼 날아올라 담장을 넘어 수줍은 청년 가슴에 내리꽂힌다. 이생은 백지에 시를 적은 뒤 기와조각을 매달아 던진다.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부질없이 수심 겨운 속 붙들고 있으니 하루가 일 년 같아라.”
여성 메시지가 적극적인 구애였다면, 남성 메시지는 수동적 기다림이다. 얼굴도 못 봤지만, 편지 문체를 통해 이생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단박에 파악한 여인은 곧바로 데이트 신청을 해버린다. “그대는 의심하지 말고 해질녘에 만납시다.”
과연 이생이 해질녘 담장 앞으로 가보니, 여인은 두툼한 그네 끈에 대광주리를 매어 이생이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조처해놓았다. 이생은 그 끈을 붙잡고 담장을 넘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으나 정은 은밀하고 일은 비밀스러워 머리털이 곤두섰다.” 이생이 두려움에 떠는 동안 여인은 여유롭게 자리를 펴놓고 미소 지으며 처음 보는 남성 앞에서 시를 읊는다.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사이로 꽃은 무성히 피었고/ 원앙 이부자리에 달빛은 어여쁘기도 해라.”
이 아름다운 고백 앞에서 남성의 리액션은 무척이나 비굴하다. “뒷날 우리 사랑이 새 나가면/ 비바람 무정하게 불어닥치리니 또한 가련치 않은가.” 여인이 첫사랑의 기꺼움을 예찬하는 동안 이생은 ‘혹시 부모님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용감한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비록 여자라도 마음이 태연한데 장부의 의기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뒷날 규중의 일이 새 나가서 부모님께서 저를 꾸짖고 책망하시면 제가 감당하지요.”
“뒷감당은 내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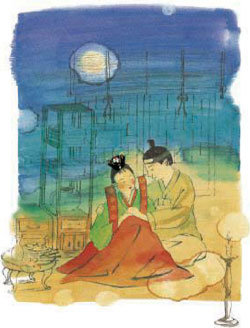
자료 제공·한겨레아이들 ‘이생규장전’
그러나 아들 출세만을 학수고대하던 이생 아버지는 이생이 밤마다 여인 방을 드나드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시골 농장으로 보내버린다. 몇 달이 지나도 이생이 돌아오지 않자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간 최씨 여인. 그녀 부모는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는 딸을 다그쳐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다. 그녀 부모는 적극적으로 혼담을 넣고, 이생 아버지는 계속 거절하면서 아들의 출셋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다. 하지만 “결혼식 비용 일체를 우리가 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그제야 결혼을 허락한다. 이생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생 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열심히 주판알을 굴리는 동안 여인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마침내 자기 사랑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꿈같은 행복은 잠시, 1361년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이들을 피해 도망치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생은 무사히 도적을 피하지만, 아내는 도적에게 잡혀 겁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만다. 작품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생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손을 놓고 혼자 도망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도적 앞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 “귀신같은 놈! 나를 잡아먹어라. 차라리 죽어서 시랑이(승냥이와 이리) 배 속에서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는가?” 도적은 마침내 여인을 잔인하게 죽여 기어이 살을 발라낸다. 간신히 목숨을 보전한 이생은 텅 빈 옛집으로 돌아와 슬픔을 곱씹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꿈결처럼 익숙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아내였다. 이생은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의심하지 않고 묻는다. “어느 곳으로 피했기에 목숨을 보전하였소?”
남자의 비겁함 일깨운 사랑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 아닌가. 그러나 여인은 이생을 원망하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한다. 자기는 이리와 시랑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절의는 소중하되 목숨은 가벼웠다고. 귀신이 되어서까지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당신과 맺은 소중한 약속을 잊지 않아서라고. 이전에 맺은 맹세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라고.
이생은 아내 안내로 양가 부모 유골까지 무사히 수습해 장사지내고, 더는 벼슬을 구하지 않은 채 소박하게 아내와의 사랑만을 가꾸며 살아간다. 인간사에 관심이 없어진 이생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길흉사가 있어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꿈같은 나날이 지난 뒤 여인은 자신은 이제 이승 사람이 아니라 저승 명부에 오른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떠날 때가 됐음을 알리며 통곡한다. 그제야 자신의 모든 비겁함, 우유부단함, 무책임함을 깨달은 이생은 아내를 붙잡는다. “차라리 당신과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 하릴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전하겠소?” 이생은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지만, 저승 명부에 이름이 오른 영혼을 인간 힘으로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랑하다 보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하지만 그 쓰라린 아픔을 참고 오래 사랑하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결국 후회 없는 사랑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최씨 여인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의 가없는 용기와 축복으로써 ‘조금 덜 사랑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자료 제공·한겨레아이들 ‘이생규장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