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참 밀리는 중이겠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50대 감독이 5명이나 될까 싶어요. 예술가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예술적 깊이가 얕다는 겁니다. 곽지균 감독의 자살을 개인의 죽음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거죠.”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준익 감독은 올 칸영화제에서 신작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을 해외에 판매했고 국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영화감독으로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만큼 영화판에서 중견 감독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5월 25일 자택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자살한 한국 멜로영화계의 거장 곽지균 감독은 그 위기감의 정점을 경험한 사람이다. 1986년 ‘겨울 나그네’로 데뷔한 곽 감독은 ‘상처’(1989) ‘젊은 날의 초상’(1991) ‘장미의 나날’(1994) ‘깊은 슬픔’(1997) 등을 통해 당대 청춘의 슬픈 자화상을 그리며 대중문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후에 만든 ‘청춘’(2000)과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랑하니까, 괜찮아’(2006)가 모두 흥행에 참패, 더 이상 영화를 만들 기회를 얻지 못하다 끝내 “일이 없어 괴롭고 힘들다”란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곽 감독 외에도 한국 영화계에는 영화 만들 기회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감독이 많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감독 대부분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거나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메가폰을 잡고 싶지만 몇 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해 ‘휴식 아닌 휴식’ 상태. ‘중견’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감독은 이창동, 홍상수, 박찬욱, 강우석, 강제규 감독 등 소수에 불과하다.
손에 꼽히는 몇몇만 메가폰 잡아
물론 세대교체 자체는 개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평론가인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문화계에서 감독 수명이 가장 짧다”는 데 주목한다.
“한 해 평균 60~80편의 상업영화(20억~40억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와 40여 편의 저예산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수익이 나는 영화는 15~20%뿐입니다. 관객층이 20대로 한정돼 있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영화를 만들고도 손해를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하지요. 명성이 있는 감독에게 투자자가 한두 번 관용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 게 이곳 생리입니다.”
여한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의 말처럼 현장에서 10여 년간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매년 30, 40명의 신인 감독이 배출되지만 데뷔작이 고별작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신인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중견 감독들은 주요 관객층인 10, 20대의 감수성에 맞추는 일이 곤혹스럽다. 곽 감독만 해도 2000년의 실패를 딛고 6년 만에 청춘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를 내놓았지만 과거의 감성으로 만들다 보니 대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영화학회장인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한 번의 섹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남자와 책임지라는 여자가 있다는 정서가 통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고리타분하게 여긴다. 그런데도 감독들이 자꾸 ‘센티멘털한’ 영화를 만드니 관객이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감독들도 할 말은 있다. 이명세 감독은 지나치게 트렌드만 좇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연극이든 가요든 문학이든,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원로 가수들이 공연을 다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외 유명작가의 전시회에는 몰려가도 한국 작가의 전시회에는 안 가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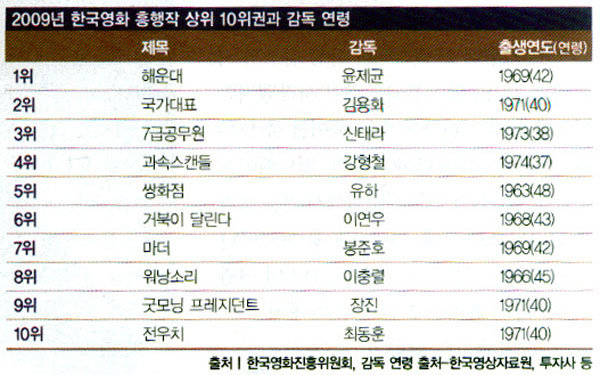 한 영화 제작자는 중견 감독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로 적응력 부재를 지적했다. 예전에는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투자사로부터 현장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런 과정을 불편해하는 감독은 제작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영화 제작자는 중견 감독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로 적응력 부재를 지적했다. 예전에는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투자사로부터 현장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런 과정을 불편해하는 감독은 제작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지영 감독은 스스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화 투자자들이 감독과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옛날처럼 감독이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감독과 대화하려 하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통보인 거고…. 물론 투자자 쪽 창구가 대기업의 과장, 부장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독보다 젊어서 접촉을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화가 부담스럽기 때문인지 과거에 만든 작품을 보고 개성을 파악할 뿐 감독과 직접 접촉하진 않습니다.”
한편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영화를 만들지 않는 이장호 감독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다.
“내 나이가 관객과 맞아떨어졌을 때는 뭘 몰라도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취향만 고수하다 보니 참패했고, 현재까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영화 관객의 저변 확대가 해결 방안
어쩌다 만들 기회를 잡았다 해도 중견 감독들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뇌’를 영화에 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명세 감독의 말이다.
“감독이 노인 얘기를 하고 싶다 해도 관객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영화는 감독이 (투자자 없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 안타깝지요.”
중견 감독이 줄면 중견 스태프와 배우도 줄어든다. 영화는 동년배 스태프와 협업해 만드는 것인데 영화감독이 조로하면 영화판 사람들도 조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처장의 말처럼 관객들은 “세대에 대한 내밀한 시선이 담긴 영화를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변영주 감독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영화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춤 제작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극장 같은 대안 영화관을 늘려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형 교수는 “영화시장 확대”를 또 다른 대안으로 꼽는다. 미국의 코엔 형제 감독이 미국 내에서 관객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세계시장이라는 판로를 개척해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것처럼, 중견 감독들도 세계시장과 손잡으면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흥행하기 어려운 영화 ‘시’가 프랑스에서 팔리는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준익 감독은 올 칸영화제에서 신작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을 해외에 판매했고 국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영화감독으로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만큼 영화판에서 중견 감독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5월 25일 자택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자살한 한국 멜로영화계의 거장 곽지균 감독은 그 위기감의 정점을 경험한 사람이다. 1986년 ‘겨울 나그네’로 데뷔한 곽 감독은 ‘상처’(1989) ‘젊은 날의 초상’(1991) ‘장미의 나날’(1994) ‘깊은 슬픔’(1997) 등을 통해 당대 청춘의 슬픈 자화상을 그리며 대중문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후에 만든 ‘청춘’(2000)과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랑하니까, 괜찮아’(2006)가 모두 흥행에 참패, 더 이상 영화를 만들 기회를 얻지 못하다 끝내 “일이 없어 괴롭고 힘들다”란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곽 감독 외에도 한국 영화계에는 영화 만들 기회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감독이 많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감독 대부분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거나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메가폰을 잡고 싶지만 몇 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해 ‘휴식 아닌 휴식’ 상태. ‘중견’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감독은 이창동, 홍상수, 박찬욱, 강우석, 강제규 감독 등 소수에 불과하다.
손에 꼽히는 몇몇만 메가폰 잡아
물론 세대교체 자체는 개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평론가인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문화계에서 감독 수명이 가장 짧다”는 데 주목한다.
“한 해 평균 60~80편의 상업영화(20억~40억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와 40여 편의 저예산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수익이 나는 영화는 15~20%뿐입니다. 관객층이 20대로 한정돼 있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영화를 만들고도 손해를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하지요. 명성이 있는 감독에게 투자자가 한두 번 관용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 게 이곳 생리입니다.”
여한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의 말처럼 현장에서 10여 년간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매년 30, 40명의 신인 감독이 배출되지만 데뷔작이 고별작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신인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중견 감독들은 주요 관객층인 10, 20대의 감수성에 맞추는 일이 곤혹스럽다. 곽 감독만 해도 2000년의 실패를 딛고 6년 만에 청춘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를 내놓았지만 과거의 감성으로 만들다 보니 대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영화학회장인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한 번의 섹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남자와 책임지라는 여자가 있다는 정서가 통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고리타분하게 여긴다. 그런데도 감독들이 자꾸 ‘센티멘털한’ 영화를 만드니 관객이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감독들도 할 말은 있다. 이명세 감독은 지나치게 트렌드만 좇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연극이든 가요든 문학이든,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원로 가수들이 공연을 다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외 유명작가의 전시회에는 몰려가도 한국 작가의 전시회에는 안 가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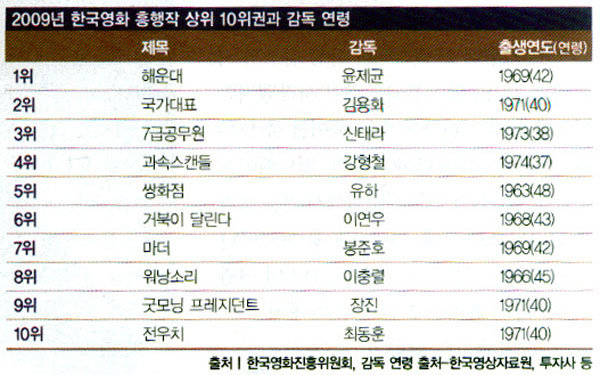
반면 정지영 감독은 스스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화 투자자들이 감독과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옛날처럼 감독이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감독과 대화하려 하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통보인 거고…. 물론 투자자 쪽 창구가 대기업의 과장, 부장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독보다 젊어서 접촉을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화가 부담스럽기 때문인지 과거에 만든 작품을 보고 개성을 파악할 뿐 감독과 직접 접촉하진 않습니다.”
한편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영화를 만들지 않는 이장호 감독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다.
“내 나이가 관객과 맞아떨어졌을 때는 뭘 몰라도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취향만 고수하다 보니 참패했고, 현재까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영화 관객의 저변 확대가 해결 방안
어쩌다 만들 기회를 잡았다 해도 중견 감독들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뇌’를 영화에 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명세 감독의 말이다.
“감독이 노인 얘기를 하고 싶다 해도 관객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영화는 감독이 (투자자 없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 안타깝지요.”
중견 감독이 줄면 중견 스태프와 배우도 줄어든다. 영화는 동년배 스태프와 협업해 만드는 것인데 영화감독이 조로하면 영화판 사람들도 조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처장의 말처럼 관객들은 “세대에 대한 내밀한 시선이 담긴 영화를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변영주 감독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영화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춤 제작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극장 같은 대안 영화관을 늘려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형 교수는 “영화시장 확대”를 또 다른 대안으로 꼽는다. 미국의 코엔 형제 감독이 미국 내에서 관객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세계시장이라는 판로를 개척해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것처럼, 중견 감독들도 세계시장과 손잡으면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흥행하기 어려운 영화 ‘시’가 프랑스에서 팔리는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영화를 찍는 중견 감독은 손에 꼽힐 정도. 한 시대를 풍미한 장선우, 이창동, 이장호, 배창호, 강우석, 정지영, 이명세 감독(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