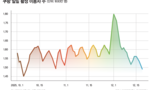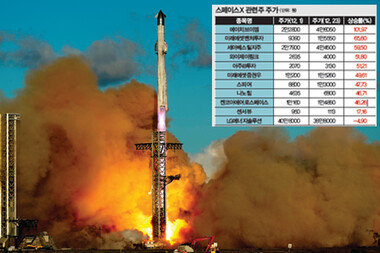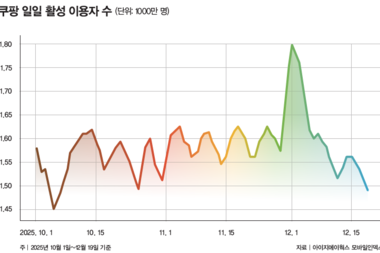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 작은 머리와 넓은 가슴, 물고기 몸매
- ‘마린보이’ 박태환의 몸은 심해를 유영하는 물고기와 닮았다. 수영 선수 가운데 가장 완벽한 몸을 가졌다는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별명 자체가 ‘펠 피시(fish)’다. 얼굴 폭이 좁고 턱이 갸름하며 어깨와 가슴이 눈에 띄게 넓은 이들은 엉덩이가 작다는 공통점도 지닌다. 커다란 손과 발(박태환 270mm, 펠프스 350mm)도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매끈하게 빠졌다. 수영 선수들은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는 대신 극대화된 심폐 기능을 갖고 있다. 박태환의 폐활량은 7000㏄로 일반인의 두 배. 거의 젖은 상태로 생활하는 수영 선수들의 ‘직업병’으로는 피부염과 무좀이 꼽힌다.(도움말 : 최일욱 UCB 수영클럽 감독)
올림픽과 각종 스포츠는 밤새워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성적’으로 찬사를 보내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 정신 활동보다 저급한 것으로 간주돼왔고, 비문화적 영역처럼 느껴지니까요. ‘문화체육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됐는지요. 또 스포츠가 정치 조작의 수단이라는 주장, ‘관리되는 육체’에 관한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들의 경고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경기 시간을 생선 토막 치듯 하는 광고들은 스포츠가 사채업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뻔뻔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박태환 선수의 허리, 팔, 손끝에 퍼진 신경과 근육들이 섬세하게 결합해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은 정신과 독립해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미란 선수가 집중하는 찰나의 순간,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들이 극심한 고통에 저항할 때 정신을 초월한 어떤 숭고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막내 김온아 선수가 오직 두 발만으로 뛰어올라 공을 쥐고 골대 너머를 응시할 땐 물리학의 법칙도 무시할 수 있는 육체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자연이 인간의 몸에 허여했으나 상실했던 모든 자유를 누리는 듯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 페미니스트 학자가 했던 말처럼, 그들이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혼성의 몸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육상 선수의 허벅지, 역도 선수의 견고한 등과 허리, 투포환 선수의 단단한 이두박근을 보십시오. 그 순간 누가 S라인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들의 몸은 둔하기는커녕 민첩한 라인을 이루고, 반라의 옷차림임에도 성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섹시하지 않으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서양의 시가 기원전 5세기에 운동선수의 몸을 찬양한 핀다로스의 찬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올림픽에서 본 섬세한 신경다발과 단단한 근육의 섬유 조각들을 다시 기억해내려 합니다. 이는 금메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적과 피부색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몸을 바라봄으로써 스포츠를 스포츠로만 보는 경험을 해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