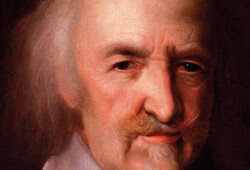조직 운영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슈퍼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로망스 리더십, 폴로어십, 감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겸손 리더십 등 다양한 이론이 나왔다. 리더십 관련 칼럼은 주요 매체와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아이템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퇴색한 느낌도 없지 않다. 리더십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종의 ‘리더십 피로증’이 온 것이다. 또한 너무 많은 연구와 이론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이정표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리더십 이론에서 항상 서두에 인용하는 외국 학자의 이름이나 연구기법에 대한 서술은 리더십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만의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처럼 오래된 명저나 짧은 금언이 더 유용할 때가 있다. 리더십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군에서는 미국식 교범인 ‘리더십’을 차용해 쓰기 전 ‘지휘통솔’이란 제하의 교범이 간부들의 지휘통솔 능력의 기준이었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10가지 지휘통솔 원칙을 제시했던 이 교범이 현재 것보다 낫다는 평가도 제법 있다. 따라서 이 지휘통솔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고사나 전장 사례를 엮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병사의 고름을 손수 치료한 장군
오기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이었다. 오기 장군의 별칭은 ‘상승(常勝) 장군’으로, 항상 이긴다는 뜻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76차례 전쟁에서 무승부를 제외하고 64번 이겼다고 한다. 그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많은 이는 그가 ‘지장(智將)’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기 장군이 남긴 ‘오자병법’은 오늘날에도 군사학도들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명저로 남아 있을 만큼 군사와 전쟁의 요체를 잘 설명해놓았다.
그러나 당대 전투는 전략이나 전술보다 병력의 많고 적음, 혹은 백중지세 속에서 병력들의 강하고 약한 의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병력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이가 오기 장군이었다. 그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군막을 순찰 중이던 오기 장군은 등에 난 종기로 고생하는 병사를 봤다. 자초지종을 들은 오기 장군은 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고생하게 두느냐며 직접 병사의 등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냈다. 그 덕인지 병사는 곧 완치됐다. 이 일은 널리 퍼져나갔고 병사의 고향에서도 오기 장군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병사의 노모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장군이 등에 난 종기를 빨아주었다니, 이제 내 아들은 다음 전투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이 아니겠소.”
한 연구에 따르면 정(情)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성, 심리 특성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아교풀 구실을 하며 가까움과 밀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렇다면 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며 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최상진의 ‘한국인의 심리학’(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이란 ‘상대방의 아픈 마음, 불쾌한 감정 등과 같은 인간적 불행을 공감하는 일에 민감함’을 뜻한다. 또한 정이 많은 사람이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오기 장군 고사가 왜 ‘정으로 지휘하라’의 대표적 사례인지 이해하기 쉽다. 오기 장군은 종기로 고통받는 병사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공감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병사를 직접 돌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정으로 신하를 이끈 성군이 있다. 세종대왕은 인재 발탁과 육성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한번 믿은 신하는 주변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등용하고, 어쩔 수 없이 관직에서 물러난 경우라면 나중에 반드시 다시 등용해 썼다고 한다. 왕이라 할지라도 아래로부터의 인정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용인술이었다.
정을 통한 리더십의 효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은 상대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부하와 같은 위치로 기꺼이 내려올 때 가능하다. 집현전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신숙주에게 조용히 곤룡포를 덮어줬다는 일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침에 일어난 신숙주는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혼신을 다해 연구에 매달렸다.
미국독립전쟁 당시 일화다. 비 오는 어느 날 병사들이 진흙땅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장교로 보이는 이가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장교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전투에 대비해 참호를 파는 거요.” “당신은 왜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장교요. 나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지 병사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오.”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나도 함께 일해도 되겠소.”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그 중년 신사는 병사들과 흙투성이가 돼 참호를 팠고 작업을 마친 뒤 올라왔다. 이번에는 장교가 말을 걸었다. “하겠다니 가만 두긴 했소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나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할 사람이죠. 내 이름은 조지 워싱턴이라 합니다.” 바로 미국독립전쟁에서 아메리카 대륙군 총사령관이었고 후일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었다.
조지 워싱턴의 일화는 솔선수범, 동고동락 등 다른 사례로도 소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병사들의 고생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는 ‘정’에 의한 리더십의 좋은 사례도 될 것이다.
오래전 일이다. 필자가 야전에서 근무할 당시 부대장이던 연대장 이야기다. 그는 야간에 순찰을 돌다 야근하는 이가 있으면 손수 부대 밖까지 나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사다줬다. 가끔은 둘러앉아 같이 먹고, 병사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면 먹을거리만 놓고 갔다. 처음에는 그런 정과 배려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밤에 야근할 일이 생기면 ‘오늘 혹시 연대장님이 김밥을 사다주실까’ 하는 기다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다음부터다. 연대장은 야근하는 이들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사다주고 나면 부대를 한 바퀴 순찰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이들을 쫓아내다시피 집으로, 내무실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늦게까지 부하들이 고생할 일이 있다면 내가 부대를 잘못 지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부대 실무자들은 지휘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야근하지 않으려고 낮에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래도 일이 많으면 새벽에 일찍 출근해 업무를 마저 처리했다.
직장생활에서 선배들이 흔히 하는 조언을 보면 정이 꼭 긍정적인 요소로만 인식되는 건 아니다. ‘정을 주면 언젠가 배신당한다’거나 ‘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왜일까. 아마도 개인으로서의 정과 리더로서의 정이 충돌한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냉철하고 차가우며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은연중 우리 조직사회의 롤모델로 자리 잡아 ‘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유명한 국민간식의 CF에서부터 부부생활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은 조직원을 감동케 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리더들이 추구하기에 충분히 검증된 가치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퇴색한 느낌도 없지 않다. 리더십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종의 ‘리더십 피로증’이 온 것이다. 또한 너무 많은 연구와 이론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이정표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리더십 이론에서 항상 서두에 인용하는 외국 학자의 이름이나 연구기법에 대한 서술은 리더십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만의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처럼 오래된 명저나 짧은 금언이 더 유용할 때가 있다. 리더십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군에서는 미국식 교범인 ‘리더십’을 차용해 쓰기 전 ‘지휘통솔’이란 제하의 교범이 간부들의 지휘통솔 능력의 기준이었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10가지 지휘통솔 원칙을 제시했던 이 교범이 현재 것보다 낫다는 평가도 제법 있다. 따라서 이 지휘통솔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고사나 전장 사례를 엮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병사의 고름을 손수 치료한 장군
오기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이었다. 오기 장군의 별칭은 ‘상승(常勝) 장군’으로, 항상 이긴다는 뜻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76차례 전쟁에서 무승부를 제외하고 64번 이겼다고 한다. 그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많은 이는 그가 ‘지장(智將)’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기 장군이 남긴 ‘오자병법’은 오늘날에도 군사학도들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명저로 남아 있을 만큼 군사와 전쟁의 요체를 잘 설명해놓았다.
그러나 당대 전투는 전략이나 전술보다 병력의 많고 적음, 혹은 백중지세 속에서 병력들의 강하고 약한 의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병력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이가 오기 장군이었다. 그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군막을 순찰 중이던 오기 장군은 등에 난 종기로 고생하는 병사를 봤다. 자초지종을 들은 오기 장군은 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고생하게 두느냐며 직접 병사의 등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냈다. 그 덕인지 병사는 곧 완치됐다. 이 일은 널리 퍼져나갔고 병사의 고향에서도 오기 장군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병사의 노모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장군이 등에 난 종기를 빨아주었다니, 이제 내 아들은 다음 전투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이 아니겠소.”
한 연구에 따르면 정(情)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성, 심리 특성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아교풀 구실을 하며 가까움과 밀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렇다면 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며 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최상진의 ‘한국인의 심리학’(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이란 ‘상대방의 아픈 마음, 불쾌한 감정 등과 같은 인간적 불행을 공감하는 일에 민감함’을 뜻한다. 또한 정이 많은 사람이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오기 장군 고사가 왜 ‘정으로 지휘하라’의 대표적 사례인지 이해하기 쉽다. 오기 장군은 종기로 고통받는 병사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공감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병사를 직접 돌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정으로 신하를 이끈 성군이 있다. 세종대왕은 인재 발탁과 육성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한번 믿은 신하는 주변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등용하고, 어쩔 수 없이 관직에서 물러난 경우라면 나중에 반드시 다시 등용해 썼다고 한다. 왕이라 할지라도 아래로부터의 인정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용인술이었다.
정을 통한 리더십의 효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은 상대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부하와 같은 위치로 기꺼이 내려올 때 가능하다. 집현전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신숙주에게 조용히 곤룡포를 덮어줬다는 일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침에 일어난 신숙주는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혼신을 다해 연구에 매달렸다.
미국독립전쟁 당시 일화다. 비 오는 어느 날 병사들이 진흙땅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장교로 보이는 이가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장교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전투에 대비해 참호를 파는 거요.” “당신은 왜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장교요. 나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지 병사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오.”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나도 함께 일해도 되겠소.”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그 중년 신사는 병사들과 흙투성이가 돼 참호를 팠고 작업을 마친 뒤 올라왔다. 이번에는 장교가 말을 걸었다. “하겠다니 가만 두긴 했소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나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할 사람이죠. 내 이름은 조지 워싱턴이라 합니다.” 바로 미국독립전쟁에서 아메리카 대륙군 총사령관이었고 후일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었다.
조지 워싱턴의 일화는 솔선수범, 동고동락 등 다른 사례로도 소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병사들의 고생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는 ‘정’에 의한 리더십의 좋은 사례도 될 것이다.
오래전 일이다. 필자가 야전에서 근무할 당시 부대장이던 연대장 이야기다. 그는 야간에 순찰을 돌다 야근하는 이가 있으면 손수 부대 밖까지 나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사다줬다. 가끔은 둘러앉아 같이 먹고, 병사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면 먹을거리만 놓고 갔다. 처음에는 그런 정과 배려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밤에 야근할 일이 생기면 ‘오늘 혹시 연대장님이 김밥을 사다주실까’ 하는 기다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다음부터다. 연대장은 야근하는 이들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사다주고 나면 부대를 한 바퀴 순찰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이들을 쫓아내다시피 집으로, 내무실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늦게까지 부하들이 고생할 일이 있다면 내가 부대를 잘못 지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부대 실무자들은 지휘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야근하지 않으려고 낮에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래도 일이 많으면 새벽에 일찍 출근해 업무를 마저 처리했다.
직장생활에서 선배들이 흔히 하는 조언을 보면 정이 꼭 긍정적인 요소로만 인식되는 건 아니다. ‘정을 주면 언젠가 배신당한다’거나 ‘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왜일까. 아마도 개인으로서의 정과 리더로서의 정이 충돌한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냉철하고 차가우며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은연중 우리 조직사회의 롤모델로 자리 잡아 ‘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유명한 국민간식의 CF에서부터 부부생활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은 조직원을 감동케 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리더들이 추구하기에 충분히 검증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