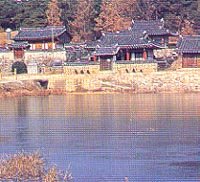
박인로를 배향한 도계서원은 돌할매 마을에서 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북안면 도천리에 있다. 박인로가 늙어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노계곡에 들어가 살면서 노계(蘆溪)라는 호를 사용하였지만, 그 전까지 자칭 무하옹(無何翁)으로 통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 무엇을 할 줄 모르는 늙은이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정철,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으로 꼽힌다. 문학사에 가장 많은 9편의 가사(歌詞)를 남겼고 시조 67수, 한시 110수를 남겼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에 가담해 왜적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가 최초로 지은 가사인 ‘태평사’는 가장 태평하지 않은 시절에 지어진 가사다. 백의종군하여 부산에서 수병(水兵)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상관인 성윤문(成允文)의 요청으로 병사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다.
“용 같은 장수와 구름 같은 용사들, 펄럭이는 깃발은 하늘을 뒤덮어 만리에 이었고, 함성은 크게 떨쳐 산봉우리를 에두른 듯, 병방 어영대장은 앞장서 나아가며 적진으로 돌격하니 비바람 몰아치고 벼락이 내리는 듯, 가등청정의 작은 머리도 손안에 들었건만….”(필자 주, 한문투를 풀어 적음) 이처럼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 전례가 없다. 이 ‘태평사’는 무하옹이 45세에 통주사(統舟師)가 되어 지은 ‘선상탄’(船上歎)과 함께 우리 국문학의 지평을 넓혀놓은 수작으로 꼽힌다.
그는 전쟁 중인 1599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역임하고, 거제도 조라포에서 만호 벼슬을 한다. 하지만 덩치가 왜소하고, 글읽기를 좋아는 선비일 뿐, 용맹한 장수가 될 뜻은 없었던 모양이다. 전쟁터에 달려나가 칼을 잡은 것은 위태로운 나라에 대한 우국충정이었을 뿐이다. 평탄한 시절이었다면 그도 벼슬하지 못한 양반네들처럼 음풍농월하며 한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 기질은 이미 무하옹의 호에서 잘 드러나지만, 실제로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찢어진 삿갓을 쓰고 낡은 말안장에 걸터앉아 집에 돌아와서 한가로운 생을 보냈다.
한시(漢詩) 안분음(安分吟)에 그 시절이 그려져 있다.
“내 몸에 걸친 옷이 어떤가 하니, 백 군데나 기워서 누더기 옷이로다. 비록 해어졌을 망정 무엇이 걱정이랴? 다만 오래도록 추구할 일을 바랄 뿐이네. …한 그릇 밥 한 쪽박 물도 자주 떨어지는데, 그 즐거움은 변하지 않을 뿐이로다. 만약 여우나 노루에 견준다면, 태연히 부끄러움 없을 뿐이로다.”
그러나 그는 수백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수천석의 농사를 지으면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김에 안빈낙도를 부르짖던 허다한 선비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랬기에 이웃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헌 갓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라고 표현한 ‘누항사’와 같은 구체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진면목은 고통스런 현실의 한복판에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 견뎠다는 데 있다. 그랬기에 무하옹을 자처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가슴 시린 삶의 편린들을 글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이쯤 되니 무하옹은 국문학사에서 독특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철이나 윤선도처럼 중앙 정계에 나아가 왕을 가까이 모신 적도 없고, 사림(士林)에 속하지도 않았다. 당대의 주류 문화에서 벗어난 군인으로 나라의 녹을 얼마간 먹었고, 가문과 학연으로 얽힌 조선 사회에서, 집안은 보잘 것 없고 학맥은 찾을 길 없었다. 훌륭한 스승을 받들지도, 똑똑한 제자를 두지도 못했다. 스스로 문집을 엮지도 않았고, 당대에 문장으로 명성을 얻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하옹이 국문학사에 우뚝 솟아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잊지 않은 후손과 지방 유림의 공덕이다. 지역 유림이 주축이 되어 도계서원의 전신인 도계사(道溪祀)가 1707년에 세워졌다. 그리고 오늘날 전해오는 3권 2책의 노계문집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의 아버지 최옥(1762~1840)의 손을 거쳐서 1832년에 편찬되었다.
무하옹은 지인(知人)들을 찾아 먼길 떠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에 한음 이덕형(1561~1613)을 만나러 가서 가사 ‘사제곡’과 ‘누항사’를 지었다. 포항시 죽장면 입암(立巖) 마을에 은거한 여헌 장현광((1554~1637)을 만나러도 자주 갔다. ‘여헌년보’에 따르면 여헌은 47세 때인 1600년에 입암에서 놀면서 모두 28군데의 빼어난 곳에 이름을 붙였다. 무하옹은 그 명명된 곳을 소재로 가사 ‘입암별곡’ 을 짓고, 시조 입암 29곡을 지었다. 그리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이언적(1491~1553)을 배향한 옥산서원에 들러 ‘독락당’이라는 가사를 짓기도 했다.
“…독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 풍채를 친히 만나뵈온 듯, 눈에 선해 굽어보고 우러르고 탄식하며, 당시 하시던 일 다시곰 생각하니, 맑은 창 정갈한 책상에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현 말씀에 뜻 붙이여 새로움을 이뤄내여, 옛것을 잇고 앞날을 열어 우리 길 밝히시니, 동방의 군자는 다만 이 한 분인가 하노라….”(필자 주, 한문투는 알기 쉽게 고침)
무하옹이 만년을 지낸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횟골마을 맞은편 노계곡 집터는 새가 둥지를 틀 만한 산 중턱에 있다. 잡목이 우거지고 길이 없어서 올라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괴기도 낯이 익어 놀란 줄 모르거든, 차마 어찌 낚을런고, 낚싯대를 거두고 오락가락 물속을 굽어보니, 구름과 하늘빛이 뒤엉키어 잠겨 있고, 물고기는 구름 속에서 뛰노는구나.” 사람들을 피해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며 시를 짓던 무하옹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중년까지 충효의 사상을 실천했고, 늙어서는 자연 속에서 거닐면서 욕심없이 살고자 했던 무하옹. 무얼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그 무엇을 알았던 사람 아닐까.
|


















